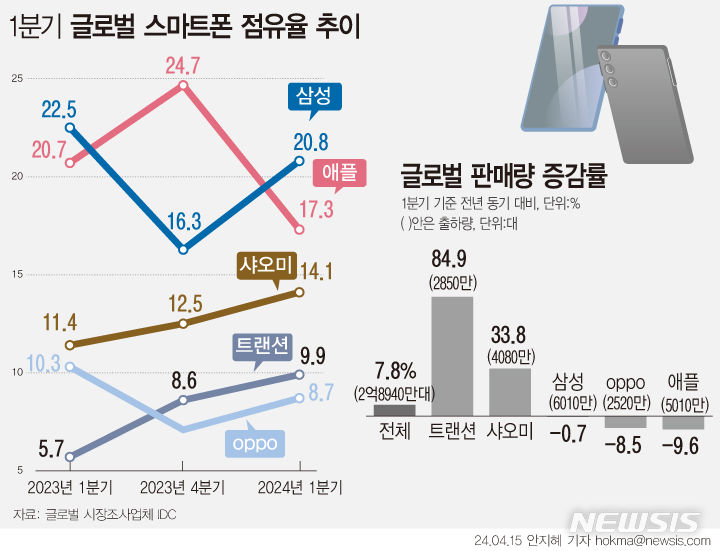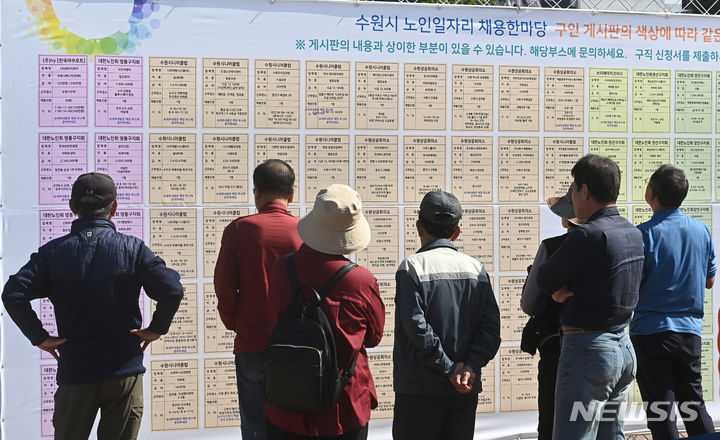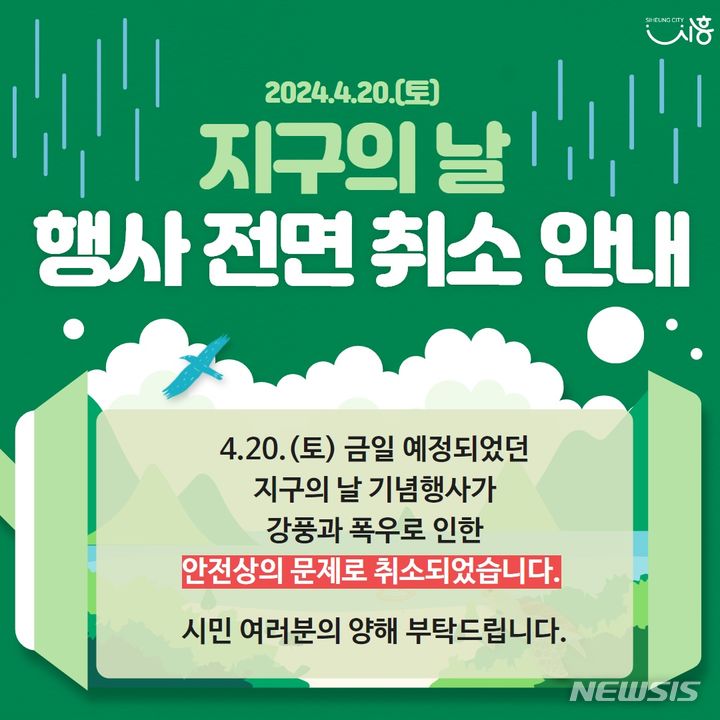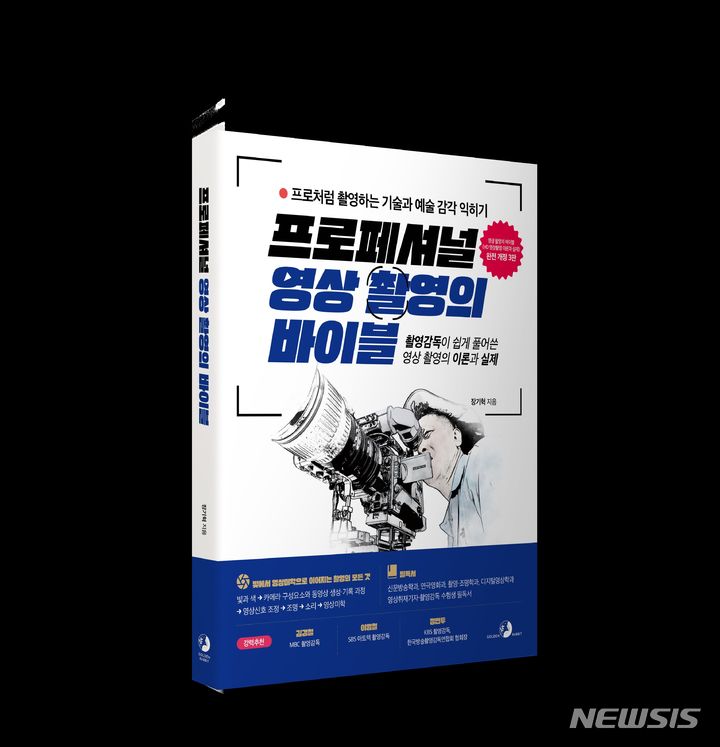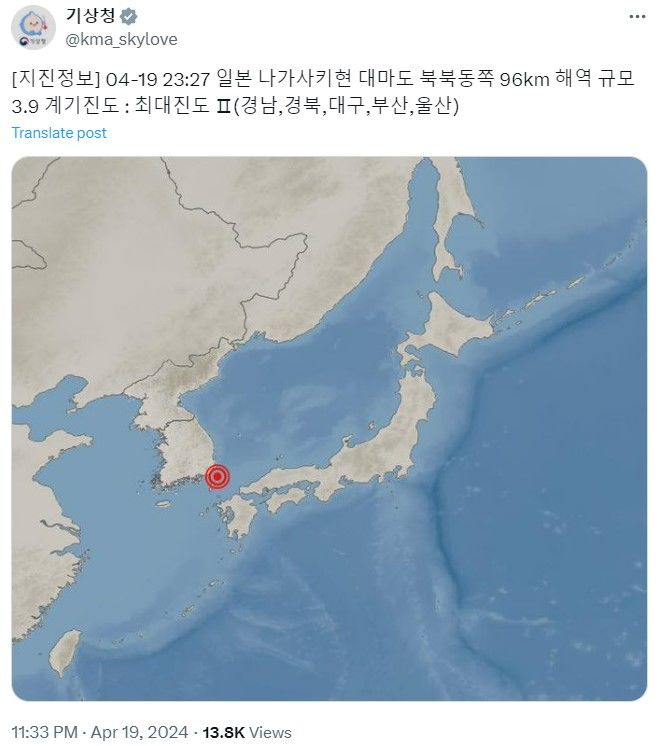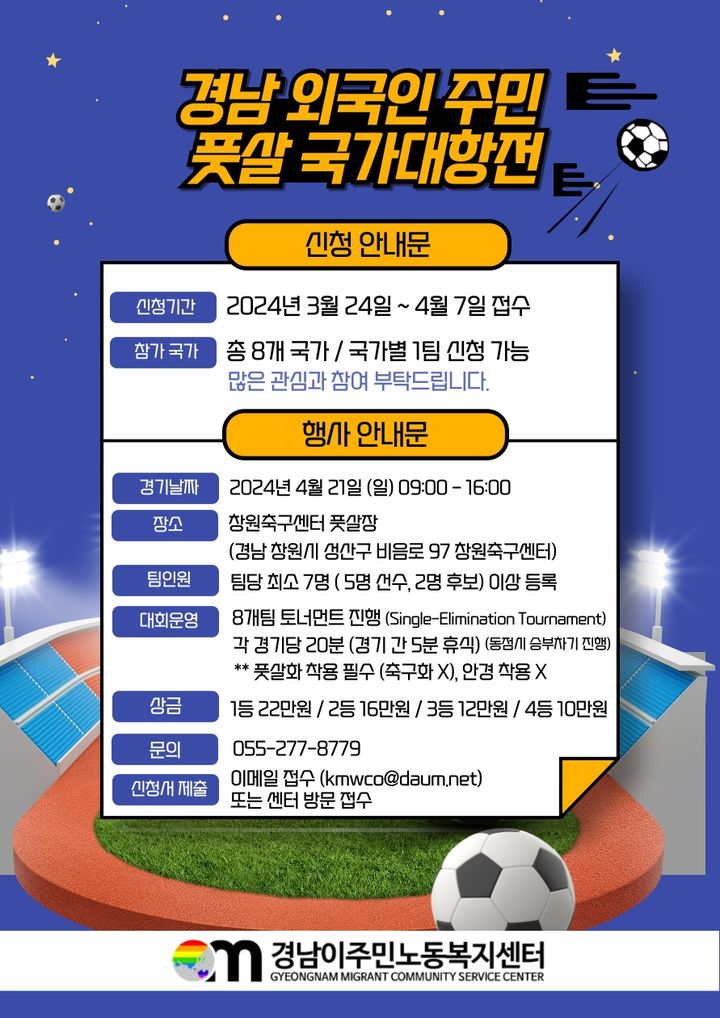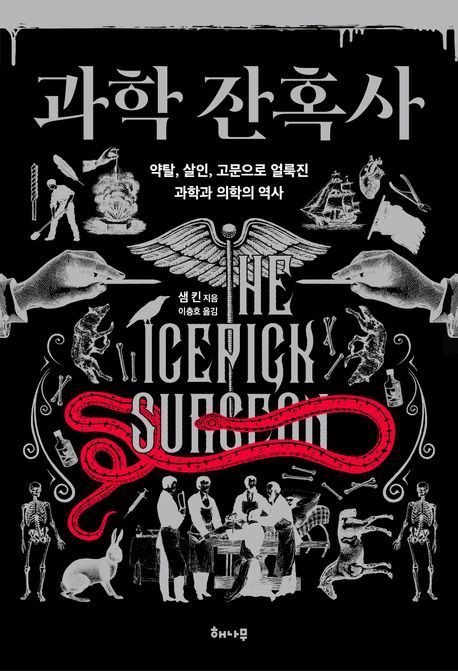日소설가,혐한 언론에 "韓대법원 강제징용 판결문부터 읽어라"
日 유명 소설가 혐한 부추기는 미디어에 제언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옹 인터뷰 읽었다며 "비참하다"

【서울=뉴시스】아쿠타가와(芥川)상 수상 일본 유명 소설가 히라노 게이치로(平野啓一郎). 사진은 히라노 트위터(@hiranok) 갈무리. 2019.10.11.
히라노 작가는 11일자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에서 '혐한'(嫌韓)을 부추기는 와이드쇼와 주간지에 대해 "나는 한국인 친구고 많고 한국에는 독자도 있다. 화가 나는 동시에 굉장히 상처 입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디어는 한국 문제에 대해 무책임하게 반감을 부추겨 혐오감, 적의를 방류하고 있다"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문을 읽지 않은 것 같은 출연자에게 코멘트 하도록 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두 먼저 그 판결문을 읽어야 한다. 일본어 번역으로 40페이지. (강제징용 노동자들은)기술 습득을 위해 신청했더니 위험도 높은 노동환경에 놓여져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 도망치고 싶다고 말했더니 맞았다. 비참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옹의 인터뷰를 읽었다면서 "지금 기능실습생의 문제와 생생하게 겹쳤다. 노동자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가치관이 있다면 판결문을 읽고 쇼크를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1993년부터 인재난 해결 차원에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을 대상 기능실습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기술 연수를 거치면 최대 5년 간 일본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가혹한 처우 등으로 논란이 많다. 올 3월에는 한 건설회사가 기능실습으로 속이고 방사능 오염제거에 베트남인을 동원해 파문이 되기도 했다.
히라노 작가는 “갑자기 국가 이익의 대변자가 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한 사람 인간으로서 그들(강제징용 피해자)의 사정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설은 한국인이라던가 일본인, 남자와 여자라는 카테고리를 주인공으로 만들 수 없다. 징용공이라는 카테고리를 보지 말고 한 사람 개인을 주목하면 우리는 여러 공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일본에서 한일 관계 악화에도 한국 문학이 인기를 끄는 데 대해서는 “나와 세대가 비슷한 김연수, 은희경 등 현대소설은 일본 독자가 같은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다. 현대를 살아하는 그들과 많은 문제를 공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인은 민족적으로 이렇다 등 조잡한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히라노 작가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어떻게 하면 공감을 나눌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속성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한사람, 한 인간으로 봐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한 사람의 인간 중에도 복잡한 속성이 복잡하게 공존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아마르티아 센은 책 ‘아이덴티티와 폭력’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하나로 특정하는 것이 가장 나쁘다고 했다. 대립을 부추기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한국인이다, 이슬람 교도다, 카테고리로 나눈다. 복잡함을 서로 인정하고 어딘가 접점에서 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카테고리를 빼고 상대의 인생을 보면 공감할 수 있는 점이 여러 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히라노 작가는 1975년생으로 지난 1999년 소설 ‘일식’으로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했다. 대표작으로는 결괴, 마티네의 끝에서 등이 있다. 그의 소설 20여개는 한국에도 번역돼 출판됐다. 한중일 작가가 모인 '동아시아문학포럼'에서 일본 측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