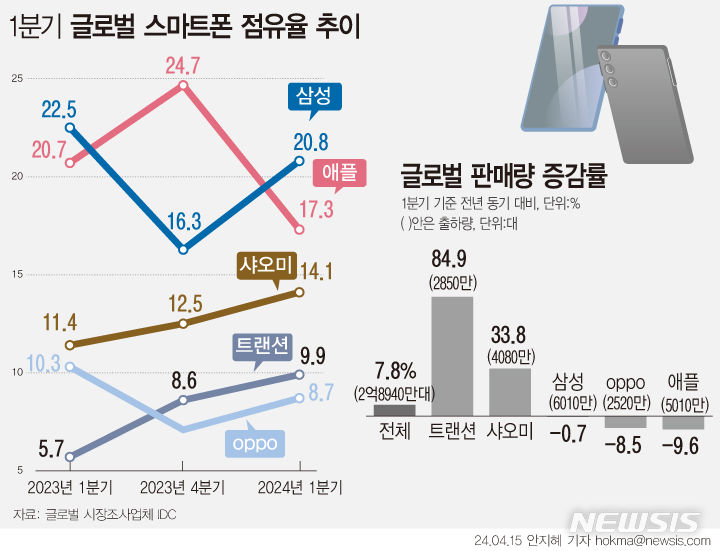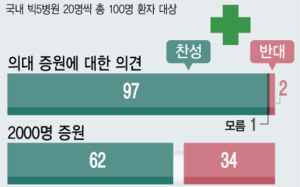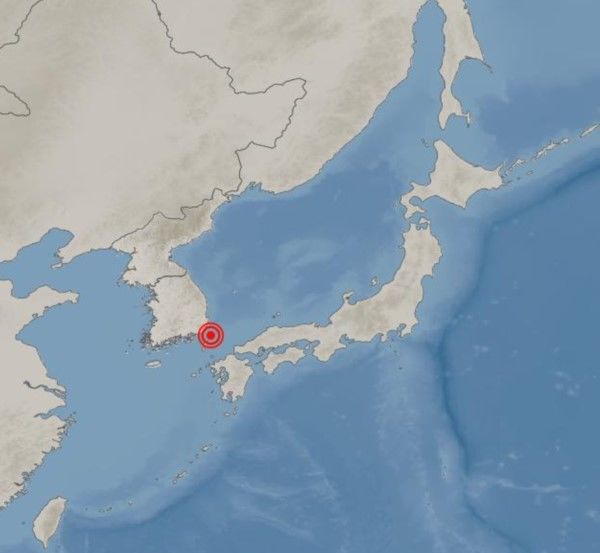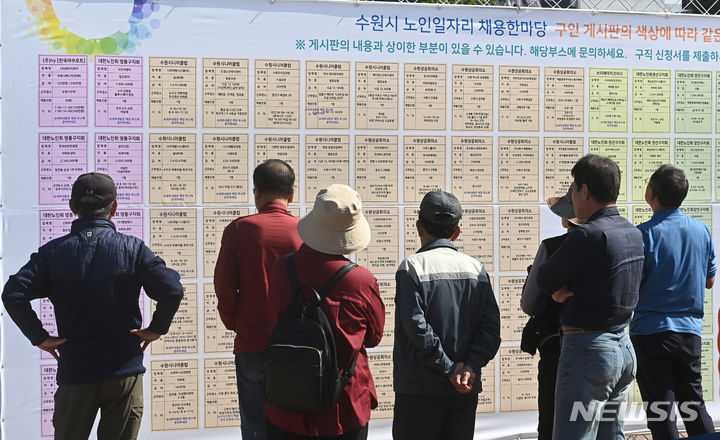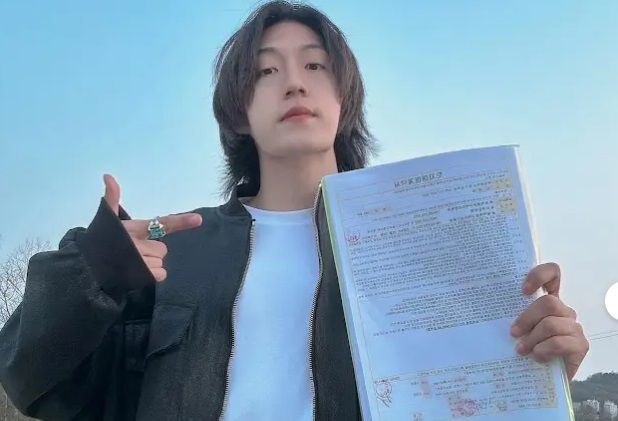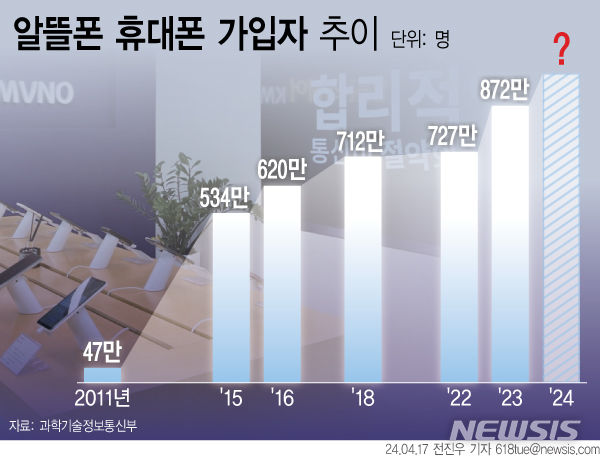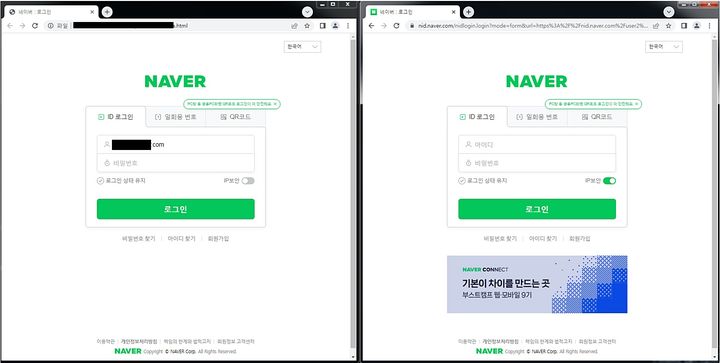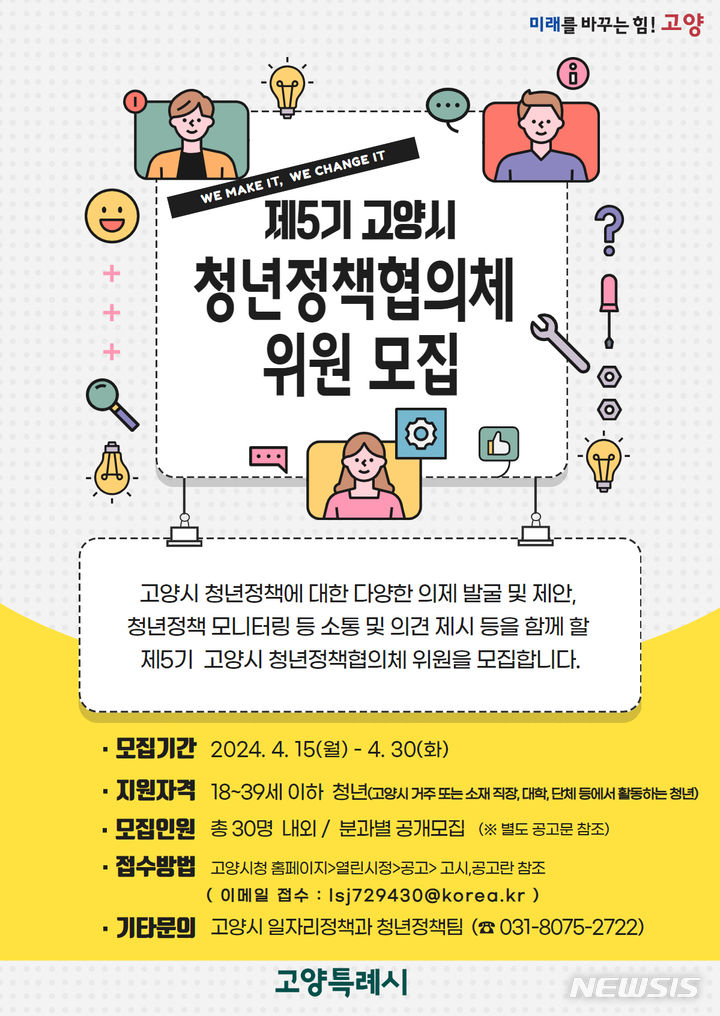한전KPS, '부당해고' 논란에 "계약 만료로 퇴사…문제없어"
'독소조항' 계약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리스크 파악"
해당 직원 의문 제기 전에 사장까지 보고 올라간 상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지연은 "절차대로 진행…결과 회신"
"격리 근무도 본인 희망에 따른 것…별도 사무실로 분리"
![[세종=뉴시스] 한전KPS 본사 전경. (사진=한전KPS 제공)](http://image.newsis.com/2019/04/19/NISI20190419_0000312370_web.jpg?rnd=20190419153312)
[세종=뉴시스] 한전KPS 본사 전경. (사진=한전KPS 제공)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전KPS는 회사에 손실을 입힐 수 있는 계약을 뒤엎은 직원에게 오히려 책임을 물어 해고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이 직원은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전문계약직으로 지난달 30일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고 7일 반박했다.
한전KPS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일부 잘못 알려진 바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전KPS는 포스코와 610억원짜리 성능 개선 사업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직원이 '독소조항'이 포함된 계약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독소조항'은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전KPS가 다른 업체들의 잘못까지 모두 뒤집어쓸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로 인해 물어야 하는 위약금은 419억원에 달했다. 이에 이 직원은 지난해 8월23일 오전 열린 사장 주재 회의에 참석해 계약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한전KPS는 지난해 5월29일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에 계약 조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실무진이 계약 조건에 대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반영한 후속 조치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 실무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회신 내용과 의견을 2019년 8월12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본부장에 보고했고 22일에는 사장에게 리스크 해소 방안이 올라갔다.
이후 23일 발주사를 방문해 추가협상을 통해 계약의 관련 조항을 해소했다. 즉, 해당 직원이 사장 주재 회의에서 계약의 문제점을 알리기 전에 실무 책임자로부터 계약 조건 리스크 해소 방안에 대해 이미 보고받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 직원은 이 사건 이후 상사로부터 사장 주재 회의에서 참석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고 맡고 있던 실장 보직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전KPS는 부서장이 회의 성격을 감안해 사업의 내용을 잘 아는 사업부장이 대리 참석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애초 이 회의는 부서장이 부재 시에 하위 직원이 대리 참석하는 사업 추진 관련 사장 주재 회의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직원은 지난해 12월2일 조직 개편 시에 회사 정기 인사이동 발령에 따라 실장 보직에서 재무리스크 관리 담당(부장급)으로 보직됐다. 다른 부서 전문계약직도 보직보다는 직급을 유지해 전문 직무를 수행 중이라는 것이 한전KPS의 주장이다.
이후 해당 직원은 부서 내에서 추진 중인 지분투자 사업 관련 절차 수립 등에 대한 업무를 맡았다.
다른 의혹도 제기된다. 이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사내 공식 신고 채널인 '레드휘슬'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감사실이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감사 기간에 해당 직원을 텅 빈 회의실에 방치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한전KPS는 감사실이 노무사 자문을 거쳐 올해 4월7일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시작했고 지난 6월25일 최종 결과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직원에게 조사 진행 사항과 법률 질의 내용에 대해 통지도 했다는 입장이다.
근무 장소를 격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별로 사무실에서 분리 근무를 시행한 것이라고 했다.
한전KPS는 설명자료에서 "관련 업무 종료로 인한 계약 연장 어려움으로 퇴사 과정에서 본인이 느꼈을 심적 부담에 대해 위로의 뜻을 표명하고자 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모든 구성원 간 소통 및 직무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