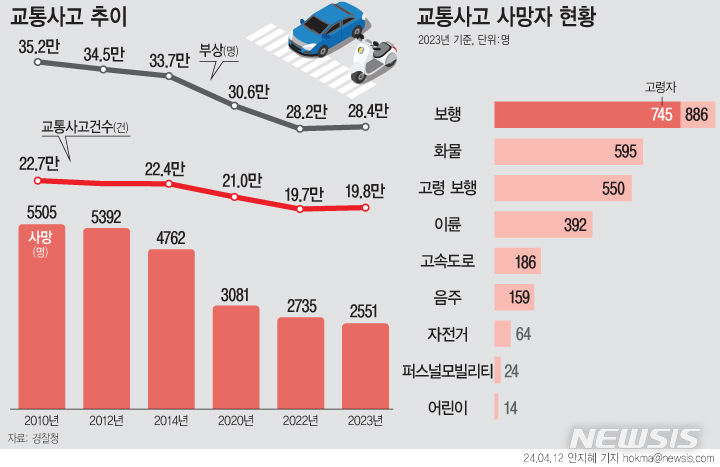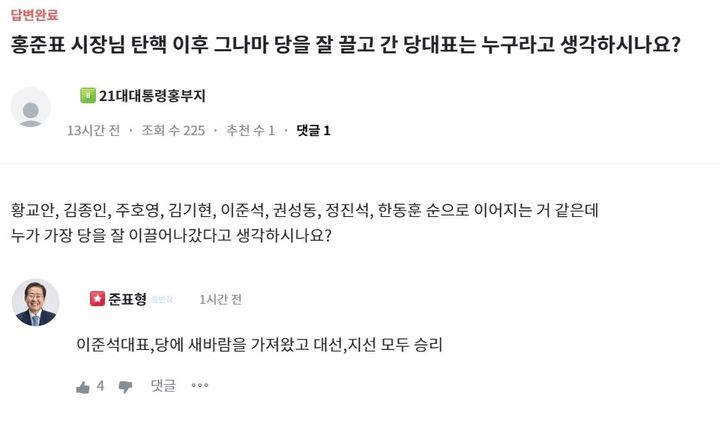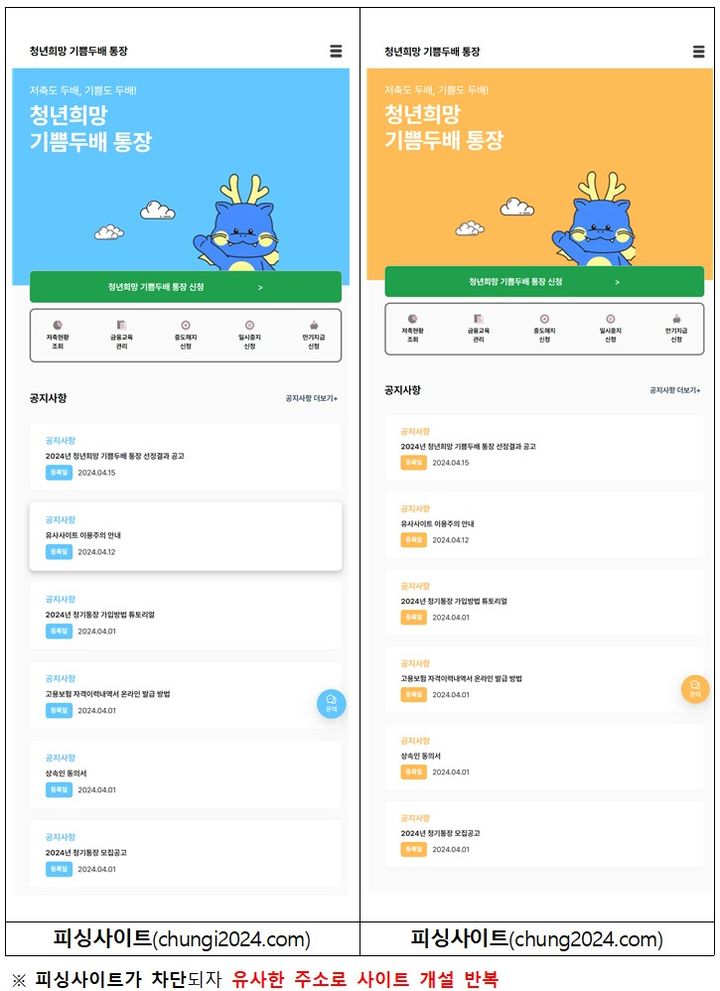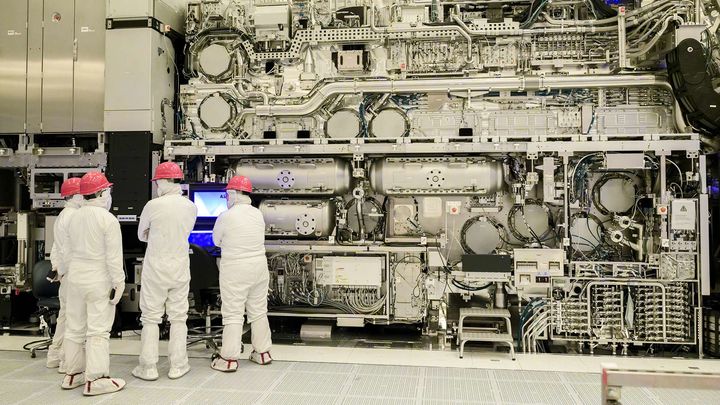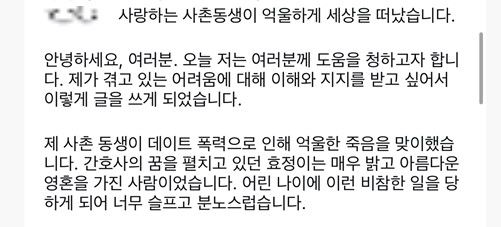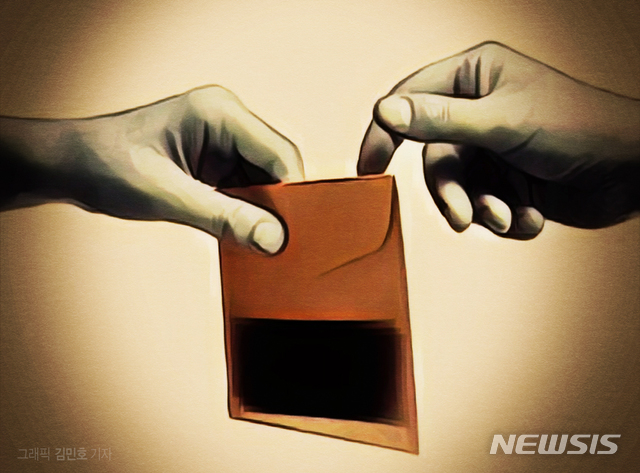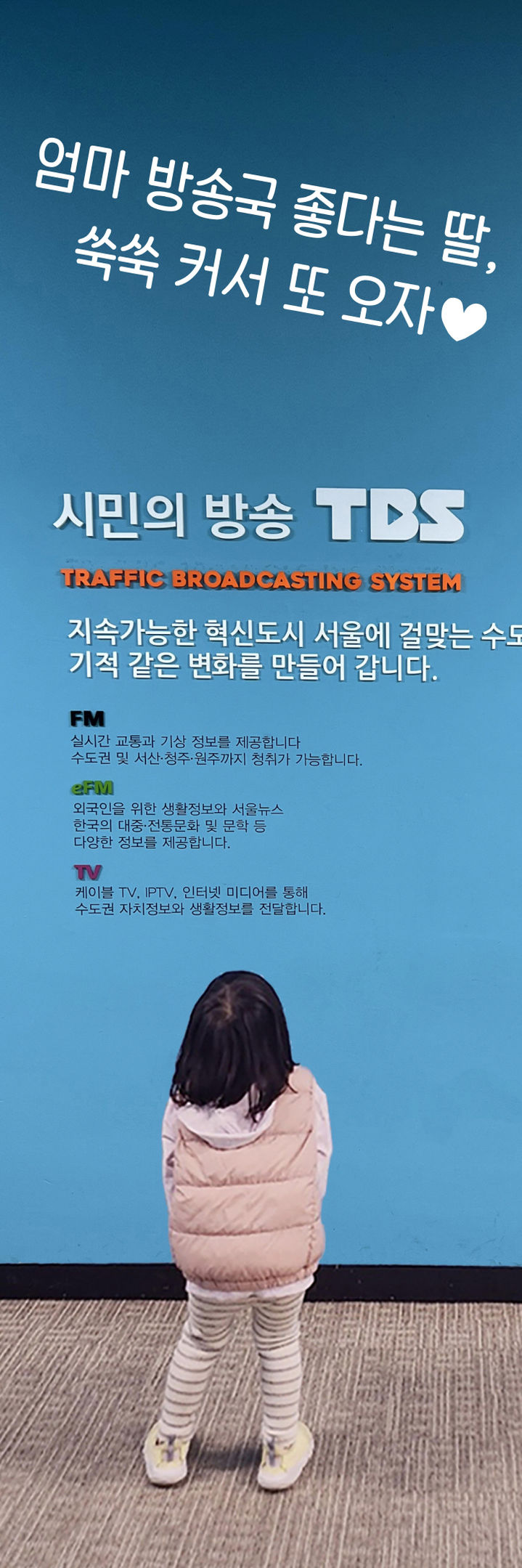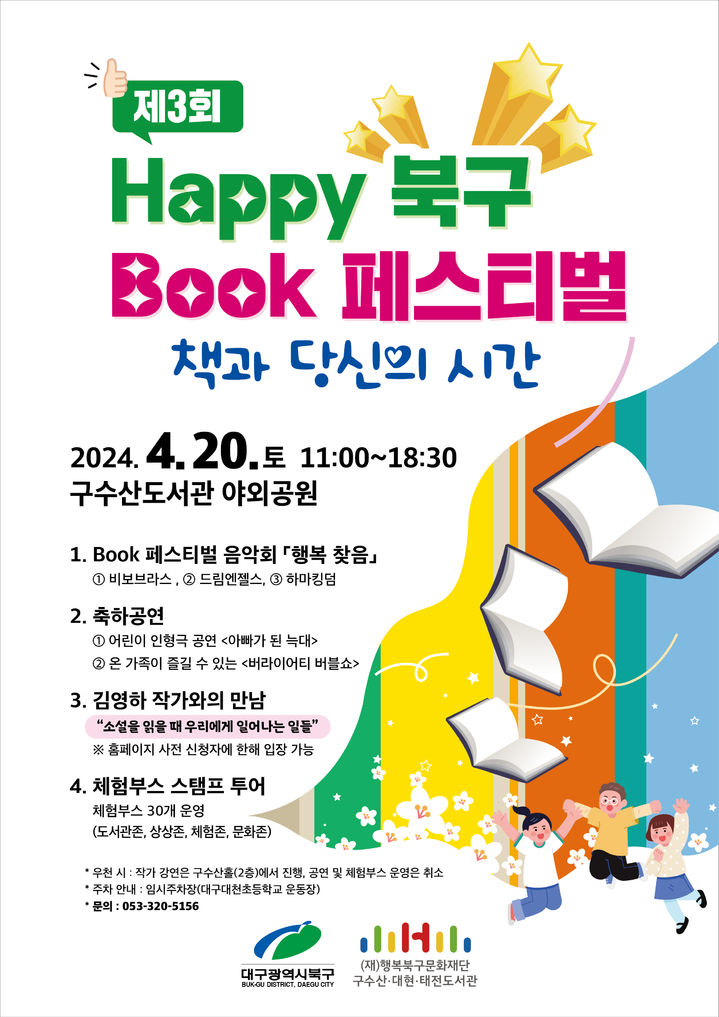秋 "대통령이 비선 메시지? 그럴분 아냐"…尹발언 반박
추미애 장관, 26일 법사위 종합감사 참석
윤석열 발언 조목조목 반박…거듭 사과도
라임·옵티머스 사건, 윤석열 대응 비판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0/10/26/NISI20201026_0016822590_web.jpg?rnd=20201026160030)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email protected]
추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 참석해 "윤 총장의 발언으로 국민들도 불안하다"라며 "앞으로 잘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종합감사는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장에서 나왔던 '윤석열 발언'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한 추 장관의 입장을 물었고, 추 장관은 '장관은 검찰 사무 전반을 지휘·감독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감장의 발언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봤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말했다.
특히 윤 총장이 '대통령이 총선 이후 자리를 지켜달라고 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그분의 성품을 비교적 아는 편인데,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은 아니다"라며 "이런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는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추 장관은 "다수의 검사는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치화하는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것"이라며 "총장의 여러 발언은 민주주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또 윤 총장이 '정계 입문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만약 내일 당장 정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저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을 지켜줘야 한다:며 "발언에 좀 더 신중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윤 총장의 답변도 적절치 않아 새로운 감찰 대상이 됐다는 취지의 언급도 있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윤 총장이 라임 의혹에 관련이 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는데 지난 22일 감찰을 다시 발동한 것은 이상하다"라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총장이 국감장에서 한 발언이 새로운 감찰 대상이 됐다"고 했다.
그는 "국감 도중에 총장이 상당한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이 보고됐는데, 이 사안에 대해 총장이 몰랐다고 하는 것에도 의혹이 있어 감찰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총장이 부인함으로써 감찰 대상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8년 한국통신전파진흥원에서 수사의뢰한 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이 "부장검사 전결이라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추 장관은 "검찰 업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총장이 남부지검에서라도 처리가 됐으니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답변했다면 대단히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