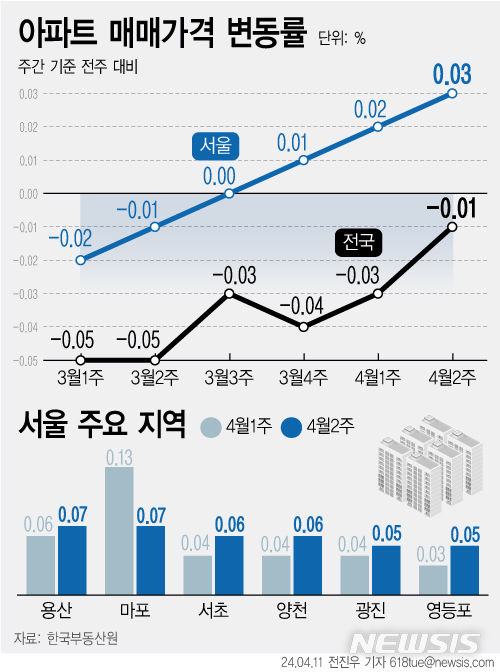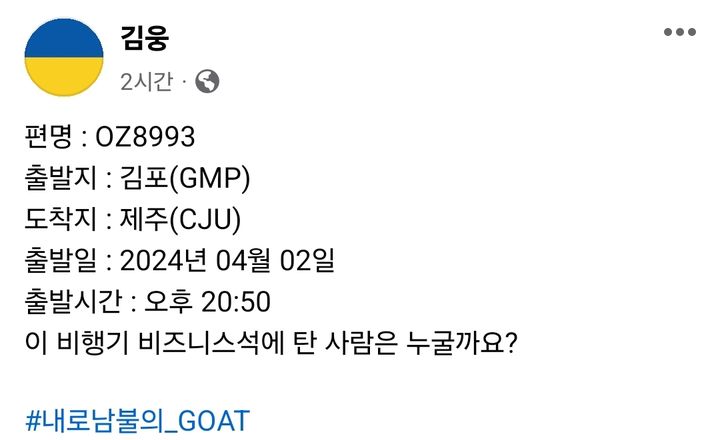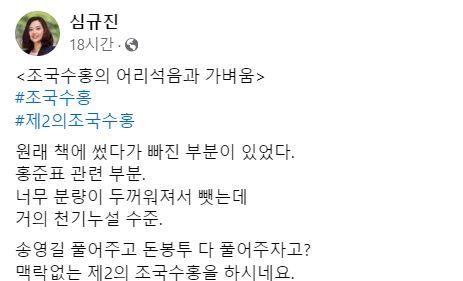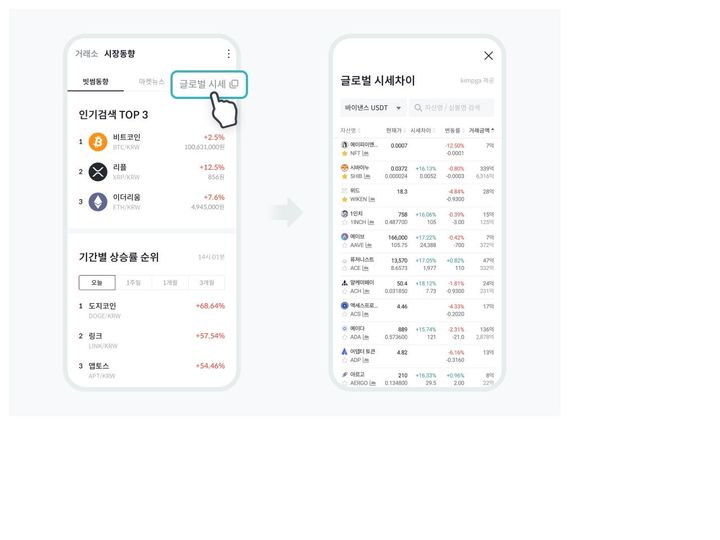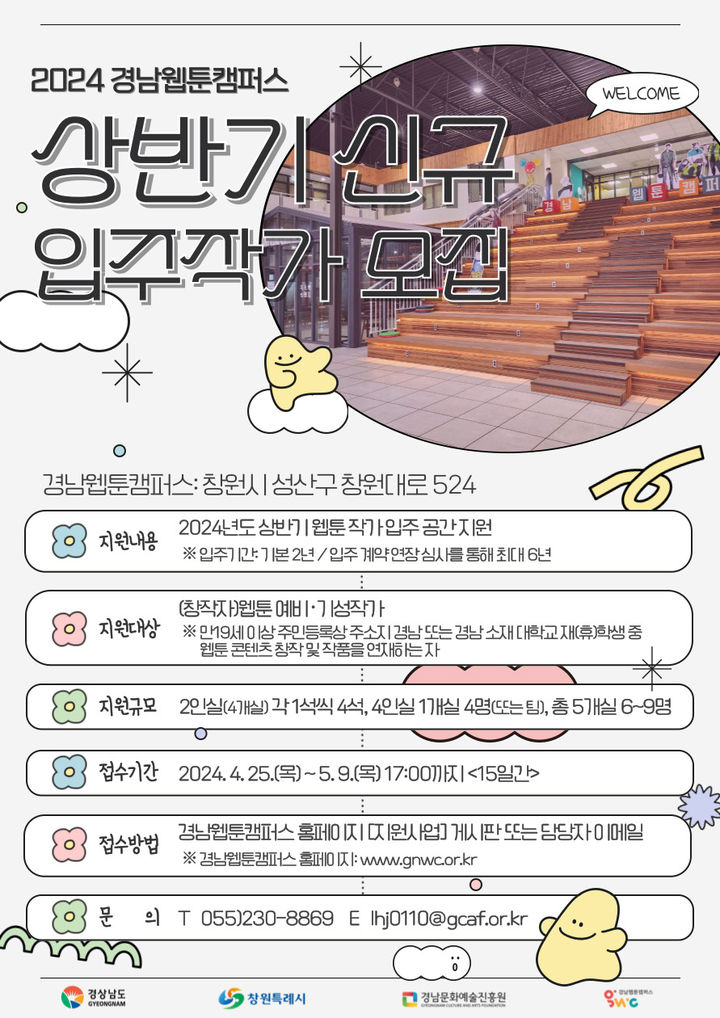[단독]"밀린 전기요금 21억 내라"…한전, 뒤늦은 청구서에 농민 '피눈물'
버섯농장서 농사용 1900㎾ 규모 전력 공급 계약 체결
반년 뒤 약관 개정돼 '농업용→산업용'으로 요금 바뀌어
약관 변경 사실 통보 없던 한국전력, 6년 뒤 '요금 폭탄'
A씨 "몰랐다" vs 한전 "원칙위배"…법원, 한전 손 들어줘
최근 조정 신청 "납부액이라도 줄여야…억울하다" 분통
![[세종=뉴시스]한국전력 나주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DB)](http://image.newsis.com/2020/10/14/NISI20201014_0000616562_web.jpg?rnd=20201014091104)
[세종=뉴시스]한국전력 나주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DB)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2018년 11월께 충북 음성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농민 A씨에게 21억원어치의 전기요금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2012년 8월 맺은 계약에 따라 농사용 전기요금을 내고 있었는데 같은 해 12월에 약관이 바뀌면서 5배가량 비싼 산업용 요금이 새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전력과는 약관이 바뀌기 전에 계약을 맺었고 이후 약관 변경과 관련된 어떠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한전은 A씨에게 이와 관련된 통보를 전혀 하지 않았다.
한전 입장에서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전기를 판 것이지만, 이 사실은 자체 감사를 통해 6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드러났다. 그동안은 한전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이를 인지한 한전은 약 2년간의 재판을 거쳐 이번에 밀린 요금을 모두 받아낼 수 있게 됐다.
세금은 아니지만 공공재 사용료인 전기요금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었던 점은 우려스럽다. 고의성 여부를 떠나 A씨에게 제때 변경된 내용을 알려줬다면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전기요금 폭탄에 농사 접어야 할 판"
앞서 한전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전기요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잘못 계산된 전기요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한 바 있다.
이후 진행된 대전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A씨는 전기요금 폭탄을 고스란히 얻어맞게 됐다.
청구된 금액은 약 21억6300만원이다. 이는 A씨가 그간 내온 농사용 전기요금(㎾당 1070원)과 새로 적용된 산업용 전기요금(㎾당 5090원)의 차액이다.
현재 한전은 계약종별로 산업용,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등으로 나눠 전기요금의 판매 단가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경과를 보면 2012년 8월 A씨와 한전은 1900㎾ 규모의 농사용 전력 공급 계약을 맺었다. 당시 A씨는 버섯농장 부지를 둘로 나눠 한쪽은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각각 950㎾씩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계약을 맺은 뒤 6개월이 지난 2012년 12월에 발생했다. 한전이 계약전력의 합계가 1000㎾ 이상이면 농사용이 아닌 산업용 전력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바꿨기 때문이다.
계약을 쪼개서 체결했지만 A씨가 실질적인 소유주이기 때문에 이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해당한다는 게 한전의 주장이었고, 법원이 이를 받아준 것이다.
이에 A씨는 약관이 바뀐 줄도 몰랐다며 황당해했다. 그는 전기요금이 비싸졌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살균 작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보일러를 비교적 저렴한 기름보일러로 바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일반적인 전기요금은 매달 청구서를 받기 때문에 변동이 있으면 곧바로 알 수 있지만, 농업용은 처음에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별도로) 통보가 되지 않으면 계약종별이 바뀐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A씨가 공개한 당시 전기 사용 계약서를 보면 '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 내용의 변경을 문서로 요청하지 않는 한 1년마다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A씨는 "상식적으로 약관이 바뀌면 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갑작스럽게 차액을 내라니 당황스럽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대로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면 농사일을 접거나 농장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씁쓸해했다.
"이미 법원 판결이 난 사안…계약 정상화 차원"
또한 전기 공급 약관이나 시행 세칙이 변경될 경우에는 계약서보다 이를 먼저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약관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농사용 계약전력에 상한을 두지 않았던 것이 맞다"며 "이 경우는 1구내의 회계 주체가 동일하면 하나의 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공급 원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징이라기보다 계약 정상화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은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애초 한전 전기요금 청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지금처럼 전기요금 계약 변경과 관련된 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슷한 사례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한전은 버섯농장에서 발생한 8년 치 전기요금 차액을 다 돌려받지 못한다. 전기요금 소멸 시효에 따라 3년 치만 청구할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 액수만큼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지금은 전기요금 체계가 디지털화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갖춰져 있다"며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것이지 비일비재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