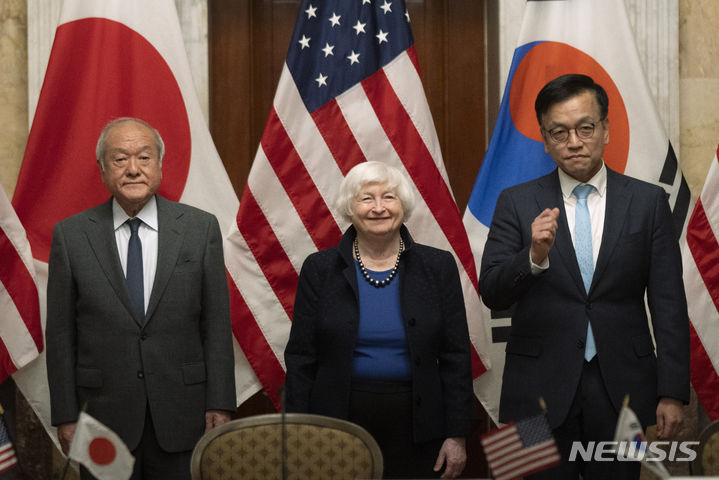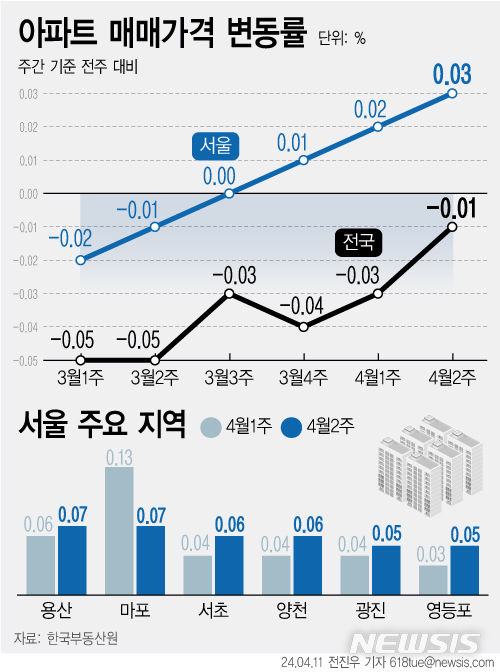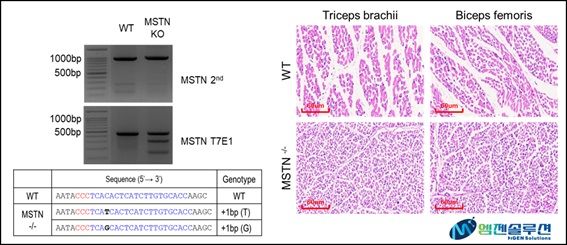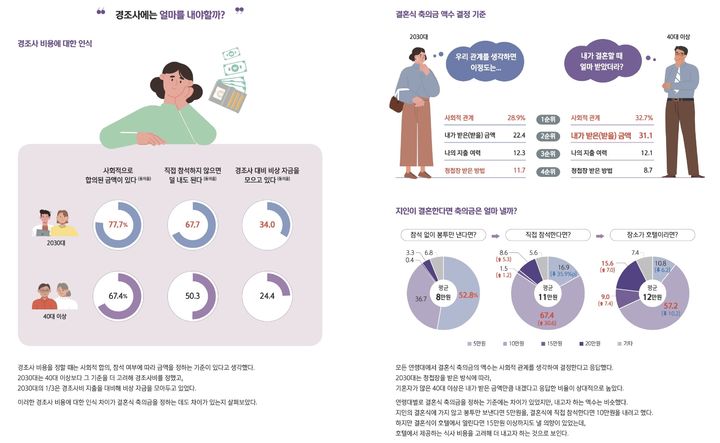[기자수첩] '쏠림' 중계에 가려진 감동의 드라마
![[기자수첩] '쏠림' 중계에 가려진 감동의 드라마](http://image.newsis.com/2017/02/21/NISI20170221_0012712690_web.jpg?rnd=20170221155528)
같은 날 저녁에는 구기 종목 대전이 펼쳐졌다. 오후 7시 가장 먼저 야구 중계로 출발했지만, 한 시간 뒤 이내 지상파 3사 모두 축구로 갈아탔다. 지상파 두 채널을 보유한 KBS는 1TV로 야구 중계를 넘겼다. 동시간대에 열린 여자 배구 경기는 치열한 접전 끝에 역전을 일궈낸 한일전의 명승부를 펼쳤지만, 지상파 케이블 스포츠 채널과 온라인을 통해 중계되면서 시청자들의 접근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4년마다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1년 뒤늦었다고 달라지진 않았다. 이른바 인기 종목 위주로 방송하는 지상파 3사의 '겹치기 중계'가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도 어김없었다. 수많은 스포츠 경기가 펼쳐지는 올림픽인 만큼, 한국 대표팀의 경기를 중심으로 방송되기에 세계적인 선수들의 경기까지 안방에서 모두 만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한국 대표팀의 여러 경기가 겹쳤던 날,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인기 종목으로 꼽히는 축구, 야구에 배구까지 동시에 열리면서 이들 종목 역시 '간택'을 피하지 못했다. 그날 "축구 야구 배구 중 어떤 경기를 보셨습니까"란 한 앵커의 뉴스 오프닝 멘트에 시청자들이 볼멘소리를 쏟아낸 이유다.
올림픽 기간 내내 지상파 3사는 앞다퉈 화려한 해설진을 자랑하며 중계 시청률 1위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즐기고 응원하고 싶은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실천해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순 없는지 되묻고 싶다. 실제 선수들의 피, 땀, 눈물로 이뤄내는 역사적 순간은 예측을 뒤엎고 탄생한다. 예고없는 감동의 드라마에 함께 환호하고 박수를 보낸 시청 지표가 그 목소리를 방증한다.
24년 만에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육상 높이뛰기의 새 역사를 쓴 우상혁 선수의 결승전은 시청률 19.2%(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를 기록했다. 그의 비상에 최고 시청률은 27.1%까지 뛰었다. 최종 4위에 오르며 메달을 얻진 못했지만, '육상 불모지'에서 새 희망을 쏘아 올리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 경기는 KBS 1TV가 단독 중계했고, 동시간대에 지상파 3사(KBS는 2TV)가 똑같이 내보낸 야구 경기의 총합 시청률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또 배드민턴 남자 단식에서는 세계랭킹 1위인 일본 선수 모모타 겐타를 누르며 8강에 직행한 허광희 선수의 대이변이 나왔다. 하지만 시합 전 비인기 종목으로 주목받지 못하며 다른 경기에 밀린 그의 경기는 생중계되지 못했고,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그 기쁨의 순간을 나누지 못했다.
이들 종목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이번 올림픽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메달 기대 종목이 아닌 경우 매번 올림픽 중계에서 홀대를 받는다는 지적은 반복돼왔다. 그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도 국민들의 시청권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지상파 3사에 순차 편성을 권고해왔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였다.
시청자들의 스포츠에 대한 인식과 눈높이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지만, 방송 중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중복 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는 값비싼 중계권료에 따른 이유도 있을 테다. 하지만 4년마다 돌아오는 땀의 무게만큼, 그 노력의 기록과 역사를 국민과 함께 새기고 즐기는 기회를 제공하는 지상파 3사 중계의 무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인기, 비인기 구분을 떠나 스포츠 정신을 담은 중계를 기대하긴 어려울까. 일각에서는 순차 편성 의무화 목소리까지 나온다. 나흘 뒤 도쿄올림픽은 막을 내리지만, 3년 뒤 파리 올림픽에서는 진정 축제 같은 중계를 기약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