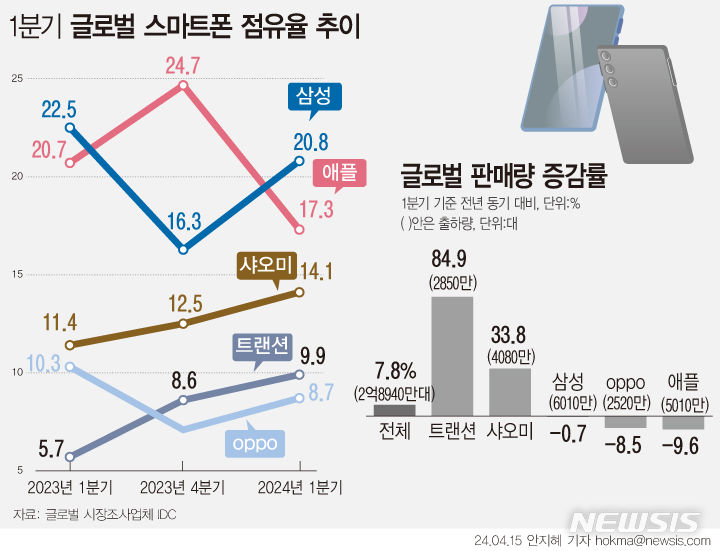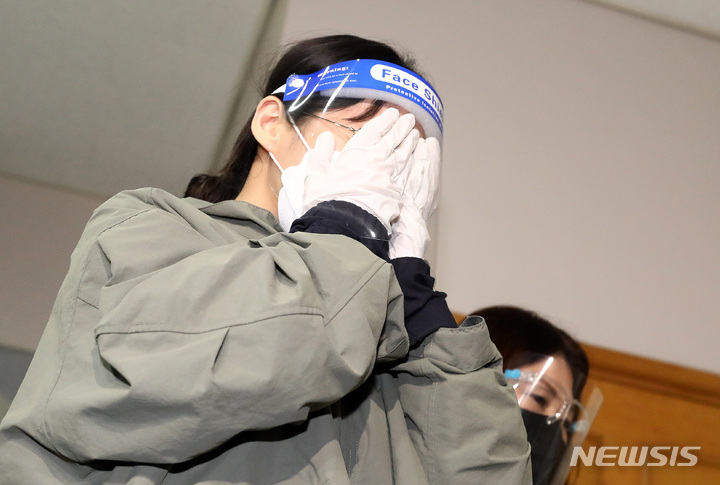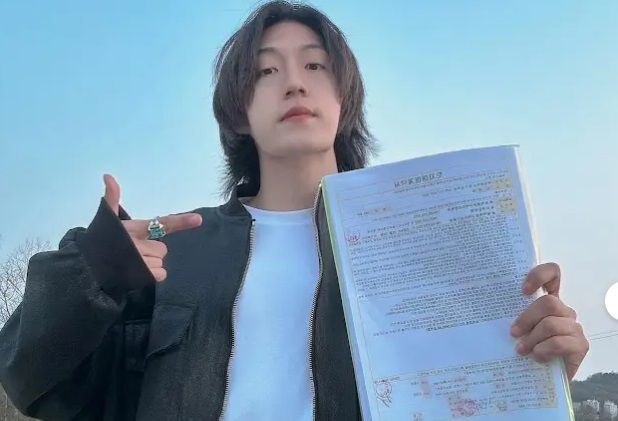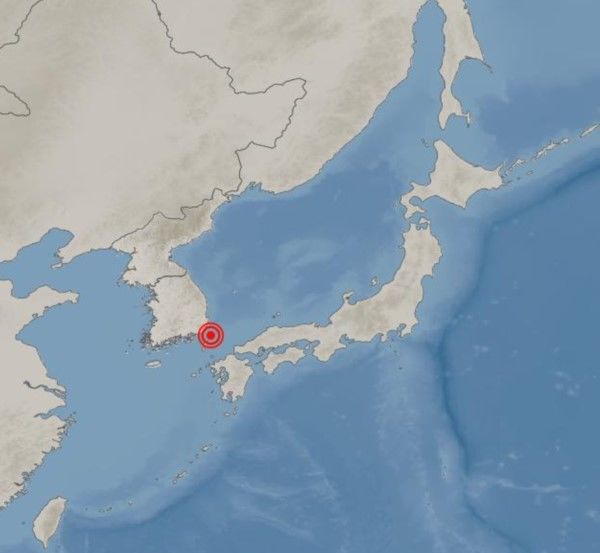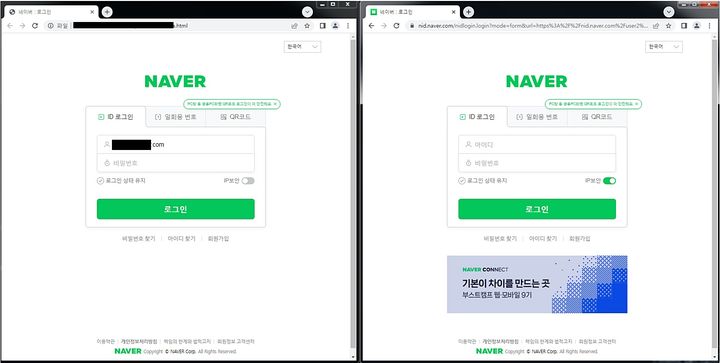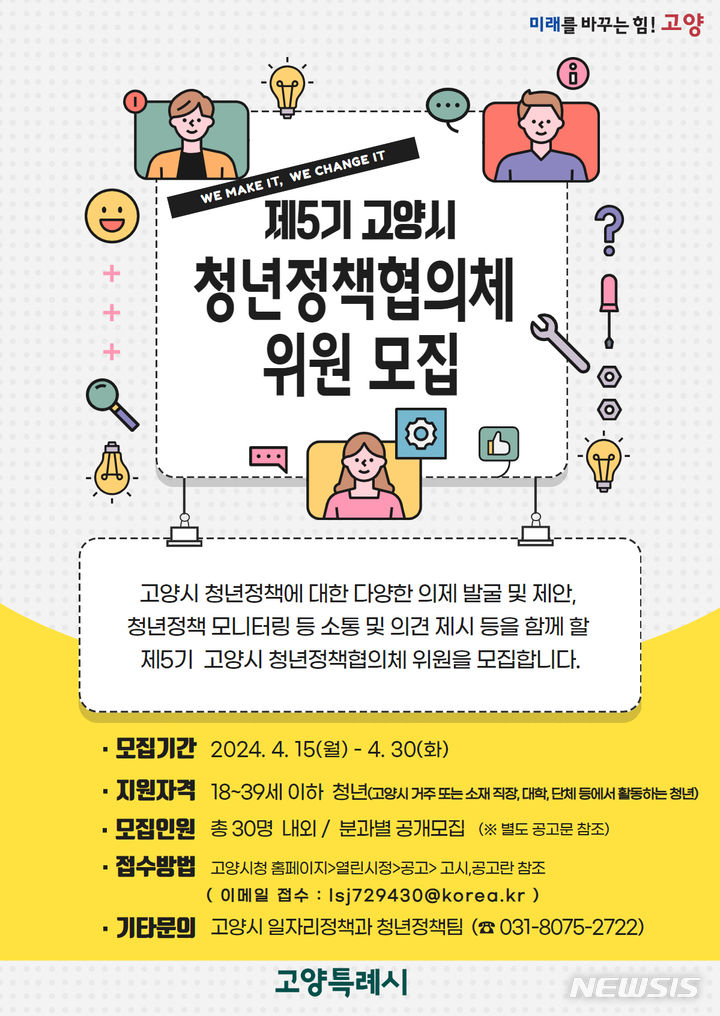최재형 "'윤핵관 대 이핵관' 자리 다툼, 당에 있어선 안 돼"
"국민 어려움 해결책 제시 위한 경쟁 해야할 때"
"정파·개인 유불리 떠나 공감할 혁신 추진할 것"
'3선 연임 금지' 규칙에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7.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2/06/27/NISI20220627_0018963864_web.jpg?rnd=20220627161731)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7. [email protected]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대 이핵관(이준석 핵심 관계자)의 권력 투쟁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윤핵관 대 이핵관 권력 투쟁에 대해 깊은 내용을 다 알기는 어렵다"면서도 "적어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치적 집단에서 세력 간 경쟁, 싸움이 없을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이쪽저쪽 나뉘어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면서도 "누구도 정말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감정적인 대응과 상대방 비난을 자제하고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을 위해 어떤 것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할지에 대해 경쟁해야지 여소야대 상황에서 권력을 잡았다고 자리 다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정말 우리 당이 보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곡절 끝에 혁신위가 출범했다'는 진행자 발언에 "예상치 못했던 여러 의견이 나왔다. 출범 자체부터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보시는 분들이 많다"면서도 "모였을 때는 당내 잡음과 관계없이 당이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준비를 잘해야겠다는 생각들로 분위기가 괜찮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준석 사조직' 논란에 대해 "위원 면면을 보면 알겠지만 사조직 운운하는 분들은 과연 당과 국가를 위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다"며 "정파나 개인 유불리를 떠나 보수 정당,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혁신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공천룰 정비를 위해 혁신위가 출범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공천이고 공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여러 오해를 낳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당원과 국민이 공감할 안을 마련할 것이다. 혁신위 출발의 원인이 공천 혁신이라는 것은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견해"라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처럼 '3선 이상 연임 금지'도 논의할 수 있다는 조해진 부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혁신위 논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아울러 이 대표의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대해 '징계 반대'를 주장한 적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위 판단 예측을 묻는 인터뷰에서 '예측할 수 없다' 그랬더니 전제가 되는 성상납 행위는 있어야 하고, 행위 자체가 없다는 증거인멸도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설명한 것"이라며 "성상납 행위든 증거인멸 행위든 윤리위원들이 증거에 의해 판단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런 설명이 왜 '징계 반대'로, 이 대표를 옹호하는 것처럼 해석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객관적으로 법리와 증거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증거가 나왔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