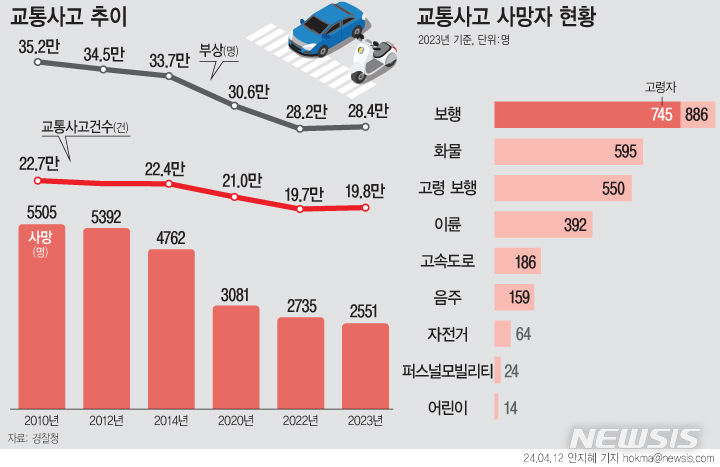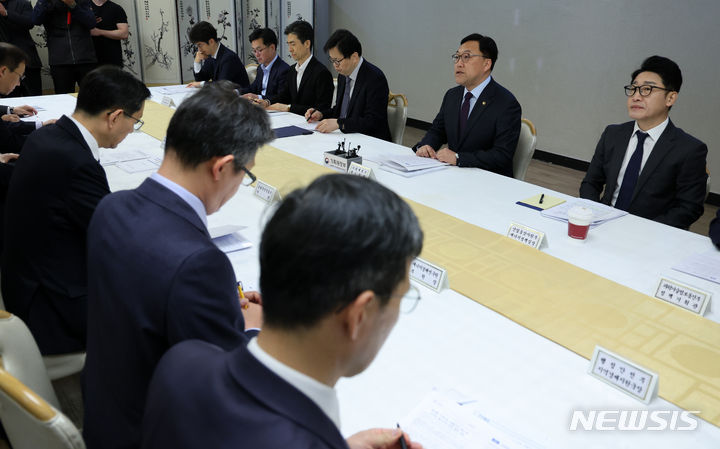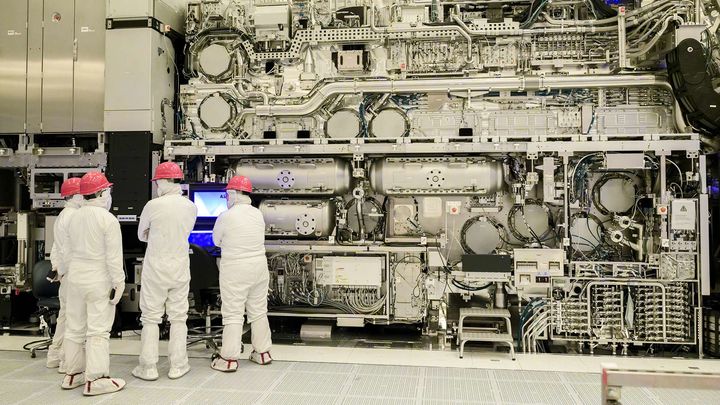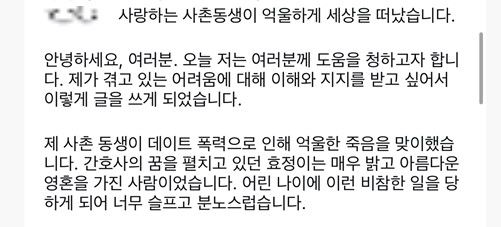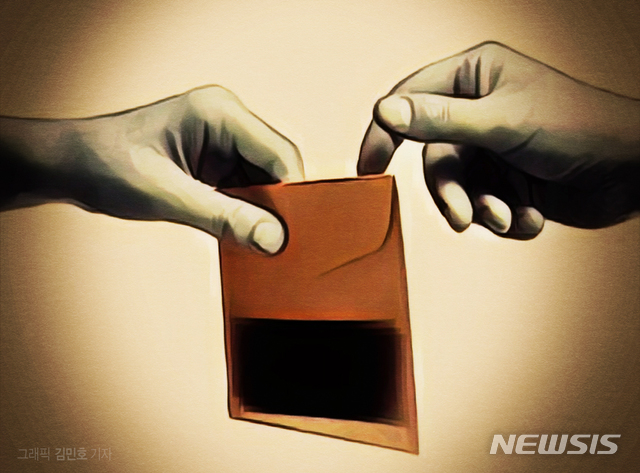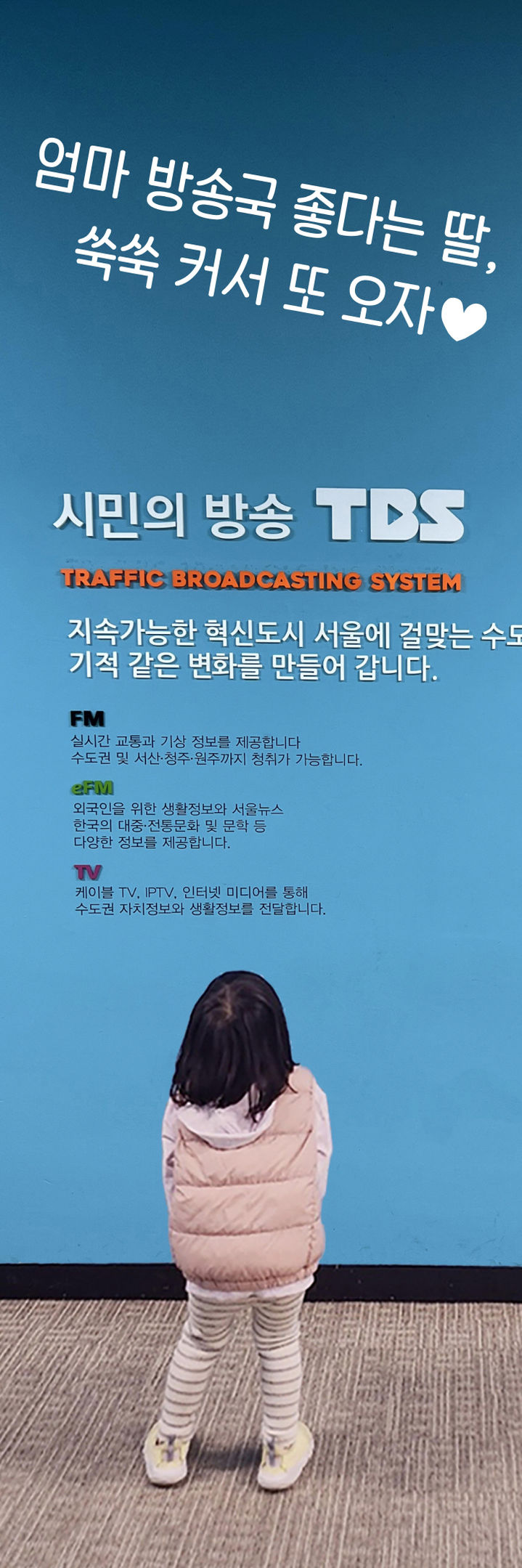메르스 때와 달리 금리동결…인하는 언제
한은 "1분기 충격 집중, 진정시 경기 개선 흐름"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불가피" 4월 가능성 고조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금리인하론이 불붙었지만 한국은행의 선택은 연 1.25%의 금리동결이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1%로 낮춰잡으면서도 신중론을 고수한 것이다.
한은도 코로나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1분기 경기가 일시적으로 위축되더라도 3월 이후 진정세로 돌아선다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고 본다. 경기가 하강 국면에 놓여 즉각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했던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와는 차이가 난다는 진단이다. 당시 한은은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인하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가 3월 이후 진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는데 예상대로 전개될지, 그보다 장기화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충격은 우려되지만 당장 금리를 인하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환석 한은 조사국장도 "과거 감염사례를 보면 (경기의) 기조적 흐름까지 바꿀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사태에서) 벗어나면 충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단행한 금리인하 효과를 지켜볼 필요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지난해 두차례의 금리인하가 금융시장에 원활히 파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코로나 발발로 실물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지난해 금리인하가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리 조정이라는 '큰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는 미시적 지원이 코로나 충격 완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한 발 더 나아가면 사상 최저 수준인 1.0% 시대가 열리는 만큼 한은 입장에서는 상황이 급박해질 때 쓸 수 있는 카드를 비축해둘 필요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 섣부른 금리인하시 가계빚 증가세를 부추겨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로 작용할 수 있는 점도 금리동결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이번 금리동결이 코로나 사태가 3월중 정점에 도달한 뒤 진정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아쉬운 선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만약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보다 확대될 경우 한은은 선제 대응에 실패했다는 금리인하 '실기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한은의 금리인하는 시기만 늦춰진 것일 뿐이라고 보는 전망이 많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정부와의 정책 공조 차원에서 4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우세하게 제기된다. 조영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2월 인하론이 많았으나 통화당국은 선제 대응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차례 금리인하로 현재 상황을 방어하고 금융안정 요인을 감안했을 때 4월 인하가 편안한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도 "이번 금통위가 다소 매파적이었지만 인하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판단"이라며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한은이 4월 추가 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은 전망에 따르면 1분기 성장률은 -0.4%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은도 금리인하에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 총재는 "성장경로상 불확실성이 높은게 사실"이라며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필요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금리인하 여부는 코로나19 사태 전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가 과거 감염병보다 충격이 크다는 입장을 고려하면 향후 금리인하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충격이 심화되거나 장기화되지 않을 경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 기준금리를 정하는 한은 금통위는 4월9일 예정돼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