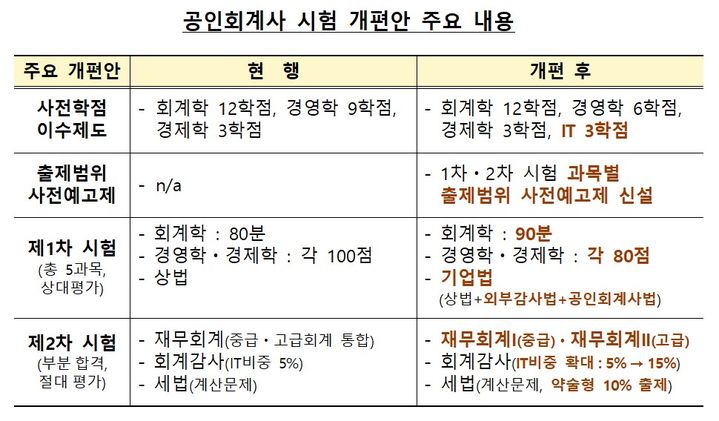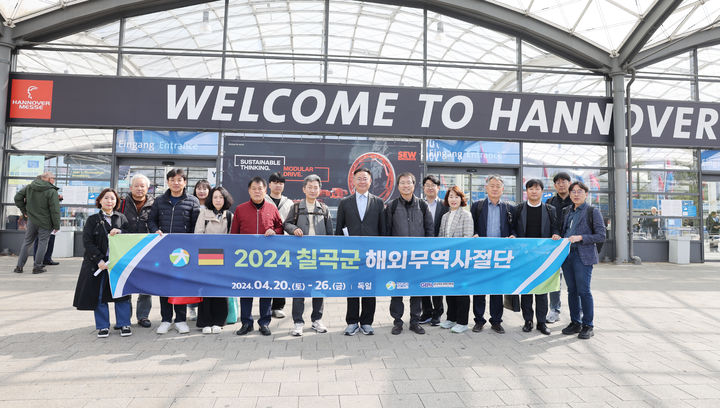美中, 홍콩 보안법 놓고 주변국에 지지 압박…韓 외교 부담 가중
美국무부, 워싱턴서 홍콩 보안법 제정시 우려 전해
주한中대사관 "한국 각계와 홍콩 보안법 제정 공유"
28일 외교전략조정회의서 대응 방향 및 전략 논의

27일 외교가에 따르면 주한중국대사관이 한국 정부와 홍콩 보안법 제정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며 사실상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역시 워싱턴D.C에서 외교채널을 통해 홍콩보안법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최근 미 국무부가 워싱턴에서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과 향후 검토할 방향 등에 대해서 주요국에 외교단 몇몇 나라들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미국 정부는 1997년 홍콩이 중국 본토로 반환된 후 홍콩의 자치권을 인정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정책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홍콩 보안법 제정에 반대하고, 강행 시에는 홍콩에 대한 경제·통상 분야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미국은 동맹국 외교단에 이같은 우려를 전달하며 지지를 요청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역시 한국 정부에 홍콩 보안법을 적극 설명하면서 지지와 이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지난 24일 관영 중국중앙(CC)TV 인터뷰에서 "한중 양국은 우호적인 이웃국으로서 상호 핵심이익을 일관되게 존중해 왔다"며 "홍콩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에 홍콩 보안법의 (제정) 배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개하려 하며, 한국 친구들이 (홍콩 사안과 연관해) 이해와 지지를 보낼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최근 한국 각계와 홍콩 보안법 입법 활동에 대한 내용을 여러 레벨에서 공유해 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에 지지를 요청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공유 목적은 이해 증진이다. 중대한 사안이 나올 때는 공유하는 것이 외교 관례"라고 답해 사실상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콩=AP/뉴시스] 27일 홍콩 센트럴 지역에서 시위대가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무장한 경찰관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20.05.27](http://image.newsis.com/2020/05/27/NISI20200527_0016353515_web.jpg?rnd=20200527180253)
[홍콩=AP/뉴시스] 27일 홍콩 센트럴 지역에서 시위대가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무장한 경찰관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20.05.27
정부는 홍콩 보안법을 미중 갈등 상황을 주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했다가는 과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사태처럼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상황을 아주 속속들이 주시해야 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주 면밀히 다방면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오는 28일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를 열고 미중 갈등 상황을 비롯한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과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외교전략조정회의는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능동적인 대외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