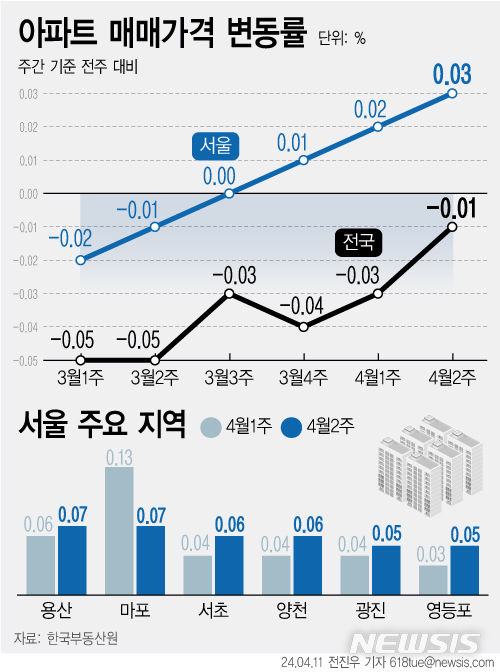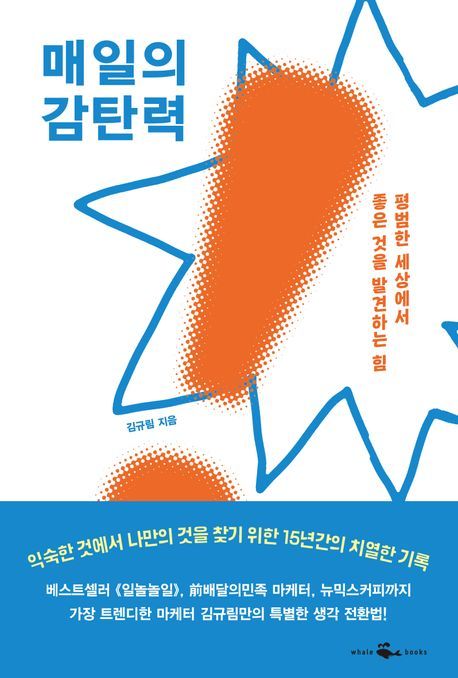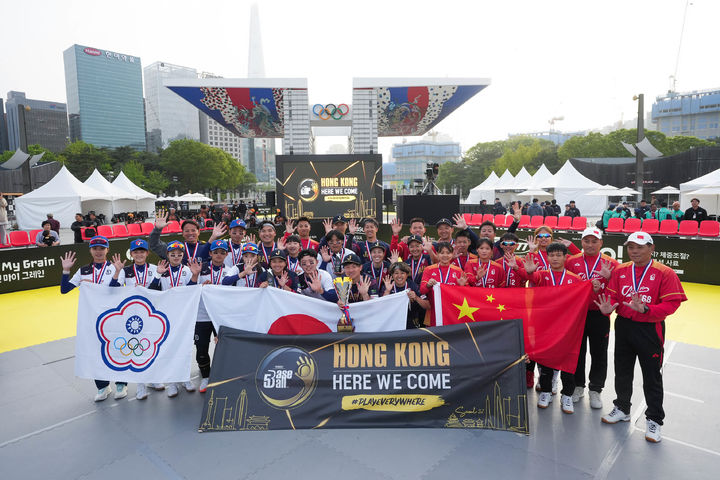박범계 "검찰 인사, 김오수 총장 의견 많이 반영했다"(종합)
"검사 염두에 두고 인사하지 않았다"
'직제개편' 지적엔 "총장이 후속조치"
"좌천된 검사들에 대한 구제 있었다"
"특히 대검 보직에 총장 의견 반영해"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6.25. sccho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1/06/25/NISI20210625_0017599964_web.jpg?rnd=20210625111410)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6.25. [email protected]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안에 따르면 '김학의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50·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형사 3부장, 변필건(46·30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월성 원전 사건' 수사를 벌인 이상현(47·33기) 대전지검 형사5부장이 모두 전보 조치됐다.
이를 두고 조 의원이 "권력형 비리 수사를 뭉개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특정한 검사를 인사 요인으로 두고 인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수사팀이 바뀌었으니 사실상 사건 재배당 아니냐'는 지적엔 "특정 사건은 1차 수사가 끝났거나 새로운 혐의점이 발견돼 2차적인 수사는 새로운 수사팀에 의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사건 재배당은 장관의 소관이 아닌 검찰총장 등의 소관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정섭 부장을 대구지검으로 보낸 것은 정상 인사냐"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수평이동이다"라며 "보임과 전보 원칙에 충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이동하고 이규원 검사가 승진 인사된 것과 관련한 비판에도 "공적인 판단으로 인사를 했는데 그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그 사건의 전개 과정 등을 참작한 속에서의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일반 형사부의 6대 범죄 수사를 제한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 형사부 검사가 자기 권한에 있는 수사를 하다가 직접수사 단서를 발견하면 수사를 못 하느냐"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이 향후 절차에 관한 예규를 통해 최초로 범죄 단서를 발견한 형사부 검사가 수사를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회 일정을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로 돌아오는 길에도 "수사라는 게 주요 관심 사건이 되면 인사 시기가 됐는데도 인사를 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 일단 있을 수 있다"며 "후임자에 의해 수사는 필요성이나 요건이 있으면 연속성을 갖고 가는 거니까 과대하게 의미 부여할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른바 라인에 따라 자리가 많이 갈렸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질문엔 "일부 언론이 보는 시각과 인사제청권자가 보는 시각이 늘 같을 순 없다"며 "나름 공정하게 했고 특히 좌천됐다고 하는 검사에 대한 구제 측면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인사요인을 굉장히 다양화했기 때문에 과거 형사·공판 우대 정도로 설명하는 것들을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여성, 대학·지역의 다양성, 법무연수원에서의 발탁이 있었다"며 "인권보호관 역시 지난번 대검검사급 인사와 같이 놓고 보면 기회를 부여하는 것 등 인사요인이 다양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보는지' 등 질문엔 "그렇다고 자부한다. 특히 대검의 보직은 김 총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