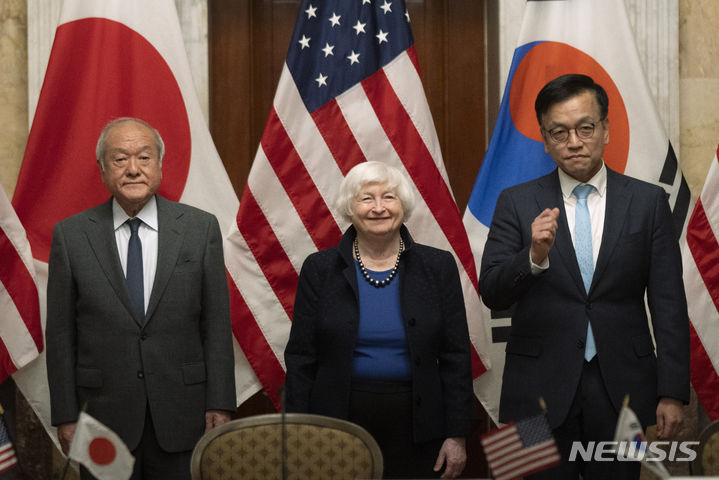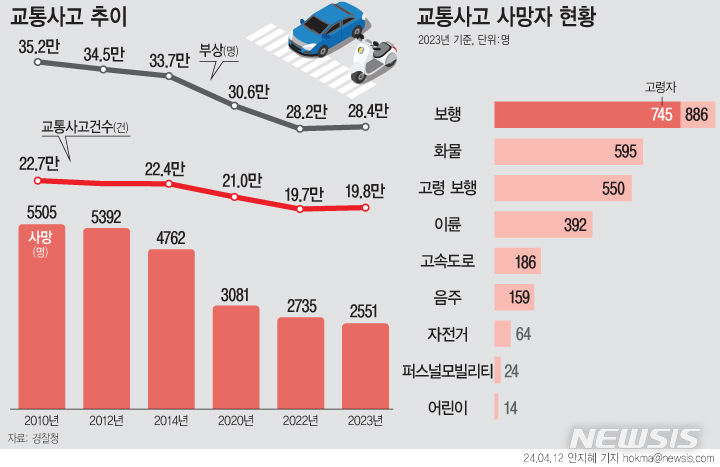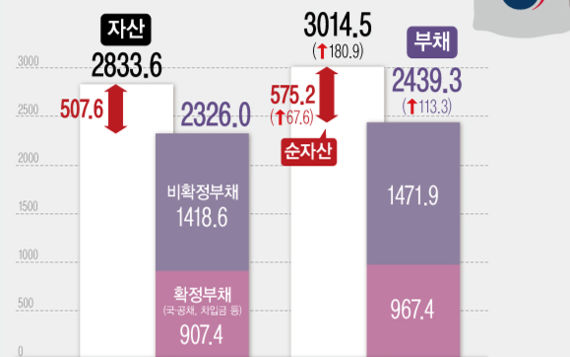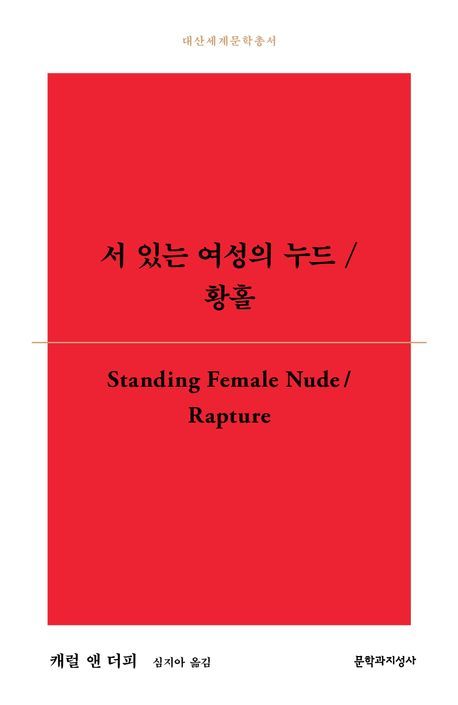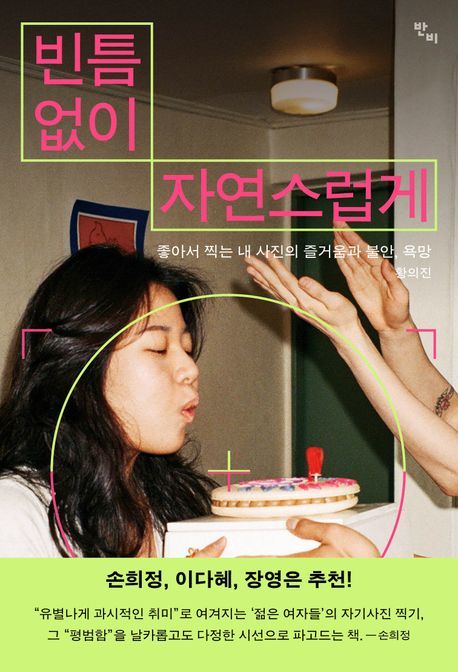중복 청약 막힌 카카오뱅크, 청약 전략은?
"둘째날 오후, 경쟁률 체크 필요"
비례 배정은 KB증권이 유리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시장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카카오뱅크가 이번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시작한다. 중복 청약이 제한됐다는 점에서 신중한 청약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날까지 경쟁률을 체크하며 청약 확률이 높은 증권사로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접수한다.
앞서 지난주 이뤄진 기관 수요예측은 역대급 자금 유입이 나타났다. 국내외 1667곳, 623억7743만6000주의 수요가 몰리면서 총 2585조원의 자금이 몰렸다. 이는 기존 역대 최고 주문규모였던 SKIET의 2417조원을 넘는 수준이다. 단순 경쟁률은 1733대1을 기록해 유가증권시장에서 2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카카오뱅크에 대한 열기는 기관뿐 아니라 일반투자자에게서도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뱅크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카카오의 높은 주가 상승률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의 공모가는 3만9000원이다. 최소청약은 10주이며 이에 따른 최소 필요 증거금은 50%인 19만5000원이다.
다만 올해 상반기 대어와의 차이점은 중복 청약이 제한됐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0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공모기업들은 중복 청약이 안되도록 규정했다. 카카오뱅크의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일은 6월28일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를 신중하게 골라서 청약할 필요가 있다. 카카오뱅크의 공모주 가운데 일반인 대상의 물량은 전체 신주의 25%인 1636만2500주이다. 이 중 KB증권이 881만577주로 가장 많이 배정됐고, 한국투자증권은 597만8606주, 하나금융투자는 94만3990주, 현대차증권은 62만9327주가 각각 배정됐다.
단순 배정된 주식수를 감안하면 KB증권이 유리해 보인다. 배정된 주식수의 절반은 균등배분이며 나머지는 비례 배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즉, KB증권은 440만5288주가, 한국투자증권은 298만9303주가, 하나금융투자는 47만1995주가, 현대차증권은 31만4663주가 균등배분이다.
하지만 배정 주식수가 적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아니다. 앞서 SK증권의 경우, SKIET 공모주 청약 당시 배정된 주식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쟁률을 기록해 원활한 균등배분이 이뤄졌다. 반면 SKIET 공모주 청약 당시 많은 배정 주식수에도 일부 증권사는 주당 1주가 배정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났고, 우리사주 실권주 107만주를 일반물량으로 추가 배정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감안할 때, 비례 배정으로 많은 주식수를 노리고 있는 투자자는 KB증권이 유리해 보인다. 고객당 최고 청약 한도가 87만주(증거금 169억6500만원) 이상으로 가장 많다. 반면 균등배분을 목표로 최소청약만 하는 투자자의 경우, 마지막날 경쟁률을 살피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그간 중복 청약으로 인해 첫째날부터 공모주를 청약하는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으나 카카오뱅크는 과거와 같이 둘째날 오후부터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마지막 날 경쟁률을 잘 살피고 투자해야 더 많은 주식을 배정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주의할 점은 공모주 청약 수수료가 있으며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KB증권의 경우, 오프라인은 골드/프리미엄 회원, 일반 회원을 대상으로 4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온라인은 일반회원에 한해 1500원을 받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오프라인은 프라임 회원 3000원, 패밀리 회원 5000원을 받고 있고, 온라인은 패밀리 회원등급에게만 2000원을 받는다. 하나금융투자는 오프라인은 패밀리와 그린 등급에게 2000원을 받고 있고, 온라인은 무료이다. 현대차증권의 경우,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은 5000원, 온라인은 2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