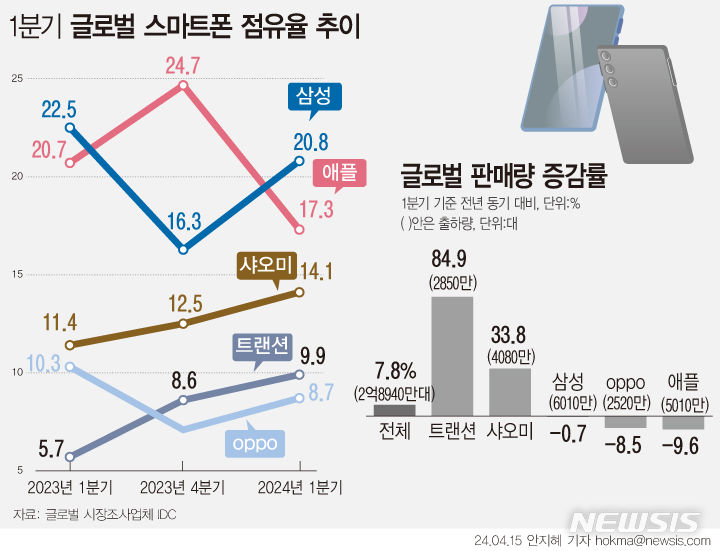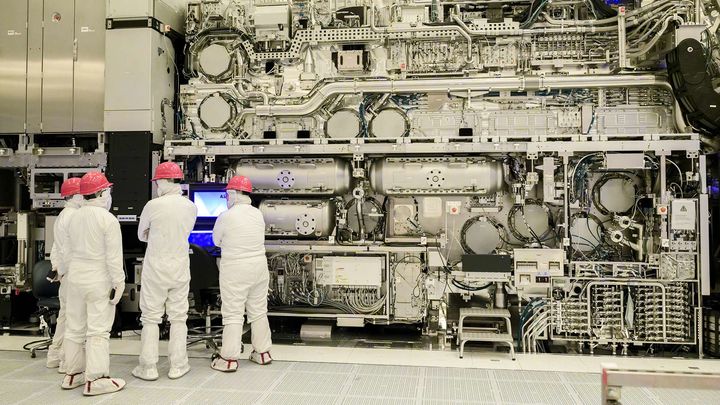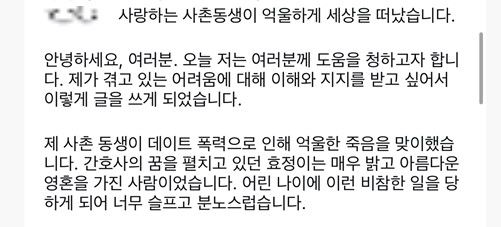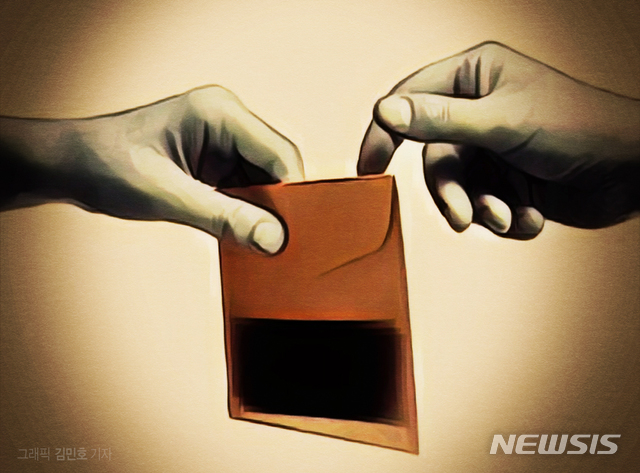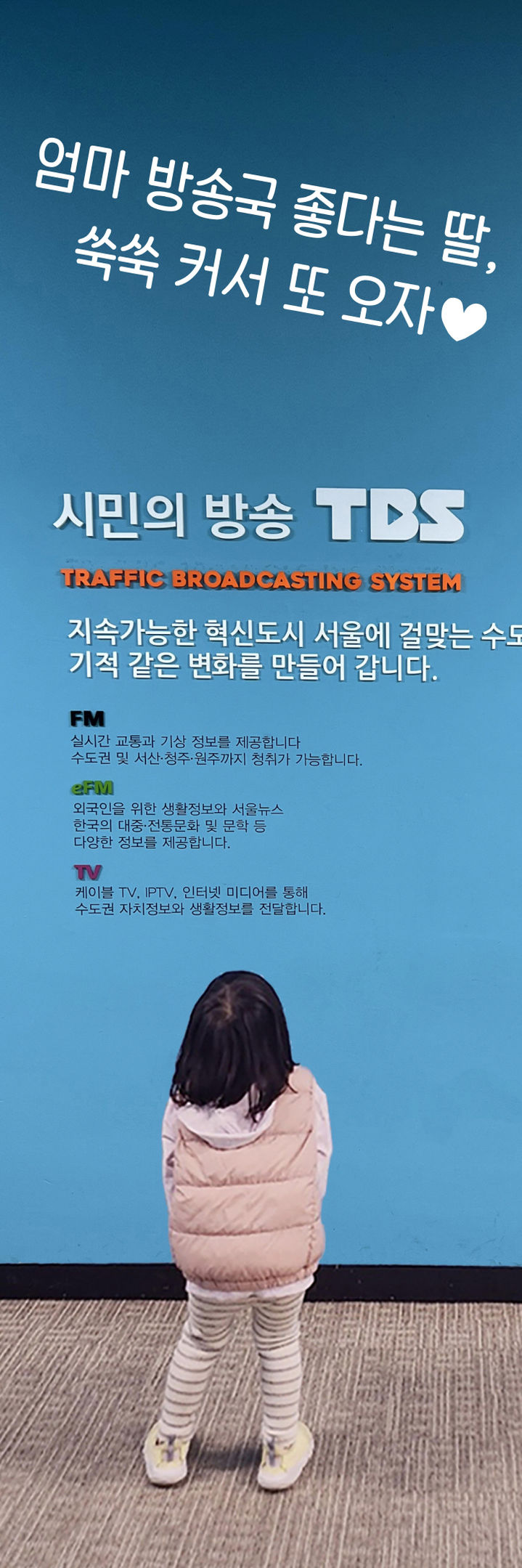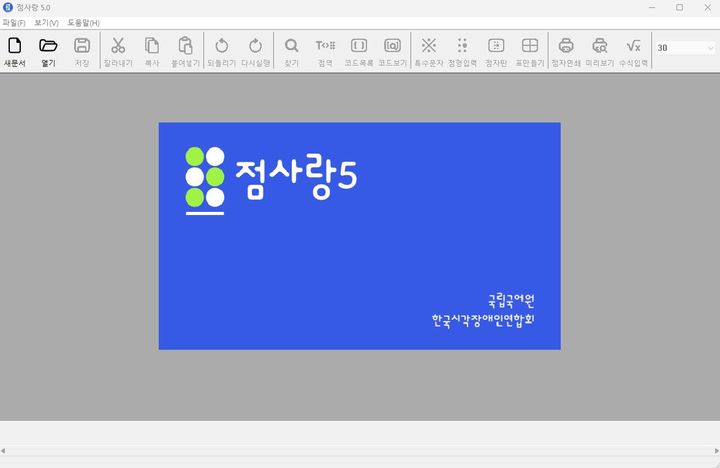[신재우의 작가만세]김멜라 "왜 퀴어 소설을 쓰냐고요?"
단편소설 '저녁놀', 젊은작가상 수상
남성없는 두 레즈비언 이야기
"차별과 혐오, 소설 통해 다른 언어로 만드는 작업"
![[서울=뉴시스] 작가 김멜라 (사진=김멜라 제공) 2022.05.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image.newsis.com/2022/05/06/NISI20220506_0000991281_web.jpg?rnd=20220506160105)
[서울=뉴시스] 작가 김멜라 (사진=김멜라 제공) 2022.05.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작가는 각자가 하나의 세계다. '작가만세'는 작가가 만난 세계로, 또는 작가가 만드는 세계로 해석할 수도 있다. 결국 글을 쓰는 모든 작가들을 '만세'로 추앙한다. 매주 [신재우의 작가만세]를 연재한다.<편집자주>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작가 김멜라는 '여성 퀴어 소설가'로 통한다. 2년 연속 젊은 작가상을 수상했다. 2022년 제13회 젊은작가상을 수상한 소설 '저녁놀'은 충격과 파격속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모모'라는 이름을 가진 버림받은 딜도가 화자가 돼 풀어낸 두 레즈비언의 이야기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기발하다는 평이 많다.
"왜 퀴어 소설을 쓰냐고요?"
김멜라의 말은 단순했다.
"동시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여성 퀴어 소설 "다른 언어를 만드는 것"
김멜라에게 여성 퀴어 소설은 곧 "다른 언어"다. "생명을 죽이고 위협하는 말들이 이 세상을 독점하지 못하게 다른 언어를 만드는 것이죠."
김멜라는 2014년 자음과모음 신인문학상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첫 소설집 '적어도 두 번'으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새롭고 낯선 목소리로 생물학적 신체성으로 젠더 범주를 재단하려는 시각을 전복했다. 소수자에 대한 한국문학의 새로운 감수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소설 '저녁놀'은 남성 인물이 등장조차 하지 않는다. 오직 두 연인과 그들의 사랑에 집중한다.
"의도한 건 아닙니다."
남성 인물은 "두 사람의 일상에 초점이 맞춰진 이야기라 등장시킬 필요가 없는 인물"이다.
만절필동(萬折必東-굽이치고 수만 번 꺾여도 결국 강의 흐름은 반드시 동쪽으로 간다는 뜻)이다. 최근 지인에게 이 글씨를 선물 받았다. 김멜라에게 의미 있는 글이다.
"여성혐오는 인류 문명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문제이기에 한 번에 모두 바뀌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퀴어혐오 역시 제도를 만들고 사회적 평등을 이뤄내는 데 어려움이 많겠죠. 하지만 혐오를 조장하고 차별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되돌아가진 않을 거에요."
![[신재우의 작가만세]김멜라 "왜 퀴어 소설을 쓰냐고요?"](http://image.newsis.com/2022/05/06/NISI20220506_0000991372_web.jpg?rnd=20220506172109)
눈점·먹점·파파야, 이름 짓기에 대하여
소설 속 '눈점'과 '먹점'의 이름은 각각 '지현'과 '민영'이다. 김멜라는 작품 속에 수많은 별명을 다양한 이유로 만들어냈다. 사회적 제한으로 지어진 이름(눈점·먹점), 파에 애정을 담아 지은 이름 '파파야', 두 레즈비언의 은어(모텔=도서관), 버림받은 딜도가 스스로를 '무쓸모의 쓸모'라며 지은 '모모까지'.
'김멜라'라는 이름도 자신이 지은 필명이다.
"실제로 저는 별명 짓는 걸 좋아해요. 사람도 그렇고 물건에도 애칭을 지어주곤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 들어야 하는 단어가 자신의 이름일 텐데, 그 이름을 스스로 짓고 또 여러 뉘앙스로 변주하면 세상에 표현하는 자기의 언어가 다양해지는 거잖아요."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는 인공 남근의 끈질긴 과대망상에 웃음을 멈추기 힘들지만, 정작 그 웃음이 파괴하고 있는 것은 수천 년 된 세계사의 허황된 중심 바로 그것이다.::(김형중 문학평론가)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길은 "웃음의 빛"
소설 '저녁놀'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함께 사는 커플의 먹고 사는 이야기"다. 그러나 두 연인이 마주한 현실은 이보다 복잡하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고 동성혼이 합법화되지 않은 사회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다.
김멜라는 "화난 목소리"로 소설을 끝내지 않았고 웃음을 잃지 않았다.
"다른 방법, 다른 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소설 속 '모모'가 두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화가 나서 분노하는 목소리보다 그 감정이 지나간 후에 돌이켜보는 목소리를 결말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버려졌던 딜도 '모모'도 결국 안마봉이라는 새로운 쓸모를 찾으며 유쾌하게 마무리된다. 두 연인도 일상을 살아간다.
김멜라가 찾은 혐오에 맞서는 해답은 "웃음의 빛"이다.
"누군가를 웃게 해주는 마음과 노력, 그 힘이 혐오보다 크고 세다고 생각해요.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아름다우며, 영원합니다."
![[서울=뉴시스] 작가 김멜라 (사진=김멜라 제공) 2022.05.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image.newsis.com/2022/05/06/NISI20220506_0000991370_web.jpg?rnd=20220506171958)
[서울=뉴시스] 작가 김멜라 (사진=김멜라 제공) 2022.05.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퀴어 소설, 그저 사랑과 인생의 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날 오기를"
'눈점'과 '먹점'이 서로를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사회가 올까?
"이미 와 있습니다"
김멜라는 단호했다.
"지금도 많은 동성 연인들이 자신의 삶과 관계를 소리 내 표현하고 있고, 또 많은 이들이 그 모습에 공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 함께 손뼉을 치며 축하해주는 마음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김멜라는 퀴어 소설이라고 해서 특별한 얘깃거리가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소설의 역사에서 셀 수 없이 반복된 이성애 서사와 같이 퀴어 소설도 그저 사랑과 인생의 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