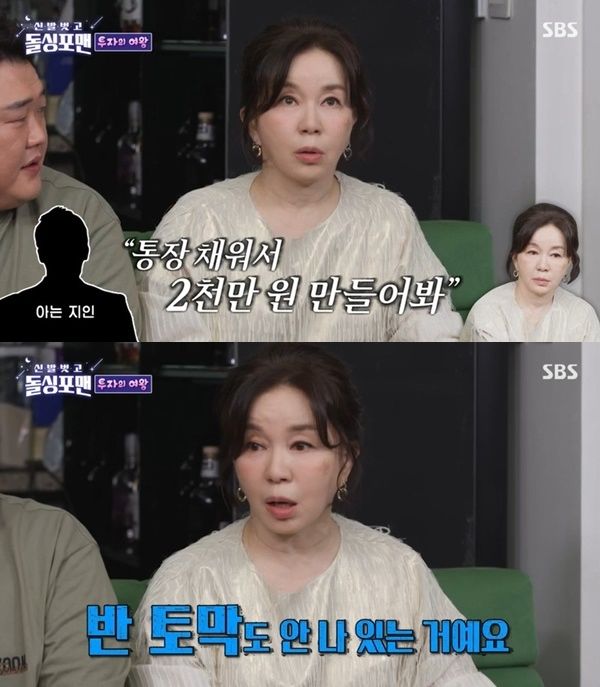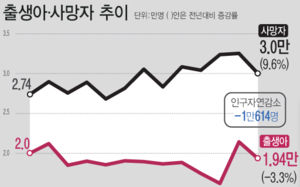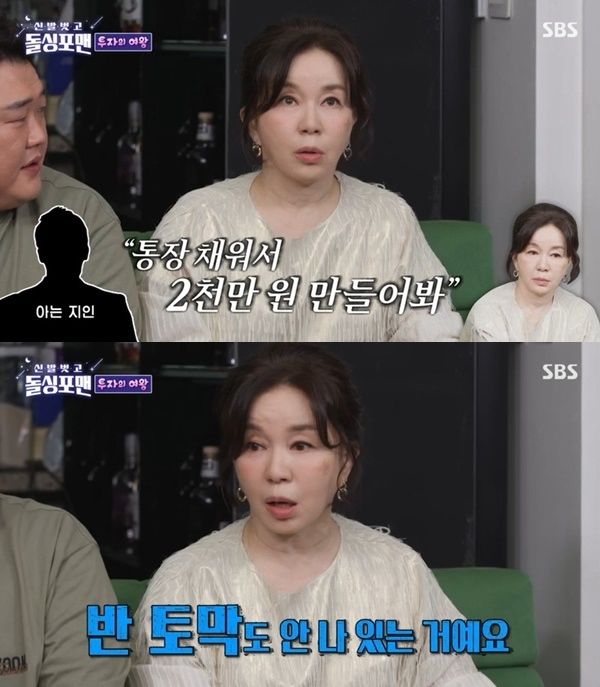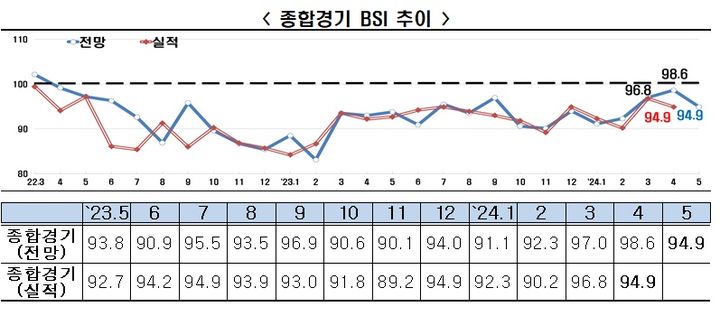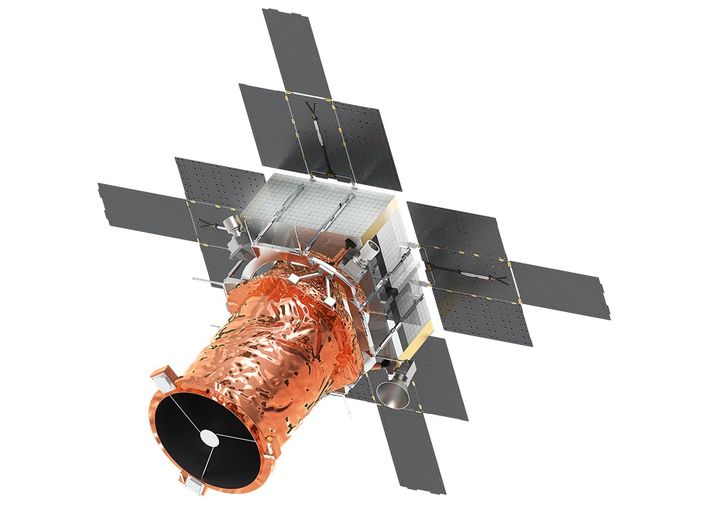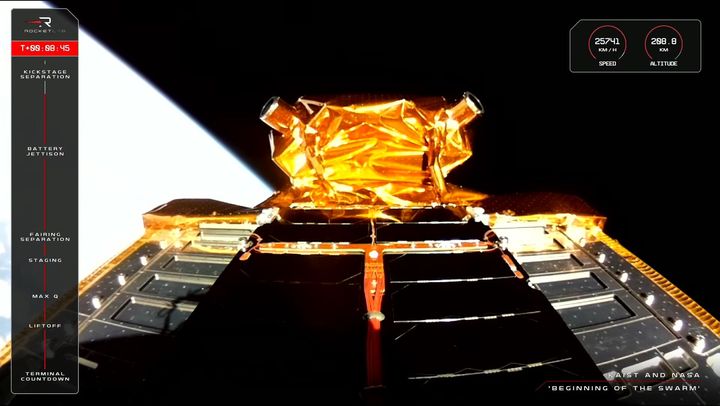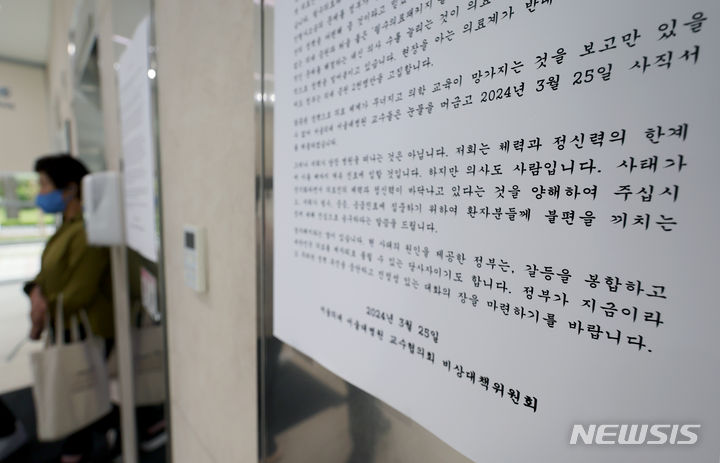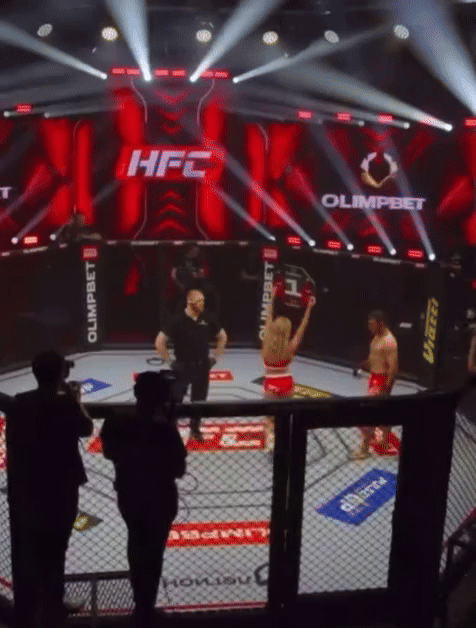"'한국 팝의 고고학', 과거를 현재에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고민한 산물"
2005년 60·70년대 두 권짜리로 출간
한국대중음악사 역작으로 평가
17년 만에 80·90년대 더해 네 권짜리로 출간
![[서울=뉴시스] '한국 팝의 고고학'. 2022.05.28. (사진 = 을유문화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image.newsis.com/2022/05/29/NISI20220529_0001008661_web.jpg?rnd=20220529081920)
[서울=뉴시스] '한국 팝의 고고학'. 2022.05.28. (사진 = 을유문화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물론 지층의 부정합면처럼, 겹쳐진 역사 사이의 물리적 시간 차가 크지는 않다. 하지만 특정 장소가 긴밀하게 연관되면서 수많은 이야기의 층이 쌓였다.
한국처럼 장소의 가변성이 극심할 때, 특히 막전막후(幕前幕後)가 더 많아진다. 한국 대중음악에서 단절을 중요한 키워드로 삼을 수 있는 이유다. 그 단절로 기록을 발굴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고고학이 요구됐다.
17년 만에 완간된 '한국 팝의 고고학'(을유문화사)은 그래서 역작이다. 2005년 출간됐던 이 책은 한국 대중음악 저서의 기념비다. 당시로선 드물게 대중음악을 진지한 연구 주제로 삼았고, 단순히 음악 조명을 넘어 시대적 배경을 톺아보며 인문학 서적 자리를 넘봤다. 이 책을 보고 자란 '한국 팝 키드'들이 음악 평론가와 업계 사람이 됐다. 음악 관련 글 좀 쓴다는 이들 사이에서 경전으로 통했다.
이전에 1960년대·1970년대를 나눠 두 권짜리였던 책이 이번에 네 권으로 나왔다. 60·70년대는 개정·증보했고 80·90년대가 각각 한권씩 추가됐다. 기획자 겸 공동집필자인 신현준 대중음악평론가(성공회대 연구교수)와 최지선 대중음악 평론가가 60년대 편부터 함께 썼고 김학선 대중음악평론가가 90년대 편에 힘을 보탰다.
'욕망의 장소'라는 부제가 붙은 '1980년' 편은 여의도와 조용필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영동, 정동, 광화문, 신촌, 대학로, 강북, 강남, 이태원 등을 조망하는데 특히 눈길을 끄는 건 방배동. 특정한 장소를 배경으로 형성된 음악은 그 장소를 형성한 주류라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고급 레스토랑에 모인 관록의 연예인이 아니라 조그만 카페에서 죽치고 앉아 있던 젊은 음악인 지망생이 그 장소를 대표하게 된 건 역설이지만 사실이라고 짚는다.
압구정동과 신해철로 시작하는 '1990년' 편의 부제는 '상상과 우상'. 온갖 장르가 장소를 가로지는 세기말을 앞두고 댄스, 록, 발라드, 아이돌, 힙합 그리고 홍대 앞 인디 음악가들을 용광로처럼 아우른다.
네 권을 합치면 약 2500쪽에 달하니 과히 한국 대중음악 역사의 지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팝의 고고학'이 한국 대중음악을 집대성해 선후배 뮤지션들의 끈을 이었다는 평가는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이 책이 '이음'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단절'. 그 단절을 매듭지어 리듬감을 부여했다.
조용필이 1980년 지구레코드를 통해 발매한 앨범이 그가 발표한 첫 번째 음반이 아니었지만 왜 '조용필 1집'으로 재탄생했는지 톺아본 것이 예다. 70년대 트로트 고고를 부르던 조용필이 80년대 들어 '창밖의 여자'와 '단발머리'로 각각 '조용필표 발라드'와 '조용필표 댄스음악'이라는 새로운 원형을 만든 것이다.
'한국 팝의 고고학'은 이러한 과정 속에 있는 단절을 당시 대한민국의 시대 배경과 지형학을 나침반 삼아 끄집어낸다.
신현준 평론가는 최근 통화에서 "연결을 얘기하면서도 포인트를 줘 리듬을 만들고 싶었다. 60·70·80·90년대 한국 현대사도 그렇지 않았을까. 대중음악을 통해서도 한국인의 삶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요철 같을 수 있는 매듭 부분을 '고르디아스의 매듭'처럼 탁 끊어 복잡성을 해결한 건 아니다. 실뭉치를 하나씩 하나씩 정성들여 풀어 나가면서, 오목함과 볼록함을 드러내고 그것이 등고선이 돼 한국 팝의 지형도가 나왔다.
평평한 2D 지도처럼 박제된 게 아니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3D 지도가 됐다. 그런데 그 양과 질이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는 것보다 많고 높다. 한국 대중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이 묵직한 책을 스마트폰보다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는 이유다.
신 평론가는 "단순히 과거에 이랬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를 어떤 방법과 어떤 시각으로 현재에 가져올 것인가가 중요했다"고 말했다.
'한국 팝의 고고학'은 첫 발간 당시 '대중의 눈에 띄지 않은 수면 아래 90%를 들춰냈다'는 평을 들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임희윤 동아일보 음악 담당 기자의 말을 빌리면 "기자가 보면 다 단독감"이 수두룩하다.
그럼에도 신 평론가는 "저희로서는 부족함이 보인다"고 몸을 낮췄다. "900% 드러내지 않은 부분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밝히기보다, 어떤 부분이 안 드러났는지 독자, 평자, 다른 연구가들이 함께 찾아냈으면 한다"고 바랐다.
책에는 귀한 인터뷰도 다수 포함됐다. 현진영, 유영진 등의 음반에 작·편곡 또는 프로듀서를 맡아 SM엔터테인먼트 초기 핵심 멤버로 통했던 홍종화, 이태원의 나이트클럽 DJ로 활동하다 SM 인하우스 엔지니어로 활약한 허정회 등이 예다.
물론 역작임에도 일부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여성 음악인 인터뷰가 적다'는 것. 이에 대해 신 평론가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정곡을 찔렸지만 귀하다며 "변명이 있다면 그 불균형이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인데, 의도하지 않았다고 모든 게 관용되지는 않는다"고 썼다.
그러면서 "문제는 '시간'과 '돈'인데 여성의 성평등을 위해 애쓰는 재단이나 단체에서 이런 작업에 지원해 주면 정말 좋겠다. '한국 팝의 고고학' 60/70의 젠더 불균형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나미, 주현미, 한영애, 장필순, 김윤아 등의 인터뷰가 들어간 80년대 90년대는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신 평론가는 2000년대 이후는 자신이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더 잘 쓸 수 있는 몇몇 후배 평론가의 이름을 거명하며 글쓰기를 청했다. 그는 "H.O.T부터 방탄소년단(BTS)까지 중간중간 혁신의 계기가 있었다"면서 "그 지각변동의 리듬을 짚은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책은 '한국 팝'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한국가요'나 '대중가요'라는 용어를 피했다. 신 평론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정리했다.
"'한국가요'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가요'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식민지 시대 억압받는 민족의 한을 표현한 노래'라는 서사가 나온다. 이를 연장하면 '독재 시대 억압받은 대중의 한을 표현한 노래'라는 서사로 비화할 때조차 있다. 실제로 일제시대든 독재시대든 민족의 한을 표현한 노래는 소수일 뿐더러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더라도 명시적이지는 않다. 즐겁게 웃고 즐기던 노래도 많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