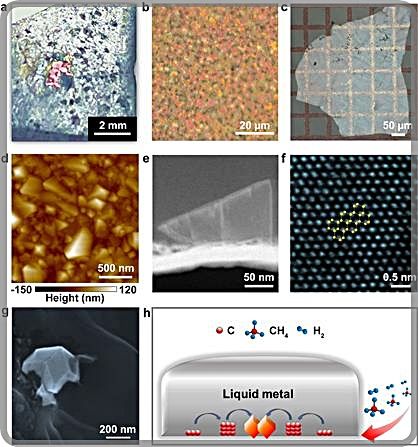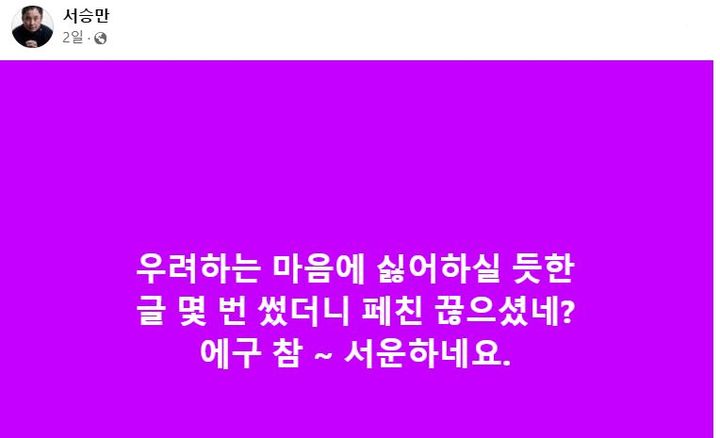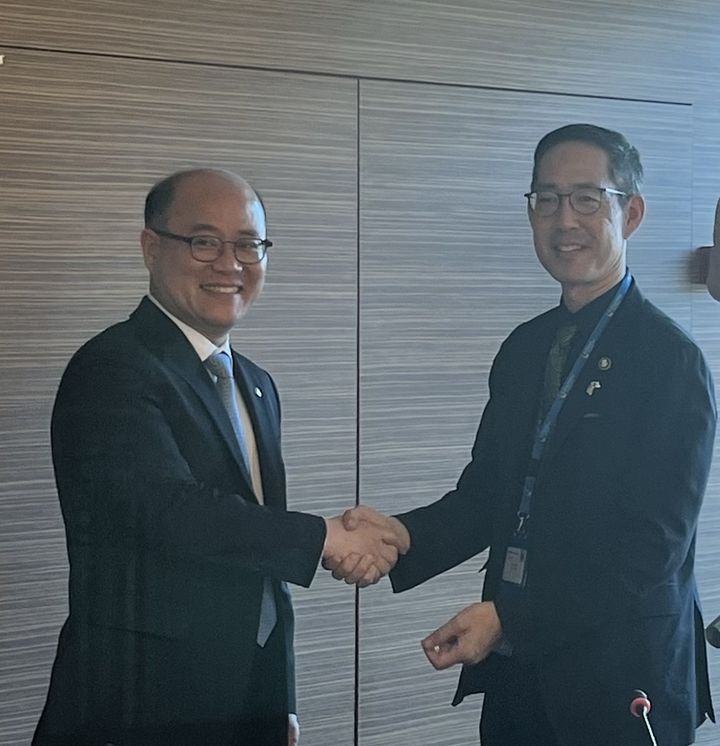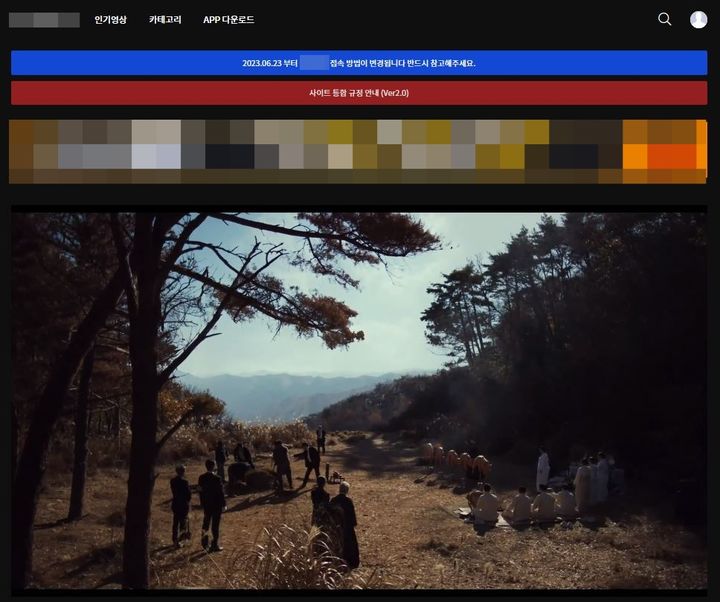[뭉칫돈 어디로②]채권 사는 개미들
올해 채권 순매수 13.4조…전년대비 193.43%↑
단기물 카드채 투자 급증…무려 10배 늘어
전문가 "위축된 기관 수급을 개인이 메워"
![[뭉칫돈 어디로②]채권 사는 개미들](http://image.newsis.com/2020/04/10/NISI20200410_0000510431_web.jpg?rnd=20200410135316)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미국의 강한 긴축기조가 지속되면서 주식시장의 부진이 이어지자 개인들이 주식을 팔고 채권 투자에 나서고 있다. 특히 단기 투자 성향이 그대로 채권시장에서 나타나면서 카드채 단기물에 자금이 급격하게 유입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축된 기관의 수급을 개인들이 메우면서 좋은 투자기회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지난 22일 기준) 개인들은 장외채권시장에서 13조4027억원 순매수했다. 이는 지난해 한해(4조5675억원) 대비 193.43% 급증한 수준이다. 특히 금융투자협회가 해당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큰 순매수 규모다.
반면 주식시장의 대기금이라 불리우는 투자자예탁금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 연초 71조7328억원에 달했던 투자자예탁금이 지난 21일 기준 50조7793억원으로 감소했다. 무려 20조원이 9개월만에 빠져나간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강한 긴축 지속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1일 미 연준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75bp 인상했다.
향후 금리를 예상하는 점도표에서 연준 위원 19명 중 9명이 연말 금리를 4.25~4.5%로 내다봤다. 여기에 연준 위원 3분의 2가 내년 금리의 중간값으로 4.75%를 제시했다. 이를 감안하면 최종금리가 5%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로 인해 국채를 비롯한 채권의 금리가 치솟으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채권의 금리는 채권가격과 반대로 움직여 금리가 오르면 저가에 채권을 사고 금리 하락시 매도를 통해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
머니무브의 현상은 투자 성향에서 나타난다. 올해 개인들은 회사채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들인 것은 은행을 제외한 기타금융채다. 개인들은 올해 기타금융채를 4조2217억원 순매수했는데, 지난해 순매수 규모는 4839억원에 불과했다. 무려 약 10배가 늘어난 것이다.
이는 1년 만기 안팎의 카드채를 찾는 투자자들이 급증한 영향이다. 카드채 1년물 수익률이 연 4%를 웃돌자 단기 투자성향의 강한 주린이들이 옮겨가고 있는 셈이다.
개인들이 주로 산 채권은 회사채로 나타났다. 올해 회사채만 5조7779억원을 사들였다. 지난해의 경우, 개인들은 전체 4조5675억원 가운데 절반인 2조3189억원을 회사채에 투자했다.
채권을 활용한 세테크도 늘어나고 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올해초부터 지난달 말까지의 면이율 3% 미만인 저쿠폰채 판매 규모는 약 2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배 급증했다. 저쿠폰채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세금 부담이 높은 자산가들 사이에서 세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수단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 채권을 투자해 얻는 수익은 크게 주기적으로 이자수익과 매매차익으로 나눠 지는데, 15.4%의 이자소득세는 이자에 부과되고 매매차익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가격이 하락한 저쿠폰채 매매를 통해 수익 전부가 과세가 되는 시중 금리 대비 연 투자 수익률을 무려 2~3%포인트 가깝게 높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상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 6~7월 여전채 중심으로 약세가 부각된 시기, 기관투자자들의 빈자리를 개인이 좋은 기회로 포착하며 대규모 매수를 진행했다"면서 "위축된 기관투자자들의 매수세를 개인들이 크게 빠르게 메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래도 개인은 주로 2년이하 채권을 주로 투자한다"면서 "최근 단기물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 되고 있는 점이 개인에게는 오히려 좋은 투자기회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