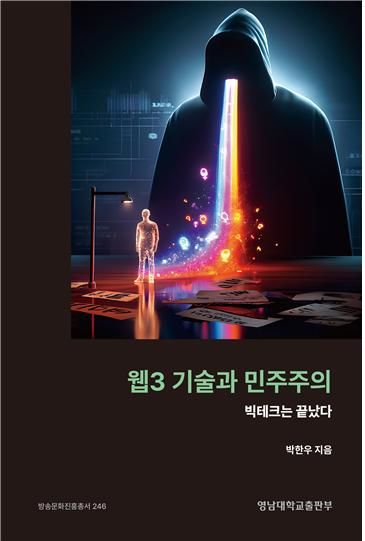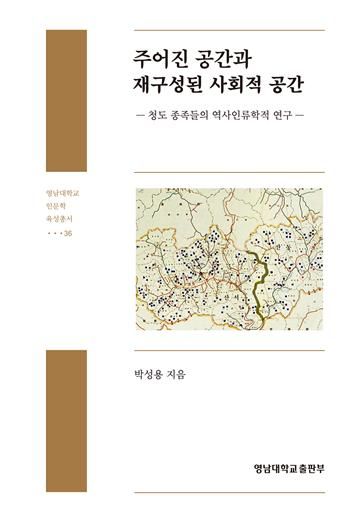안희정 측 "합의한 관계"…'김지은 성폭행' 거듭 부인
김지은 측 "성폭행으로 PTSD 피해"
법원 "구체적 사항 밝혀달라" 요청
![[서울=뉴시스]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지난 2019년 2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2/01/NISI20190201_0014866287_web.jpg?rnd=20190201163527)
[서울=뉴시스]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지난 2019년 2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오덕식)는 이날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안 전 지사 측 대리인은 재판에 앞서 불법 행위를 부인하고 김씨의 정신적 피해와 안 전 지사의 행위 사이 인과 관계가 없으며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충청남도 측 대리인은 '안 전 지사 개인의 불법행위이고 안 전 지사의 행위와 직무 사이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반면 김씨 측 대리인은 "안 전 지사의 성폭력과 2차 가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적 영구장해를 입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2차 가해의 구제적인 내용을 적시해달라고 했다. 2차 가해라는 불법행위의 시기, 장소, 적용 법령 등을 밝히고 그 증거를 제출해달라는 취지다.
이와 함께 안 전 지사의 성폭력과 직무 집행 사이 관계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충남도 측이 안 전 지사 개인의 범죄라는 취지로 주장해 재판부가 직무와의 관련성을 석명하라고 한 것이다.
아울러 김씨의 정신적 장해가 고정됐는지 감정할 것인지 결정해달라고 했다. 통상 손해배상액은 치료가 종결된 후 장해가 영구적으로 고정된 경우에 산정하게 된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충남도 측이 김씨의 과거 정신 치료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제출 신청은 "장기간은 개인의 사생활"이라며 그 기간을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소급해 인정하기로 했다.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은 다음달 23일 오전 11시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안 전 지사 측 대리인은 재판을 마친뒤 취재진과 만나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합의하에 갖은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 역시 배상책임이 있다고 충청남도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이보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당시 수행비서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지사는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안 전 지사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들며 '피해자다움'을 비판하고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