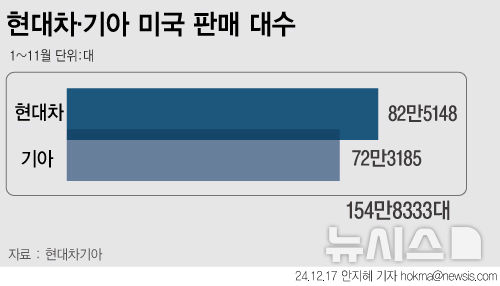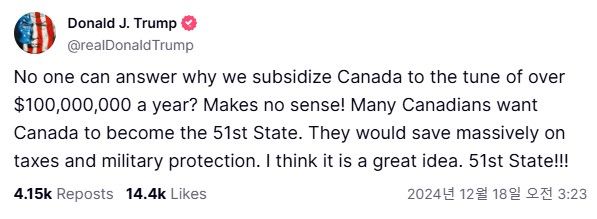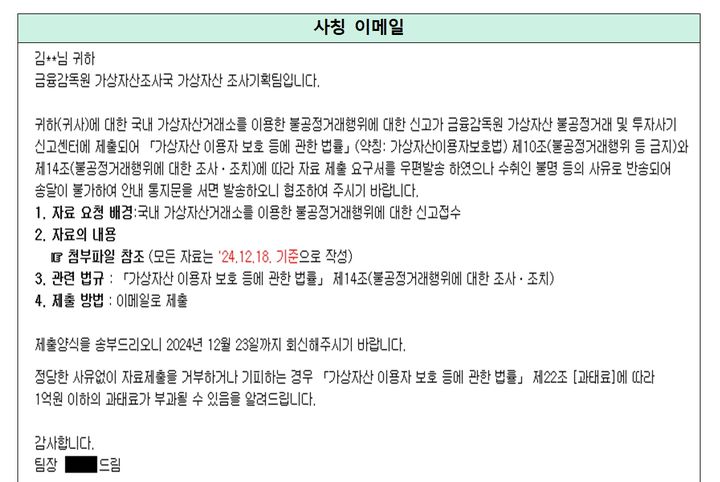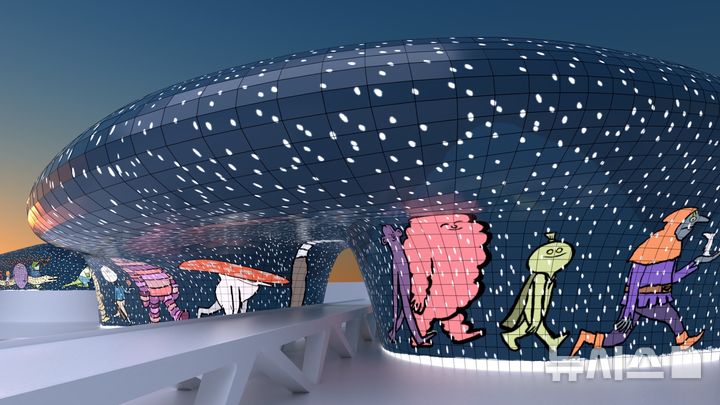[기자수첩]'방역패스 효력' 법원이 판단하는 당연한 이유
![[기자수첩]'방역패스 효력' 법원이 판단하는 당연한 이유](https://img1.newsis.com/2020/05/27/NISI20200527_0000534490_web.jpg?rnd=20200527130016)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하던 방역패스의 효력을 본안소송의 1심 선고가 내려진 후 30일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은 지난 4일 나왔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첫 결정이었다. 이 재판부는 학원 등에 적용된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봤다.
방역패스 전반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2건은 현재 법원 심리 중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방역패스를 중지해달라는 '원포인트' 신청도 있다.
이를 두고 방역당국 주변에서는 "방역의 사법화"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방역 전문가도 아닌 법관들이 방역 정책의 최후 심판관 노릇을 한다는 것이다. 법관들에게 과학을 가르쳐야 한다는 한 의대 교수의 SNS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 법조인은 "법원 결론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을 내리는 행위 자체를 비판하면 법관들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사법부가 방역 정책을 심판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행정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들은 법원 심리를 받아볼 기회조차 잃게 된다. '전문성'은 방역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문 분야를 왜 사법부가 결정하는가.'
이런 시각이라면 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분립 원칙은 바로 훼손된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헌법 37조2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패스 모두 이 같은 헌법정신에 근거해 법률로써(감염병예방법)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제한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가 충돌·경합하게 되고, 비례의 원칙(또는 과잉금지원칙) 같은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바로 이 문제의 해결이 사법부의 심리 대상이 된다. 해당 행정처분이 법률에 근거했는지, 부당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는 결국 법률 전문가인 법관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연휴 집회금지 경우다. 방역당국은 집회 인원을 제한하거나 1인 시위 외에는 모든 집회를 차단하기도 했다. 진보·보수를 넘어 시민·사회 단체는 헌법상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은 이때 주로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되 그 규모를 제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제한을 넘어선 집회가 간혹 발생하긴 했지만, 감염병 확산 억제라는 공공복리와 집회 자유 보존이라는 기본권이 조화를 이뤘다.
기본권의 제한·충돌·경합은 일상적으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국가가 강제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이에 반발하는 시민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 이는 법치국가의 당연한 사법절차다.
전문 분야라는 이유로 사법부의 판단은 필요없다는 발상은 언제든 국가의 독단적 행정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위험하다.
방역정책도 예외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 후에는 그 판단은 적절했는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모습이다. 사법부 심리 자체를 '패싱'해야 한다는 태도는 국민 기본권에 대한 인식 부족일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