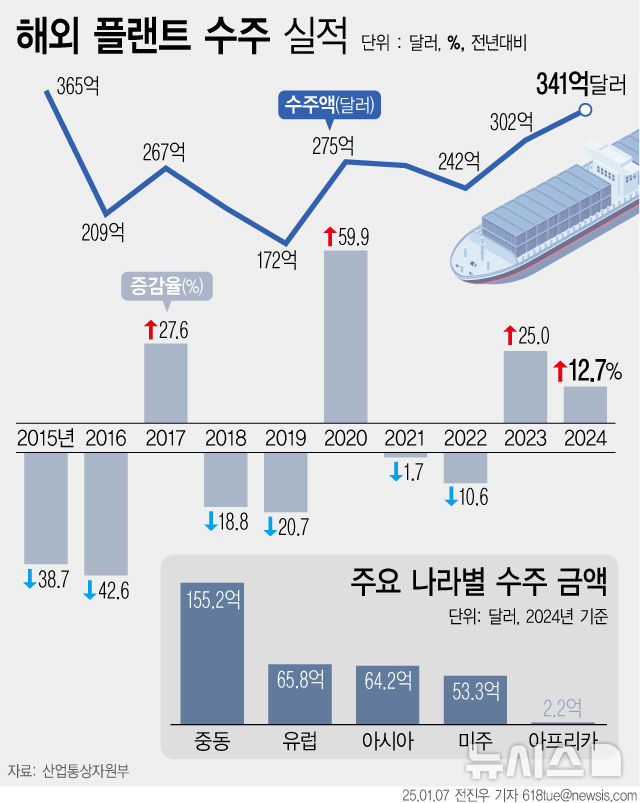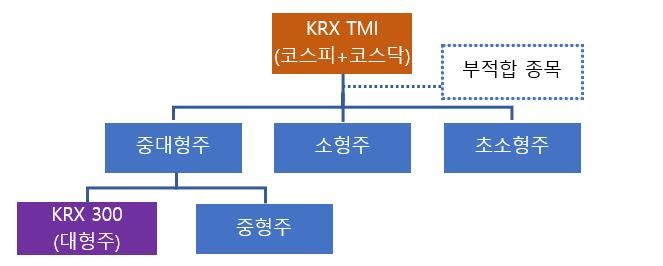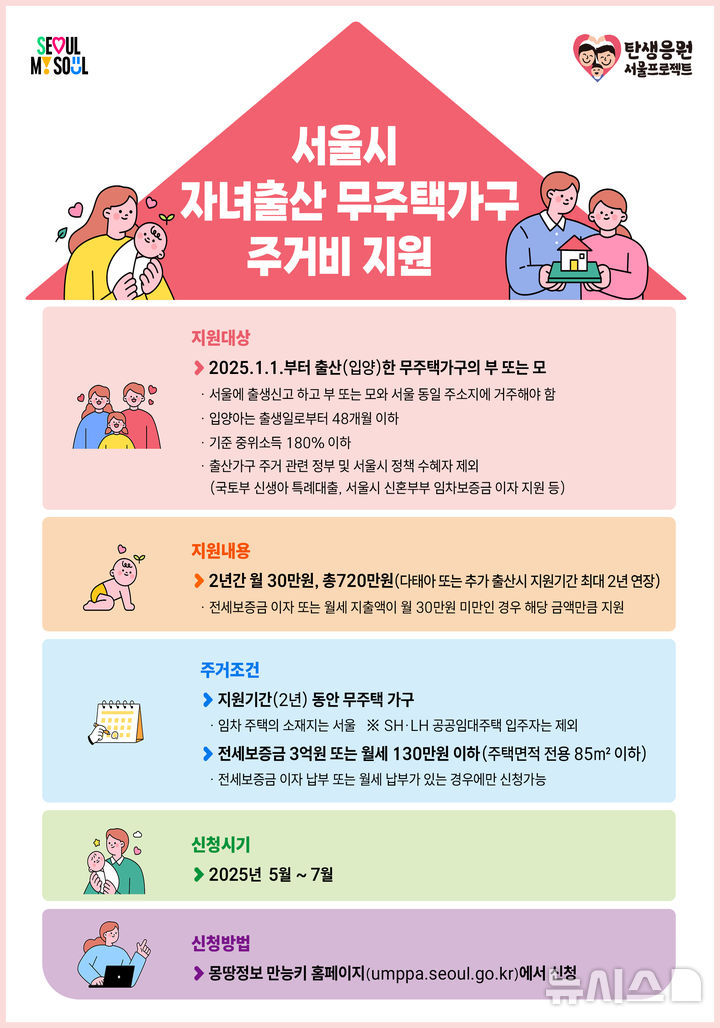'레깅스 엉덩이 촬영' 무죄→유죄…대법 "性욕망 대상"
2심 "레깅스, 일상복으로 활용" 무죄 선고
대법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 유죄 판단
'성적 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 최초로 판시

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8년 레깅스 바지를 입고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약 8초간 몰래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법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는 비슷한 연령대 여성들에게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이용되고 있고, 피해자 역시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 중이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고 해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다시 뒤집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당시 피해자는 엉덩이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운동복 상의를 입고 있었고, 검정색 레깅스에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다.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부위는 목 윗 부분과 손, 발목 부분이 전부였지만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의 굴곡과 신체적 특징이 드러나는 모습이었다.
A씨가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한 부분도 있으나 대체로 엉덩이 부위를 포함한 하반신이 주로 찍혔고, 하체 뒷부분의 굴곡이 선명하게 영상에 담겼다.
당시 피해자 B씨가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내려서 바로 지우겠다. 한 번만 봐 달라"며 용서를 구했으며, B씨는 수사기관에서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의복이 몸에 밀착해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난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며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거나 피해자가 이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사정은 이 모습이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타당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진술은 성적 모멸감, 또 인격적 존재로서의 분노와 수치심의 표현으로 성적 수치심이 유발됐다는 의미로 충분히 이해된다"며 "촬영의 대상, 결과물, 방식 등 피해자가 촬영을 당한 맥락과 피해자의 반응에 비춰보면 A씨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유'에 대해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고 최초로 판시했다. 이는 강간·추행 등 범죄에서 나아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서도 보호법익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어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며 다양한 피해감정이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심 판단의 기준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해서도 "이는 특정한 신체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촬영의 맥락과 결과물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해 드러냈다고 해도 이를 촬영 당했을 때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