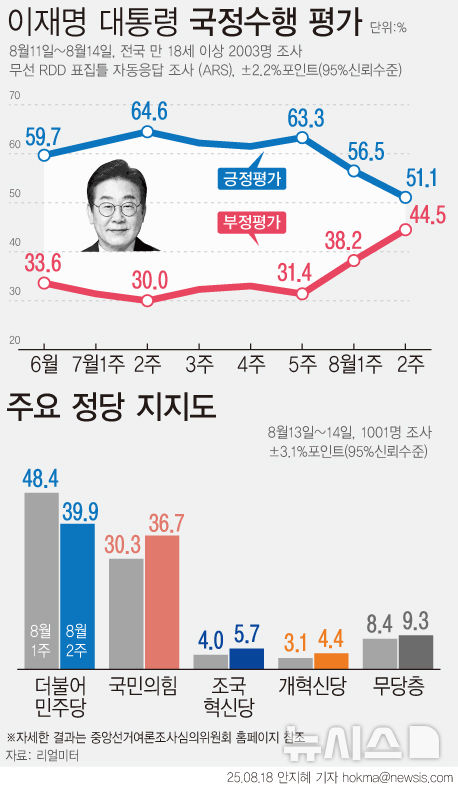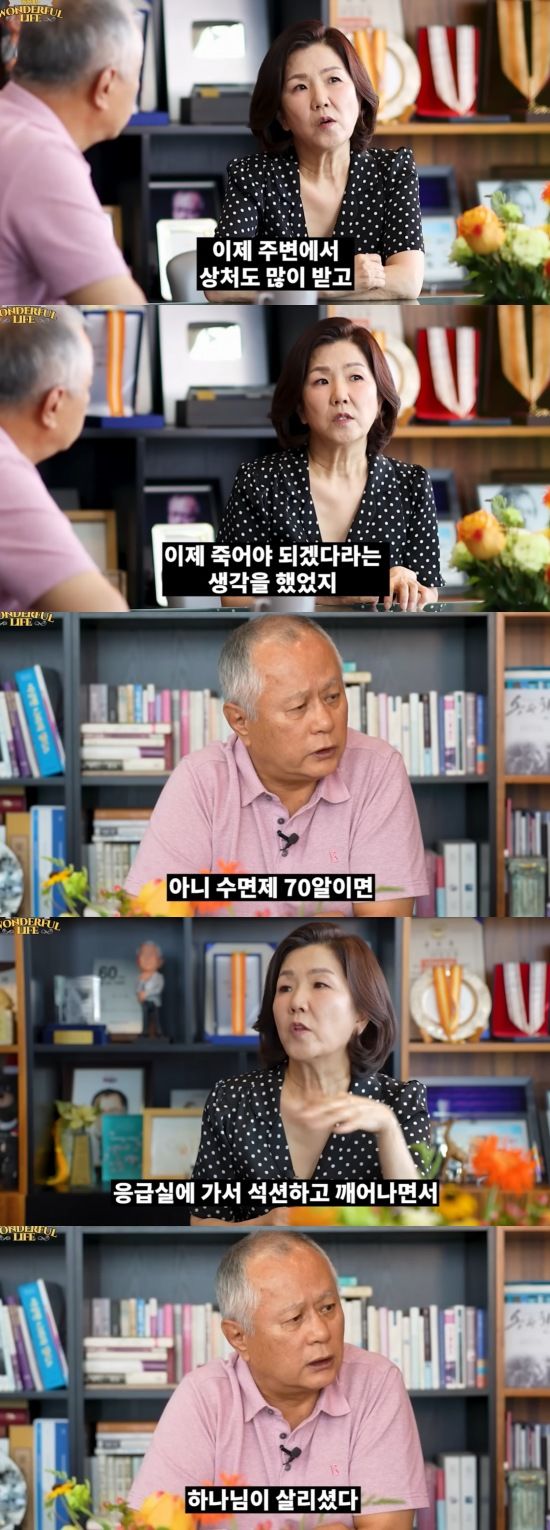[신재우의 작가만세]이훤 "난 '양눈잡이'...사진과 시 모두 잘하고 싶어"
세 번째 시집 '양눈잡이' 출간
미국서 15년 살다 귀국...사진가로도 활동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이훤 시인이 지난 5일 서울 성북구 앙코르 스튜디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2022.08.13. pak7130@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8/05/NISI20220805_0019105155_web.jpg?rnd=20220813080000)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이훤 시인이 지난 5일 서울 성북구 앙코르 스튜디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2022.08.13.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이훤(35)의 세계는 항상 두 개로 나뉘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시인과 사진가의 세계.
2014년에 '문학과의식' 신인상을 수상하며 시인으로 데뷔했다. 이어 2015년 사진가로 첫 개인전을 열었다. "시를 쓰고 사진을 찍는 사람이 됐다." 19살에 미국으로 건너가 15년간 타국 생활을 했다. 서른살이 넘어 한국에 와 정착했다.
최근 세번째 시집 '양눈잡이'를 출간한 그를 만났다.
"시력검사를 하다가 왼눈잡이, 오른눈잡이라는 개념을 알았어요. 그때 제가 '양눈잡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미국과 한국을 오가고 직업도 여러 개고."
이번에 출간한 시집의 제목이기도 한 '양눈잡이'는 이훤이 표현하는 자기 자신이다. 스스로 생각해낸 단어다.
'양눈잡이' 이훤의 경제적 수입은 사진 작업에 주로 의존한다. 2019년 큐레이터 메리 스탠리가 선정한 주목해야 할 젊은 사진가에 선정됐다. 두달 전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했다. 사진을 업으로 삼고 스튜디오 겸 교습소 '작업실 두 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훤은 꾸준히 시를 썼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모국으로 돌아오는 이방인의 마음이 돼 시를 적었다. “타국에 머무는 동안에는 항상 타국에 소속된 사람의 정서와 한국을 그리워하는 상태를 오가는 '이방인의 정서'였다"고 했다.
이방인의 정서가 담긴 그의 시에는 비행기가 공간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는 "비행기에 올라타면 사실은 영토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고 표현했다.
"우리는 비행기 속/여러방을 드나든다//이곳은 정원이고 여긴 숙소야 여긴 첫 번째 산책로고 저기에 두번째 산책로가 있어"(수록작 '양눈잡이 1' 중에서)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이훤 시인이 지난 5일 서울 성북구 앙코르 스튜디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2022.08.13. pak7130@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8/05/NISI20220805_0019105150_web.jpg?rnd=20220813080000)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이훤 시인이 지난 5일 서울 성북구 앙코르 스튜디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2022.08.13. pak7130@newsis.com
19살, 미국으로 떠난 이훤 "한국, 정서적으로 발 디딜 곳 없었다"
"사진을 찍기 시작한 건 미국을 건너가면서부터였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사진으로 표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죠."
미국으로 가 처음으로 찾은 건 사진이었다. 말이 통하지 않은 답답함을 카메라에 담아 해소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대학에서 공부한 것은 공학이었다. 조지아텍 대학교에서 공학 석사과정까지 공부를 이어갔다.
"공학적 재료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최소한의 인풋(input)을 가지고 최대치의 아웃풋(output)을 내는 일이 흥미로웠어요."
석사과정 중 불현듯 휴학을 하고 이훤은 시를 쓰기 시작했다. 대학에서 공학과 문학이 맞닿아있는 지점을 그는 발견했다. 간단한 것에서 시작해 놀라운 결과를 만드는 일이다. 스물다섯에 습작을 쓰기 시작한 그는 3년 뒤인 2014년 시인으로 등단하게 된다.
사진을 먼저 찍기 시작했지만 시인으로 먼저 두각을 드러낸 그는 그때부터 두 가지 새로운 언어를 갖게 됐다. 시는 타국에서 완성된 문장과 번역에 싫증난 이훤에게 적합한 장르였다. 문장이 완결되지 않아도 되는 미완의 장르이자 "꼭 말이 되지 않아도 되는 압박이 없는" 장르다.
"오늘 쓴 문장을 한가득 들이마셨다가 내뱉는다/도로가 태어나고/불 꺼진 담배에서 밤바다 냄새가 난다"(수록작 '노 피싱 존' 중에서)
그럼에도 시인은 타국에서 모국어에 대한 갈증을 느꼈다.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한국말이 서툴다는 느낌을 받았고 시를 쓰면서도 불안함이 있었다.
"모국어로 소리 내서 말할 때마다 점점 내 안에서 모국어가 퇴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모국어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미국에서 한국의 시인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를 꾸준히 들었다.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이훤 시인이 지난 5일 서울 성북구 앙코르 스튜디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2022.08.13. pak7130@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8/05/NISI20220805_0019105162_web.jpg?rnd=20220813080000)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이훤 시인이 지난 5일 서울 성북구 앙코르 스튜디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2022.08.13. pak7130@newsis.com
15년 만에 모국...비로소 동료를 만났다
"미국에서 사진학으로 석사까지 딴 이유도 사진을 하는 공동체를 찾고 싶은 마음에서였어요. 한국에 와서 드디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네요."
세 권의 시집을 내면서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보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이메일을 통해서 표지 디자인을 정하고 감리를 봤던 그에겐 이러한 경험은 소중했다.
온라인을 통해서만 만나던 문학 동료도 실제로 많이 만나게 됐다. 특히 최근에는 이슬아 작가와 '일간 이슬아' 작업을 함께 하며 미국에서는 어려웠던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에 있을 때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없는 거리감이 있었어요."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이훤 시인이 지난 5일 서울 성북구 앙코르 스튜디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2022.08.13. pak7130@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8/05/NISI20220805_0019105159_web.jpg?rnd=20220813080000)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이훤 시인이 지난 5일 서울 성북구 앙코르 스튜디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2022.08.13. pak7130@newsis.com
"시의 형식으로 사진을 찍거나, 사진으로 문장을 대체하는 작업을 한다"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쓰는 시인의 특성이 담긴 영어로 된 시도 있다. "영어로만 시를 써온 사람처럼 쓴 영시가 아닌 한국의 시인이 쓰는 영시"를 목표로 했다.
사진과 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 편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힘든 점도 존재한다. "두 영역 모두에서 잘 해내야겠다는 압박감" 때문이다.
"사진과 시, 모두 잘하고 싶어요. 스스로랑 타협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죠."
앞으로도 두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우연한 기회로 시각장애인 작가 김성은을 만나고 시각장애인에게 닿는 사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다. '일간 이슬아'를 통해 이달 말에는 시도 선보인다.
모국으로 돌아왔지만, 이훤은 여전히 '양눈잡이'다.
"이전에는 보고 싶지만 갈 수 없어서 한 눈으로 먼 곳을 계속 주시하면서 살았지만, 앞으로는 가까이서 양 눈으로 보고 싶은 것을 다 보며 집중할 거예요."
◎공감언론 뉴시스 shin2roo@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