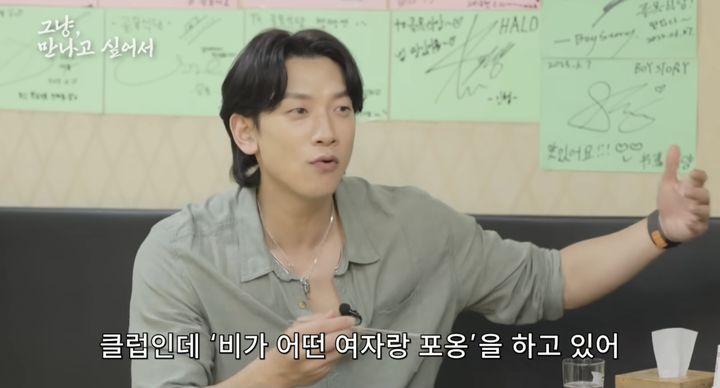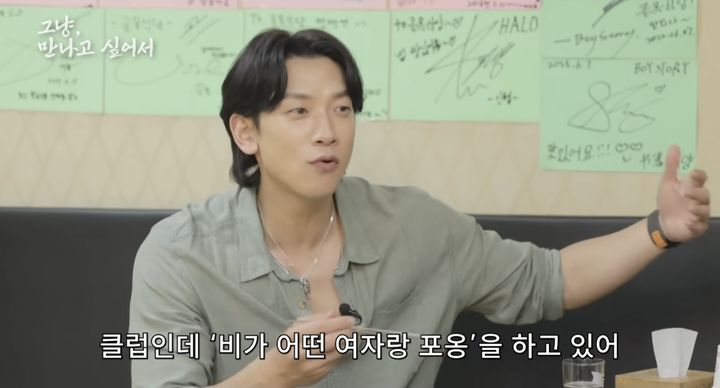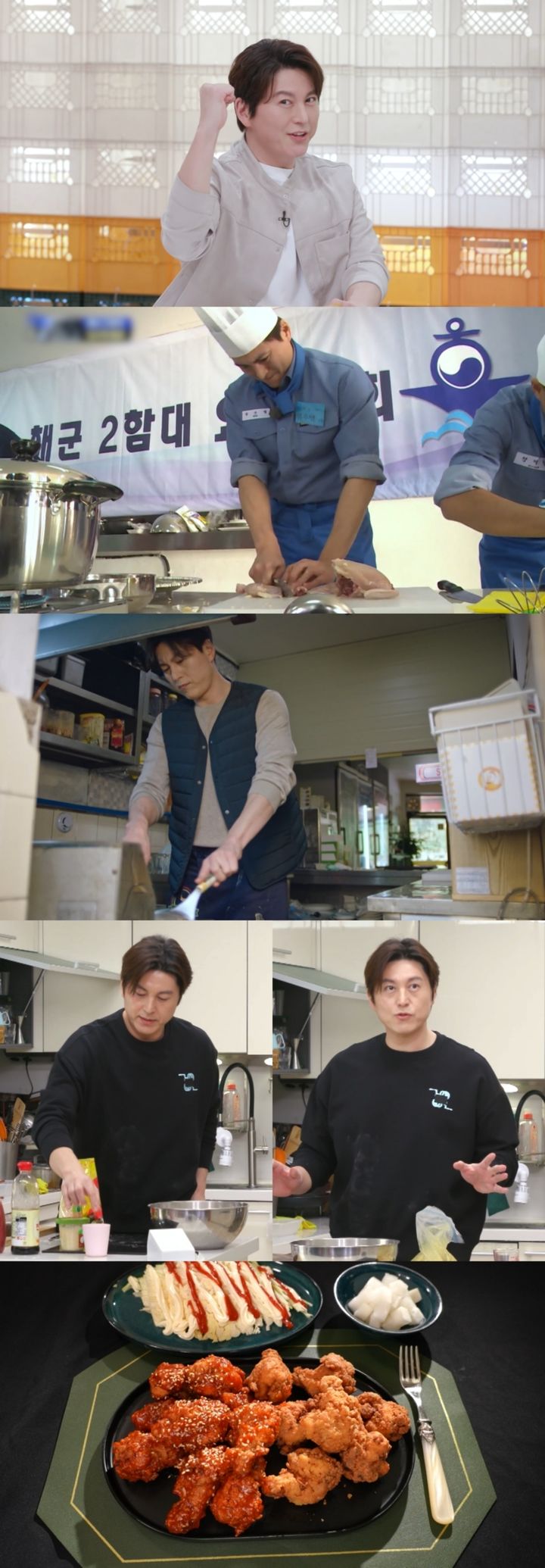[기자수첩]금융당국 검사 정보 유출까지…업계 유착 막으려면

【서울=뉴시스】
얼마 전 금융당국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서 그 말이 떠올랐다. 금융감독원의 현직 간부인 A국장이 민간 금융회사로 이직한 전직 금감원 직원에게 검사·감독 일정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아직 구체적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금감원이 내부 감찰에서 관련 의혹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의뢰까지 한 것을 보면 유착을 의심해볼 만한 정황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금융검찰이라고도 불리는 금감원과 금융사와의 관계는 여러모로 언론과 출입처 간 관계와 닮아 있지만 둘 사이의 유착이 문제됐던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돈 자체를 다루는 금융업은 수많은 인허가와 규제를 받는다. 규제산업이라는 특성상 다른 어떤 산업에 비해 감독당국과 업계 간에 활발한 소통과 접촉이 이뤄지기도 한다.
민간 금융사가 금융당국 출신 인사를 고액 연봉으로 스카웃해 가는 관행도 그런 이유에서다. 금융분야 전문성을 높이 사서 모셔왔다는 표면적 이유 뒤에는 당국 현직 인사들과의 인맥에 귀한 값이 매겨졌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은행이 조 단위의 돈을 풀어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환급해주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상생금융처럼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를 유지해야 함은 분명하다.
하지만 둘 사이가 지나치게 가까워 유착으로 변질될 때 어떤 폐해를 불러오는지, 우리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때 목도한 바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자리한 전관예우 관행을 감안할 때 감독·검사의 방파제 역할을 할 '금융전관' 모셔가기는 근절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돈만 좇는 기업과 달리 감독기관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진 금융당국이 스스로 엄격한 거리두기에 나서야 할 때다.
개인 뿐만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도덕성과 공직윤리 제고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임직원 교육이나 조직문화 개선 등에 보다 힘써야 함은 당연하다. 이에 더해 금융전관을 비롯한 외부인 접촉 보고 대상을 넓히고 징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노력도 뒷받침돼야 하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