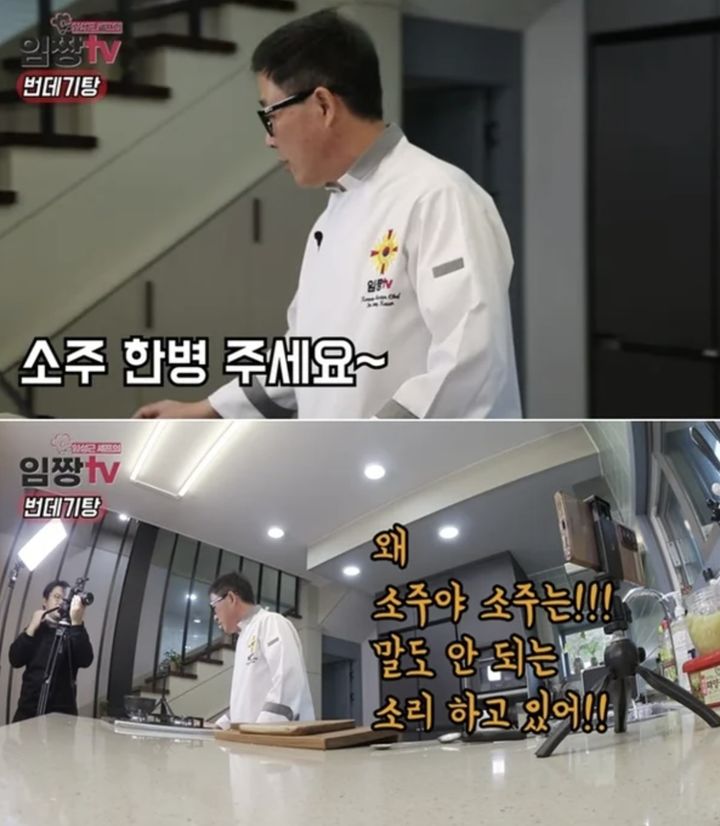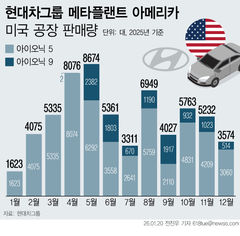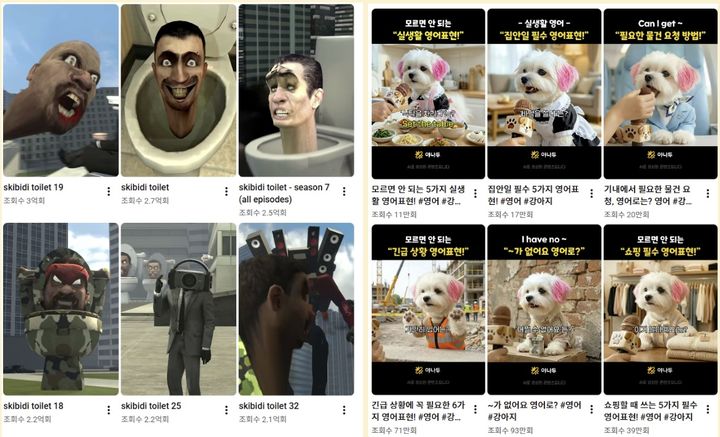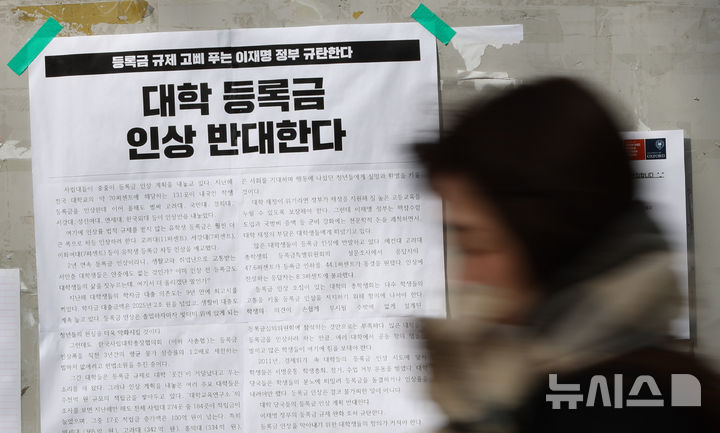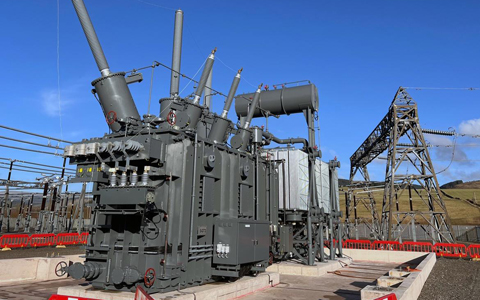[기자수첩]'국가장 자격' 논란 유감…놔두면 되풀이 된다
![[기자수첩]'국가장 자격' 논란 유감…놔두면 되풀이 된다](https://img1.newsis.com/2021/12/01/NISI20211201_0000882390_web.jpg?rnd=20211201140356)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당시 12시간 만에 장례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과 대조된다.
그럴 만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군사 반란을 주도한 혐의로 복역돼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발탁됐기에 국가장으로 치르는 게 온당한지를 따져봐야 했다. 해석의 여지가 갈리는 애매한 법 조항 탓에 고인의 공과(功過)에 대한 여론 반응을 봐가며 국가장을 결정한 것인데 결국 사회 혼란과 분열만 초래했다.
이후 한 달도 채 안 돼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사망하자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 논의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정부는 선 긋고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연일 정쟁으로 삼는 지경이었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애초에 이 논란은 정부가 자초한 면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오랜 병상생활을 해왔다. 딸 노소영씨는 "한마디 말도 못 하고 몸도 움직이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어떻게 십여 년을 지낼 수 있을까. 나는 단 한 달도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의 부음(訃音)을 써놓은 게 10년이 훨씬 넘었다는 언론사도 여럿 있을 정도다.
그 기간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의 국가장 제한 논의를 하지 않고 허송세월 했다. 현행 국가장법에는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와 절차에 대한 규정만 있고, 국가장 혜택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어수선한 문제를 최대한 미룬 것인데, 국장(최대 9일·장례비 전액 국가 부담)과 국민장(최대 7일·장례비 일부 지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법으로 방지해 김 전 대통령의 차분한 장례를 진행한 바 있는 터다.
앞으로도 우리는 한 시대와 함께 과거의 인물을 떠나보내야 할 때를 맞게 된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과 선거 이슈에 또 다시 논의가 밀리는 형국이다.
전직 두 대통령의 죽음을 계기로 시대나 민심과 동떨어진 법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역사점 오점이 남지 않도록 손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뇌물죄 등을 확정 받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국가장 논란은 다시금 불거질 수 있다. 어쩌면 예우를 박탈당한 전직 대통령의 국가장 거행으로 이미 형평성 논란이 시작됐을지 모른다.
소나기가 내려야 무지개가 뜬다. 당장의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건 하등 도움이 안 된다. 훗날 불필요한 논쟁이 없게 당당하게 '법대로 하겠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것이 법치국가의 원칙이고 기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