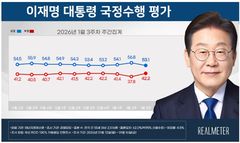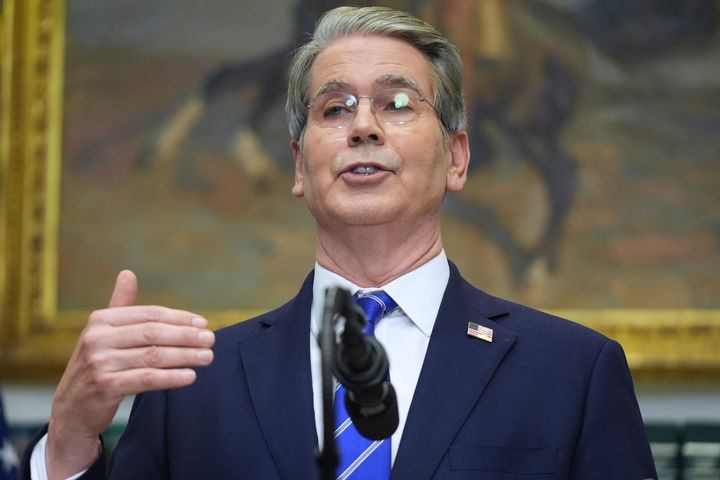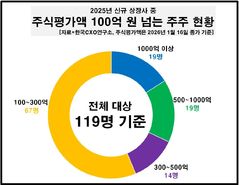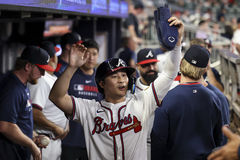[기자수첩]‘디지털 치료제’ 버블 조짐…“옥석가리기 필요”
![[기자수첩]‘디지털 치료제’ 버블 조짐…“옥석가리기 필요”](https://img1.newsis.com/2023/01/11/NISI20230111_0001173707_web.jpg?rnd=20230111133821)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정확한 임상 효과도 없이 단순 소프트웨어를 디지털 치료제로 내놓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디지털 치료제 개발 전문기업 대표 A씨의 쓴소리다. 이 회사는 삼성병원과 손잡고 식약처 품목허가를 위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지만, 뚜렷한 치료 효과 확보를 위해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게 A씨 신념이다. 태동하는 국내 디지털 치료제 시장에서 본보기 기업 역할을 하겠다는 사명감도 이 지루한 과정을 버티게 하는 힘이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치료제 시장은 A씨 신념과 반대로 흘러가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디지털 치료제가 연평균 20%의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단순히 돈만 노리고 들어온 기업들 탓이다. 이같은 허수가 발생하는 이유는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착각에서 시작한다.
디지털 치료제는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다. 일부에서 소프트웨어에만 초점을 맞춰 단순 게임을 디지털 치료제로 들이미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기존 게임을 모방한 소프트웨어를 갖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디지털 치료제 인허가를 시도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해당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지 않고, 퍼즐게임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식이다.
이들의 관심이 디지털 치료제 개발보다는 주가 올리기, 인지도 상승 등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최근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완화 기조에 편승해 한탕을 노리는 꼼수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치 코로나19 발생 첫해가 되풀이되는 모양새다. 당시에도 많은 기업이 치료제·백신 개발에 진정성을 갖고 나섰지만 연구개발(R&D) 투자비용 규모조차 미미해 의문부호가 붙는 일부 기업도 있었다. 의문부호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이들 중 일부가 지난해 슬그머니 임상 철회 등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다. 물론 주가는 내려갔지만, 재미를 본 사람은 따로 있다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했다.
다행히도 이제 정부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다. 디지털 치료제와 관련해 부실한 기업은 거르고, 도움이 필요한 유망 기업에는 지원을 늘리고 있다.
기업 역시 진정성을 갖고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나서야 한다. 디지털 치료제는 아픈 사람들을 어루만져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환자와 의료진이 신뢰하고, 동료 기업인에도 떳떳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진지한 개발이 이뤄져야 할 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