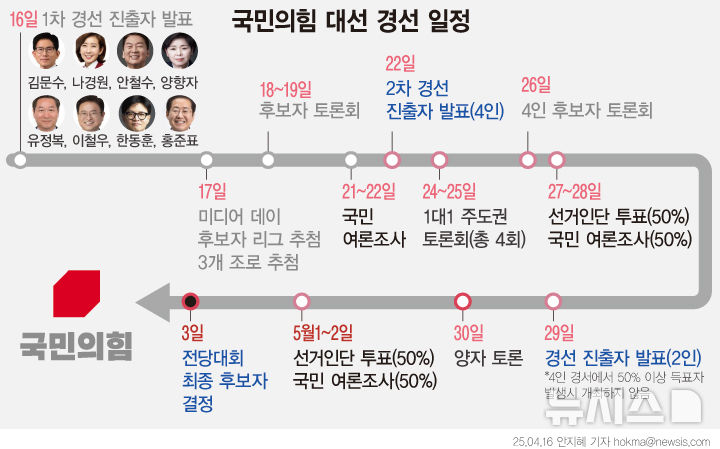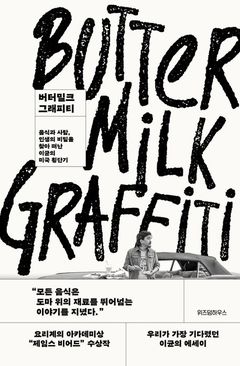유리창이 새 수백만 마리 목숨 앗아가는데…방지예산 내년 반토막
'네이처링'에 기록된 5년간 유리창 충돌 현황 공개
전방 잘 못 보는 특성 때문에 유리창 충돌 사망 빈번
조류 충돌 저감 사업 예산 갈수록 줄어…내년 반토막
![[남해=뉴시스]차용현 기자 = 제204호 팔색조가 경남 남해군 상주면 한 커피숍 대형 유리창과 충돌해 죽은 채 발견됐다. 2021.05.25. co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5/25/NISI20210525_0017490198_web.jpg?rnd=20210525141550)
[남해=뉴시스]차용현 기자 = 제204호 팔색조가 경남 남해군 상주면 한 커피숍 대형 유리창과 충돌해 죽은 채 발견됐다. 2021.05.25. con@newsis.com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생태원에서 관리하는 시민조사 플랫폼 '네이처링'에 기록된 조류 충돌 피해는 최근 5년 간 4만4973 마리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20년 8883 마리 ▲2021년 9508 마리 ▲2022년 1만3246 마리 ▲2023년 9711 마리 ▲2024년 (7월31일 기준) 3625 마리 등이다.
이는 시민들이 투명구조물에 치여 죽거나 다친 새를 직접 관찰해서 네이처링 앱에 기록한 수치로 실제 사고는 이보다 훨씬 자주 발생한다.
생태원에 따르면 유리창·투명 방음벽 충돌로 죽는 국내 야생 조류만 연간 800만 마리로 추정된다.
네이처링에 기록된 조류 충돌 현황을 보면, 멧비둘기가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종으로 나타났다.
올해(7월31일 기준 533 마리)를 제외하고 시민들이 기록한 유리창 충돌 멧비둘기 수는 2020년 1656 마리, 2021년 1480 마리, 2022년 1709 마리, 2023년 1274 마리 등으로 매년 1000마리를 훌쩍 넘는다.
멧비둘기 외에도 참새, 직박구리, 물까치, 박새, 되지빠귀, 붉은머리오목눈이, 호랑지빠귀, 흰배지빠귀, 집비둘기 등도 충돌 피해를 자주 입는 종들로 파악됐다.
새들이 비행 도중 유리창에 치여 죽는 이유는 전방을 잘 못 보는 특성 때문이다.
새는 먹이나 천적을 감지하기 위해 눈이 머리 옆에 달려있어 전방의 구조물을 포착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사람처럼 눈 앞에 있는 유리창 등 투명 구조물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유리에 반사된 바깥 풍경을 현실로 오인하기도 한다.
또 조류의 두개골은 계란을 깨는 충격에도 부서질 만큼 매우 약해 유리창에 부딪히면 즉시 사망하거나 자연에 살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2022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등의 부착 의무가 생겼다.
건물 유리창과 방음벽에 일정 규격의 패턴 스티커를 붙여 새들로 하여금 해당 공간을 통과하지 못하게 유도하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단순 권고에 머무르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환경부가 조류 충돌 저감 사업을 시행한 이후 총예산(5억9000만원)의 약 9%인 52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류 충돌 피해를 줄이려는 정부 노력도 갈수록 소극적인 편이다.
조류 충돌 저감 사업에 편성된 환경부 예산은 2020~2022년 1억5000만원에서 2023~2024년 1억2000만원으로 줄어왔다가 내년 5000만원으로 반토막 났다.
관련 예산 집행이 부진하면서 내년 예산도 깎인 것으로 풀이되는데, 환경부가 조류 충돌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선 의원은 "2년 전 야생 조류의 투명 구조물 충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생생물법이 개정됐지만, 정부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경부는 야생 조류의 방음벽 충돌방지 조치 확대 등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과 집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