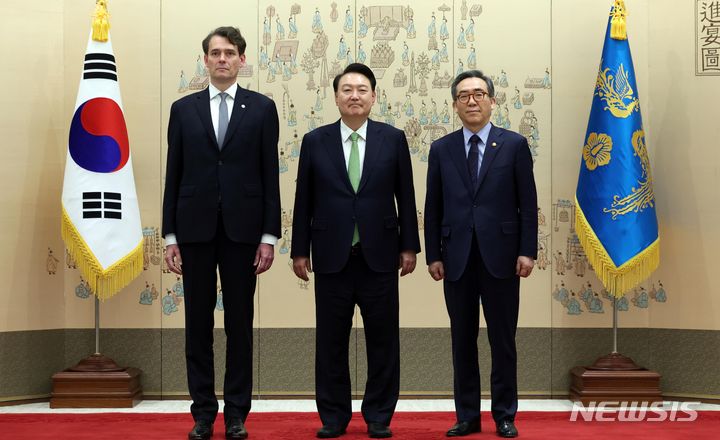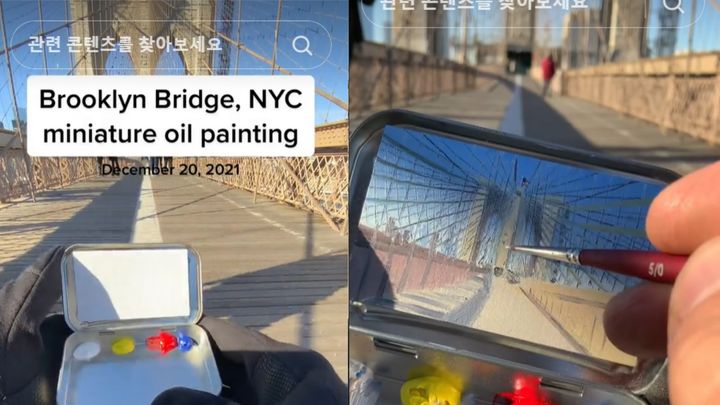[여경의날]네아이 엄마 여경 "따스한 경찰관 되고파"

여기에 육아까지 더해지면 아슬아슬한 줄타기. 선택은 강요되고 아등바등 둘 다 건사한들 본전에 불과하다.
서른여덟 그녀는 네 아이를 둔 다둥이 엄마다. 밖에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15년차 경찰관이기도 하다.
그 역시 다른 워킹맘과 다르지 않아서 일과 가정 사이를 바쁘게 오간다. 그래도 "아이들이 제법 커서 이젠 좀 수월하긴 해요" 하며 웃음 짓는 그다.
제69주년 여경의날(7월1일)을 하루 앞둔 6월의 마지막날인 30일 대전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이해온 경사를 만났다.
인터뷰를 청하기에 앞서 나눈 전화통화에서 느껴진 친절함을 얘기하니 "고객님들에겐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하려고 노력한다"고 답한다.
경찰관 입에서 나오는 '고객님'이라는 말이 귀에 설다. 이 경사는 "민원실 근무를 하며 경찰관도 친절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경찰에 고소·고발로 호소할 때 그 막막함과 답답함이 한결 누그러질 것 같다.
그런 그도 경찰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게 달갑지만은 않았다.
그는 생활안전계에서 일선 지구대의 방범활동과 강·절도 등 범죄분석을 토대로 특별방범활동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했고 그 공을 인정받아 지난해 경찰의날에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이전엔 여성청소년계와 형사지원팀, 생활질서계에도 적을 뒀다.
1층 민원실로의 이동은 다둥이 엄마에 대한 배려의 성격이 짙었지만 동시에 업무성취와 육아 중 무게감이 한쪽으로 기운 건 분명했다.
전진을 위한 후퇴라 생각했다. "누군가는 이 시기에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그 부담을 더 이상 시어른들에게만 지울 순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오후 6시30분이면 퇴근해 아이 넷을 목욕탕에 몰아놓고 밀린 설거지를 한다.

보드게임 한판은 필수. 자정을 한 시간 앞두고야 이 노동이 끝난다.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면 다시 다음날 아침 찬거리를 만들고 등교할 때 입을 옷을 준비한다. 이 순간 그는 그냥 엄마다. 네 아이의.
그 고단함마저 달콤한 건 여섯 가족이 2년 전에야 비로소 한 울타리에 살게 돼서다.
이 경사는 "지인 소개로 만나 순경 초임시절 결혼한 남편도 경찰관이었고 서로 근무지가 엇갈려 2013년에야 대전에서 아이들과 함께 정착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녀의 남편은 옆 동네 둔산경찰서의 교통안전계 소속 박인용(42) 경사다.
그와 사이에 첫째 세일(12)군을 낳았고 동생 낳아달라는 성화에 못 이겨 세빈(8)을 가졌다.
그러고도 딸은 있어야 한다는 남편 바람에 큰 맘 먹었더니 이란성 딸 쌍둥이로 세연·세진이가 세상에 나왔다. 녀석들이 벌써 6살이 돼 유치원을 다닌다.
'혹시 또…'하는 질문에 이 경사는 고개를 저으며 "아이들 모두 꿈이 경찰관이래요. 그럼 육아는 어느 정도 성공한 거 아닌가요" 한다. 그러곤 명토 박아 말한다.
"친지 중에 경찰총수까지 지낸 분이 계세요. 그분을 보고 자라며 청렴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따스한 경찰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마음으로 경찰에 들어왔고 앞으로도 그 초심을 잃고 싶지 않아요."
이 경사의 외할아버지가 지어줬다는 그 이름 해온(海溫·따뜻한바다)이 그의 남은 항로를 인도해 줄 밝은 불빛처럼 여겨졌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