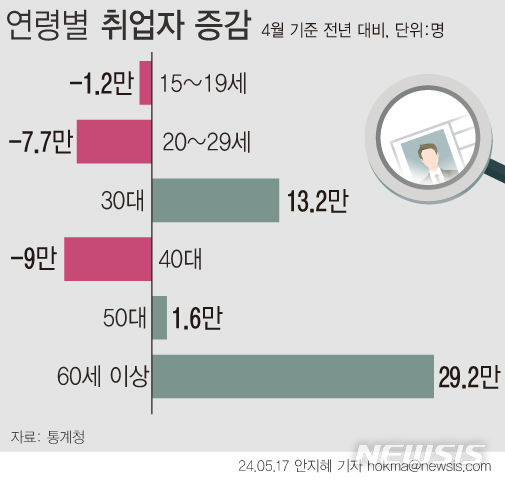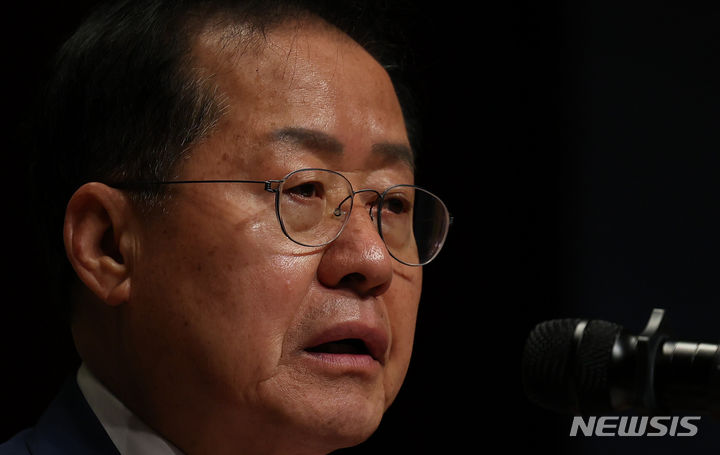정세균계 '광화문포럼' 해산…"계파 자발적 해체하자"
"계파 해체가 재건 출발" 이재명계 겨냥
"정세균도 '잘 했다. 해산이 맞다'고 해"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정세균 전 총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정세균계 의원 모임인 ‘광화문포럼’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의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1.05.11.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1/05/11/NISI20210511_0017438480_web.jpg?rnd=20210511091803)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정세균 전 총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정세균계 의원 모임인 ‘광화문포럼’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의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1.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세균계 의원 모임인 '광화문포럼'이 3일 해산을 선언했다.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로 당이 혼란스런 가운데 선제적으로 '계파 해체'를 주장한 것이다.
광화문포럼 회장인 김영주 의원과 운영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화문포럼 소속의원 61명은 더 큰 통합의 정치를 지향한다"면서 광화문포럼 해체를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하고, 민주당 승리를 위해 대선을 위해 뛰었지만 민주당은 패배했다. 대선 패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좌충우돌 전략으로 일관한 지방선거는 참패했다"며 "광화문포럼은 포부를 갖고 문을 열었지만 포럼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으며, 더 이상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해산의 변을 밝혔다.
이어 "이제는 포럼으로서가 아닌 의원 개개인으로서 민주당의 재건에 기여해야 한다. 광화문 포럼의 문을 닫지만 문 앞에 이렇게 세워두고자 한다"며 ▲책임정치 ▲자발적 계파 해체 ▲훌리건 정치 극복 ▲국민 공감 유능한 정당으로 변화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의 재건은 책임정치에서 출발한다. 당내 모든 계파정치의 자발적 해체만이 이룰 수 있다"며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식의 훌리건정치를 벗어나는 속에서 가능하다. 국민이 공감하는 유능한 정당의 변화 속에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화문 포럼 소속 의원은 문 앞에 세워둔 기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광화문 포럼이 추구한 '통합의 대한민국,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한 길은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는 정세규계계가 선도적으로 계파 해체를 선언함으로써 대선경선 이래 민주당의 주류로 발돋움한 이재명계에 대한 우회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김영주 의원은 회견 후 만난 기자들이 '간접적으로 이재명계 해체를 요구한 것이냐'고 묻자, "공부모임이든 계파모임이든 이걸 다 해체하는 것이지 특정해서 계파 (해체를)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국민이 보실 때 우리 당이 사분오열같은 느낌 드는 게 대선부터 그룹, 그룹 모이다보니까 어디 계에서 누구를 지지하는 게 많이 자리 잡아서 계보 없이 공부모임으로, 계파 없이 국민을 보고 이원욱 의원이 말한 초심, 원심으로, 민주당 정신으로 돌아가 다시 거듭나려고 하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광화문 포럼 해체에 대해 "잘 했다"며 동의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그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정 이사장이) 고생했다고 전화를 줬다"며 "정 이사장에게 사전에 말씀드리거나 의논한 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걸 하겠다고 하니 '잘했다. 공부모임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국민과 언론이 볼 때 오해의 소지가 많은 포럼이 됐으니 해산하는 게 맞다. 좋은 의견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관계 없다"며 "정치복귀 생각이 없고, 요청한 것도 없고 비대위원장은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가닥을 잡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앞서 정세균계 친문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친이재명계와 반이재명계의 동반 2선후퇴와 함께 '선거용 의원 모임' 해체를 요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