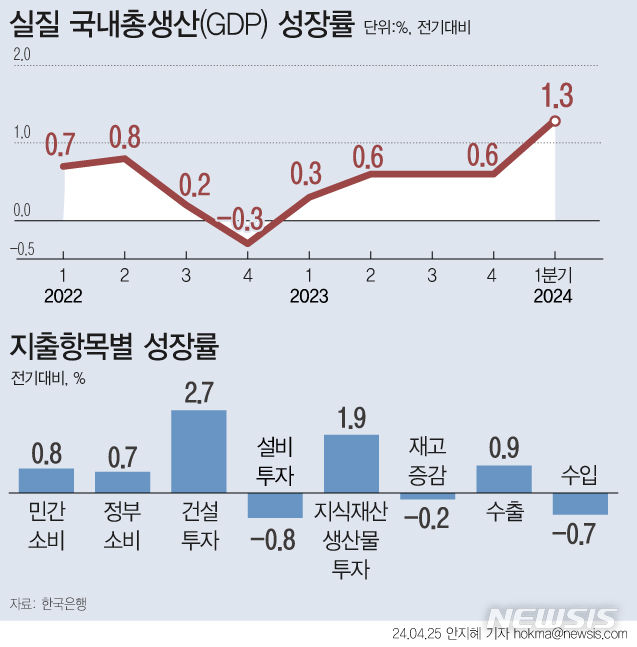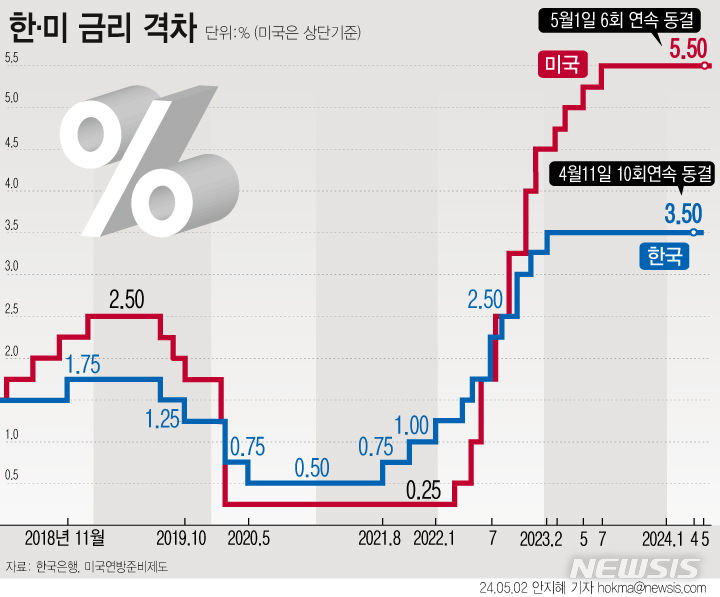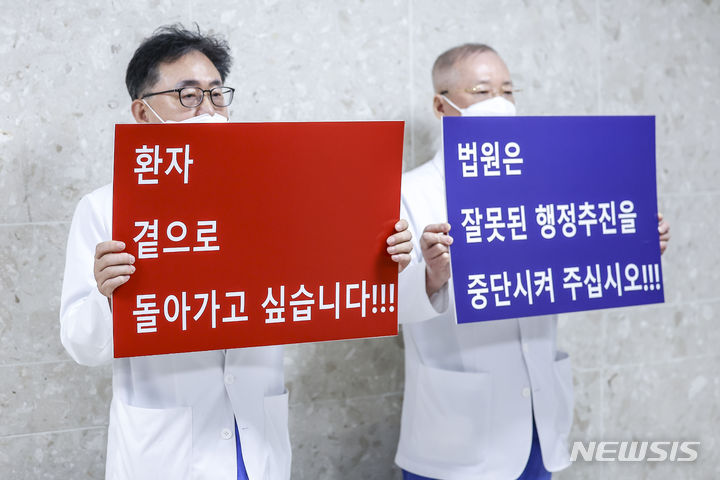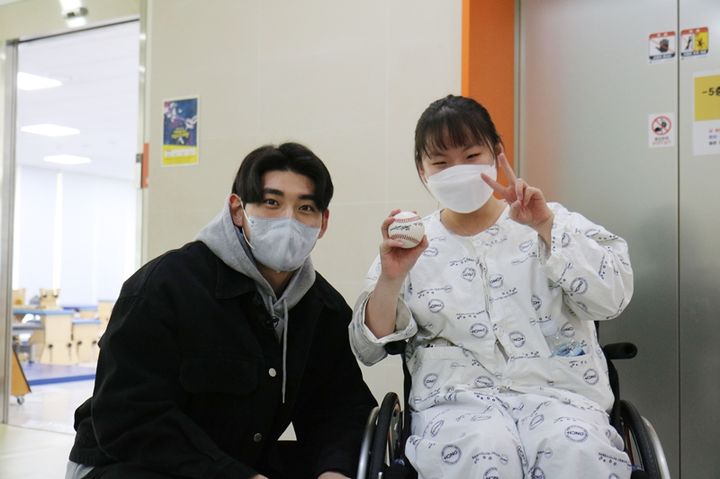친원전 기조 속 안전 규제도 강화하나…손해배상제 개선 검토
원안위, '원자력손해배상제 개선방안' 용역 공고
"공기업적 특성 고려해 사업자 책임 강화해야"
현행 배상 한도 1.5조…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현장.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2.02.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image.newsis.com/2022/02/25/NISI20220225_0018529317_web.jpg?rnd=20220225201336)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현장.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2.02.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내 원자력 사업자의 사고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원자력손해배상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새 정부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 발전 활용 제고를 추진하는 가운데, 안전 관리 규제 강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원안위는 다음 달 1일 '원자력사업자의 공기업적 특성을 고려한 원자력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입찰을 개시한다. 원안위는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과는 달리 상업용 원자력 발전의 정부 출자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공기업적 특성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안위는 연구 내용으로 우선 한국과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원자력사업자와 원자력 산업 환경 등의 특성을 비교·분석해 개선 사항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원자력손해배상제도 개선안을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용역 공고 단계인 만큼 연구 결과에 기반한 원자력손해배상제도 개선 추진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원안위가 한국수력원자력 등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원자로 운전 등으로 발생한 원자력 손해에 관한 손해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 사업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할 목적으로 마련된 법이다. 이 법은 원자력 사업자가 원자력 사고 한 건마다 9억 계산단위 한도에서 원자력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계산단위'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으로, 9억 SDR은 우리 돈 약 1조5000억원에 해당한다. 즉, 국내 원전에서 수조원 규모의 사고가 나도 사업자는 1조5000억원까지만 배상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이 같은 배상 책임 한도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피해가 수십조원에 이르는 사고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인적·물적 피해액이 2018년 말 기준으로 약 84조원에 달하는데, 배상 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일본, 스위스 등 국가처럼 책임 한도 제한이 없었지만, 원자력 사업자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2001년 이후 유한책임제도로 전환됐다. 2001년 당시 정해진 손해배상 한도액은 3억 SDR(약 5000억원)이었다. 이후 20년간 단 한 번도 상향되지 않다가 지난해 원자력사고 배상책임 한도를 9억 SDR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한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원안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 사업자에 대해 보고를 명할 수 있는데,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안위 내부에서는 이 같은 현행 과태료 규모가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에는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보는 견해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더해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원전의 적극적인 활용과 더불어 원안위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인허가 단계별 안전성 검토 등을 통해 원자력 안전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초 원안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5인의 상임위원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