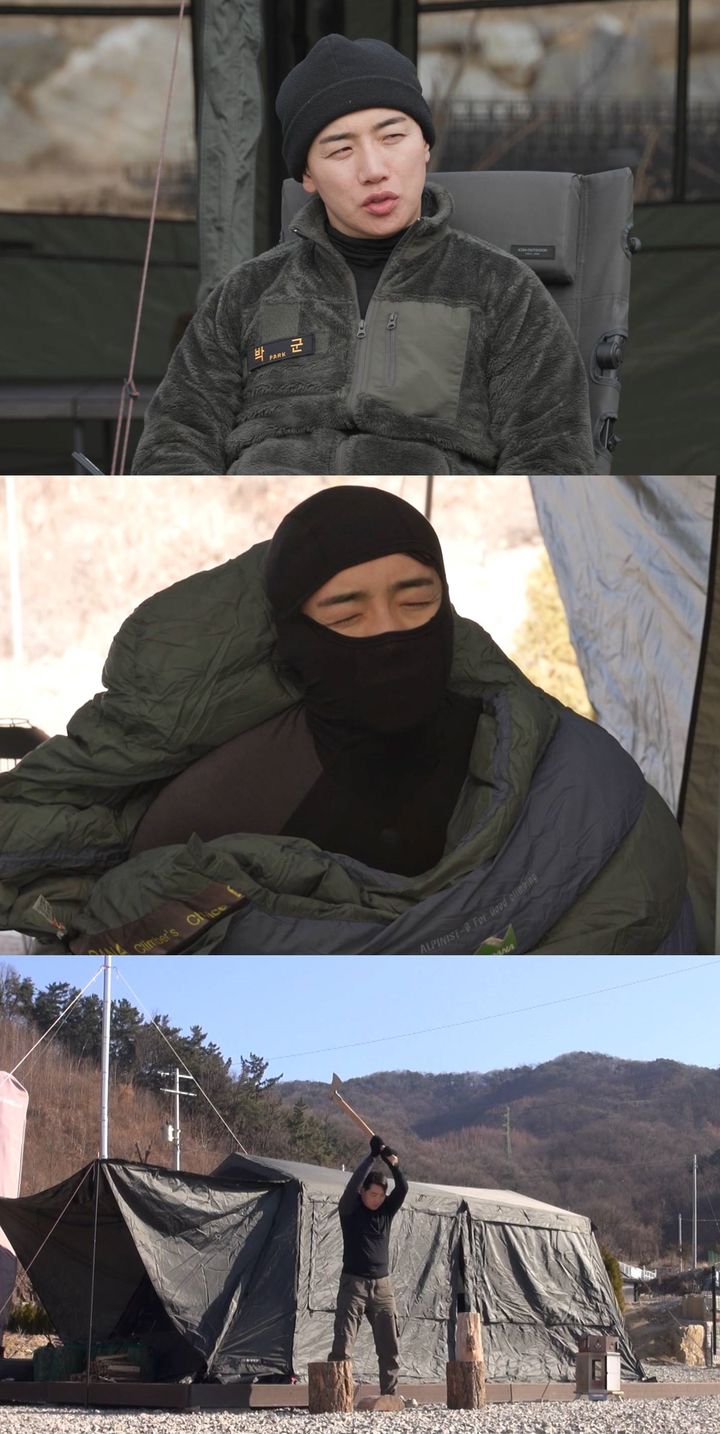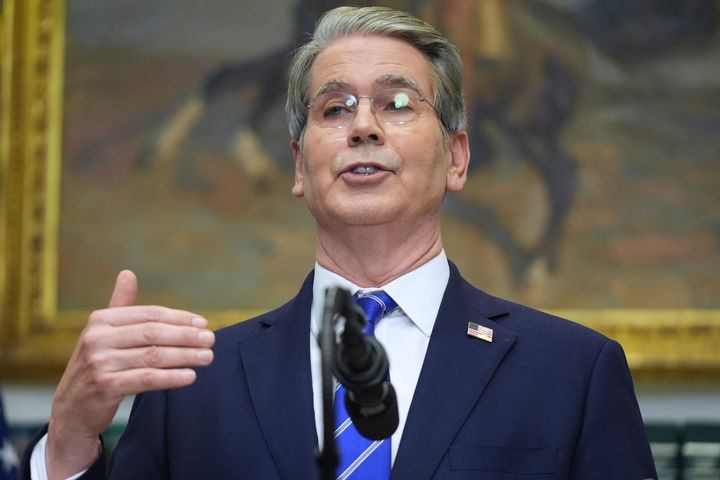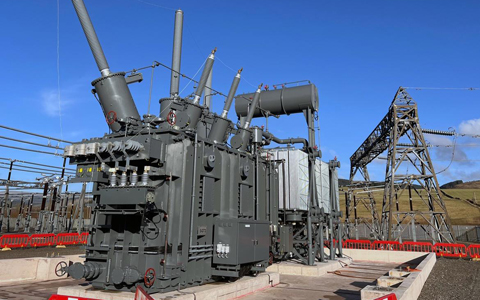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흑색선전 그만, 법정서 따지자"

앞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바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하루 뒤 노 관장이 왜곡된 사실과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며 입장문을 내고 다시 반박했다.
노 관장 측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평안의 이상원 변호사는 지난 30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최 회장 측 입장문에 대해 현재로서는 더 이상 공개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 이외의 갈등보다는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 회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로고스 측도 "개인간 분쟁이고 가사 사건인 점을 고려해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법무법인 평안 측은 지난 27일 노 관장이 김 대표를 상대로 3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김모씨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하루 뒤인 28일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최 회장 측은 이 입장문에서 "노 관장 측 보도자료는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해 작성됐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알려지도록 해 개인의 인신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 "노 관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4일 이후부터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최 회장 측 주장에 대해 이상원 변호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시효가 지났다고 하지만 최 회장과 김 대표 관계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며 "노 관장은 현재도 정신적인 고통을 크게 받고 있는 만큼 시효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 회장 측이 언론 자료 배포를 비난한 것에 대해 "소송 사실이 알려졌고, 기자들의 문의가 많아 이를 하나하나 대응할 수 없어 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것"이라며 "최 회장 측도 입장문을 만든 것은 똑같은 성격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다 2년 뒤 입장을 바꿨고,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가진 그룹 지주사 SK주식 중 42.29%(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