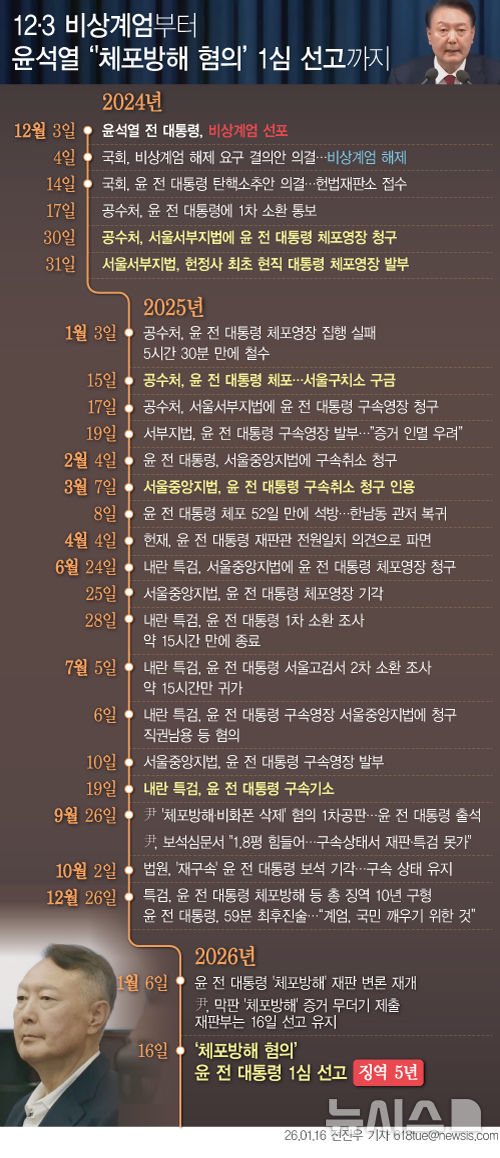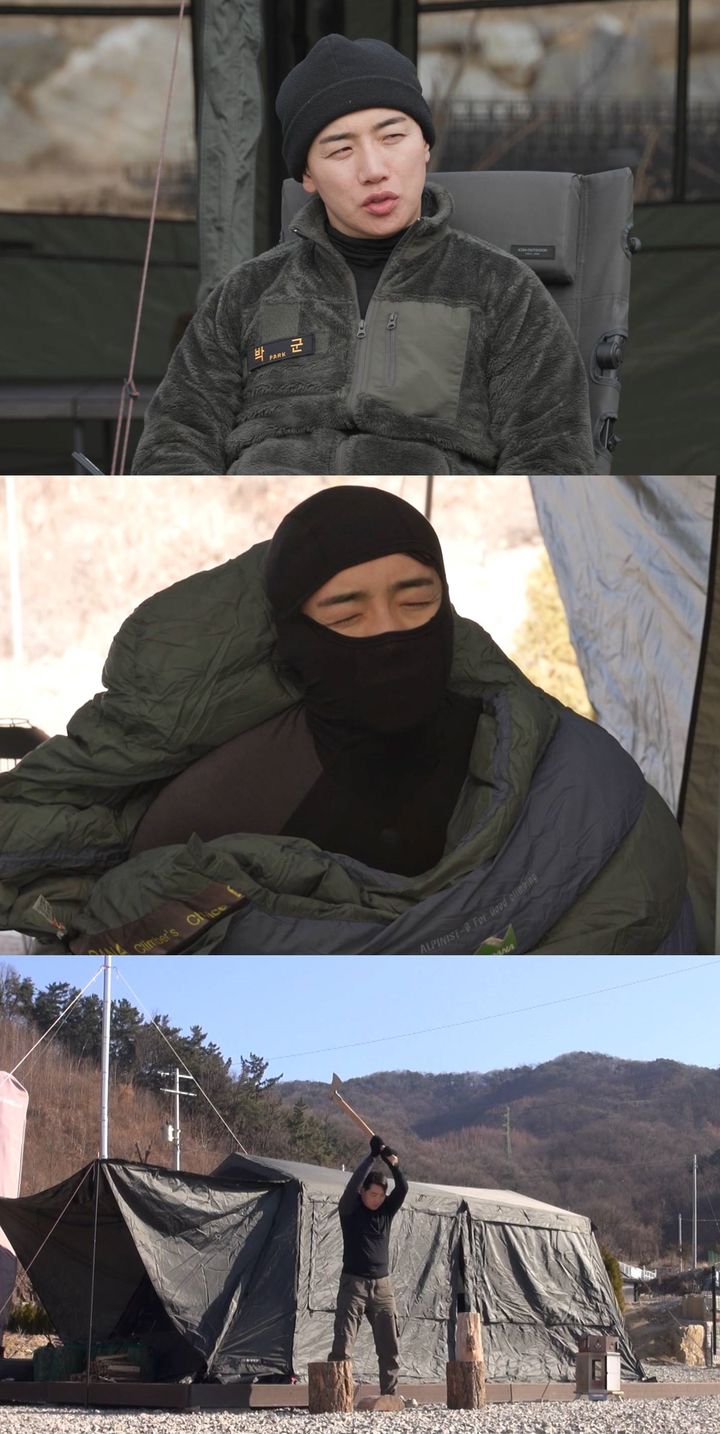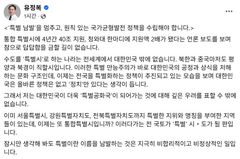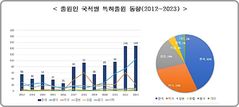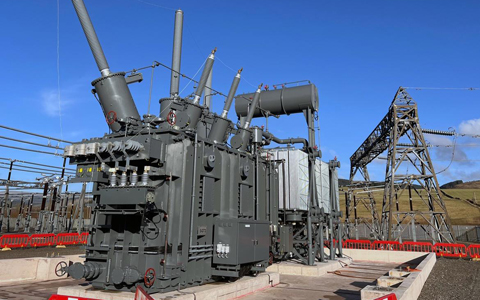北 군사위성 발사 안보리 회의서 미·중·러 갈등(종합)
美 "안보리 결의 위반…안보 불안정 위험"
中 "美, 외교 언급하면서 꾸준한 군사활동"
러 "美·동맹국의 확장억지가 악순환 원인"
![[뉴욕=AP/뉴시스] 지난해 10월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논의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열리고 있다. 이 자리에는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참석해 북한의 거듭되는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06.03.](https://img1.newsis.com/2022/10/06/NISI20221006_0019327202_web.jpg?rnd=20221006081044)
[뉴욕=AP/뉴시스] 지난해 10월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논의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열리고 있다. 이 자리에는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참석해 북한의 거듭되는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06.03.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관련 긴급회의가 소득 없이 종료됐다.
안보리는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개회의로 제9337차 회의를 열고 북한의 비확산 문제를 논의했지만, 공식적인 대응책 도출에 합의하지는 못했다.
미국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우드 미국 대사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이번 발사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여러 안보리 결의안을 뻔뻔스럽게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켰다"며 "이미 민감한 지역안보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 위험이 있었다"고 북한을 비난했다.
또 안보리가 북한의 불법 발사를 규탄할 것과 북한이 또 다른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비판도 내놨다.
우드 차석대사는 "북한은 안보리에서 두 국가의 확실한 지원을 받아 불법 발사를 정상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 증가와 유엔 이사회의 침묵에 직면해, 두 이사국이 미국과 그 동맹국이 가만히 있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몰아세웠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북한은 합법적인 안보 우려를 갖고 있다"고 운을 뗐다.
겅 부대사는 안보리가 한쪽만을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우려를 고려한 진정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해왔다"면서도 "동시에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꾸준히 군사 활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겅 부대사와 안나 옙스티그네예바 러시아 차석대사는 미국이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옙스티그네예바 차석대사는 "한미일 군사활동 증가가 동북아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미국과 그 동맹이 대북 압력 수위를 높이는 확장억지가 악순환의 원인"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황준국 주유엔 한국 대사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 군사훈련이 도발을 촉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북한은 자신의 각본에 따라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주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번 긴급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고됐다.
2017년 대북 제재 강화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의 무력도발 관련 긴급회의가 여러 차례 소집됐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번번이 공동 성명 채택 등 대응에 실패한 전력이 있다.
지난달 31일 북한은 오전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발사체 '천리마-1형'을 발사했지만, 발사체가 서해로 추락하면서 궤도 안착에 실패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체 발사는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해당한다.
이번 긴급회의는 미국과 알바니아, 에콰도르, 프랑스, 일본, 몰타, 영국 등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 요청으로 소집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