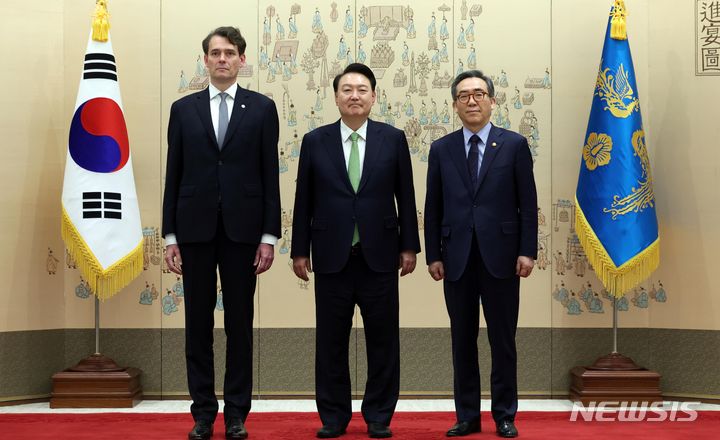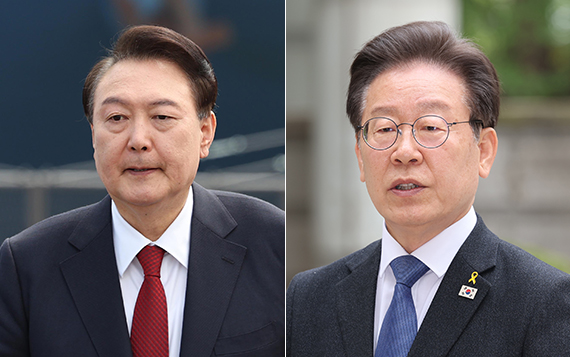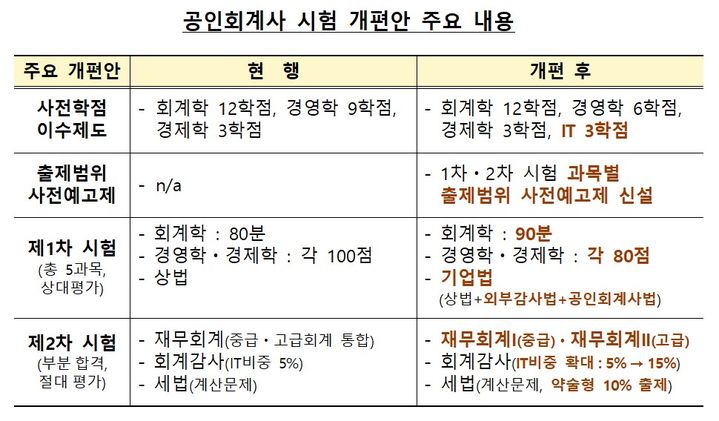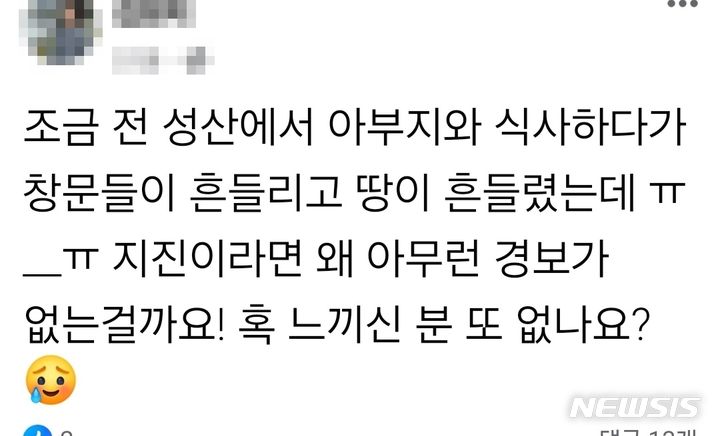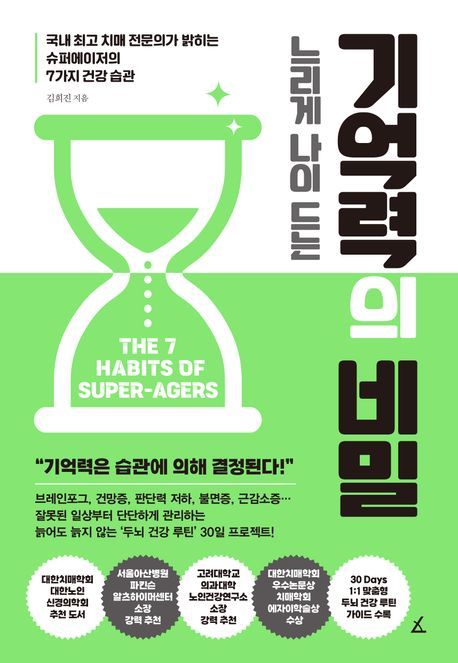與 "정부 개성공단 전면중단 '불가피'"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며 "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다른 어떤 현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우선 핵심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안보준비태세는 최악을 전제로 하는 만큼 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불편함과 불이익도 감내하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무력화하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평화의 빵이 공포의 무기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번 조치는 그간 북에 대해서 돌아오지 못할 다리는 건너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그 다리를 건넌 것에 대한 대가"라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정부의 개성공단 조치는 정말 고뇌의 결단이었다"며 "우리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돌아온 것은 알다시피 핵과 미사일"이라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우리는 주변국과 안보리에 강력한 제재를 요청했지만 이번엔 그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남에게 강력한 경제 제재를 요구하면서 우리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돈줄을 차단 안 하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 국가 안위와 관련된 문제"라며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뜻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과거 정권은 핵 문제는 북과 미국이 풀어야 할 문제다, 우리 민족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상 맞장구 쳤다"며 "모든 것이 파탄 났다. 이제 북핵능력은 치유할 수 없는 암덩어리처럼 성장해서 대처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이 최고위원은 "야당은 과거 정책적, 전략적 실패를 더이상 감추려고 하지 말고 냉정한 현실로 나오라"며 "국가 안보가 경각에 달렸다. 이 북한의 핵 야망 돌진을 막지 못하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 지 알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을동 최고위원은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대통령 결단은 더 이상 북에 끌여다니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며 "다소 경제적 손실을 치러도 평화를 위해 국민 의지를 모아 감내할 건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대희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데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오늘부터라도 우리 정치권은 안보 문제에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 국민을 조금이나마 안심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역시 "북에 대해 방어적 대응만 해서는 안 되고 공격적,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뼈아프지만 적극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개성공단 중단과 한반도 사드 도입 방침에 야당이 반대하는 걸 보면 아직도 꿈에서 깨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북한을 어물쩍 용인할 게 아니면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강구하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황 총장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사드 도입은 경제 안보 양면에서의 압박이자 영토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모두 반대할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북을 압박할 지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