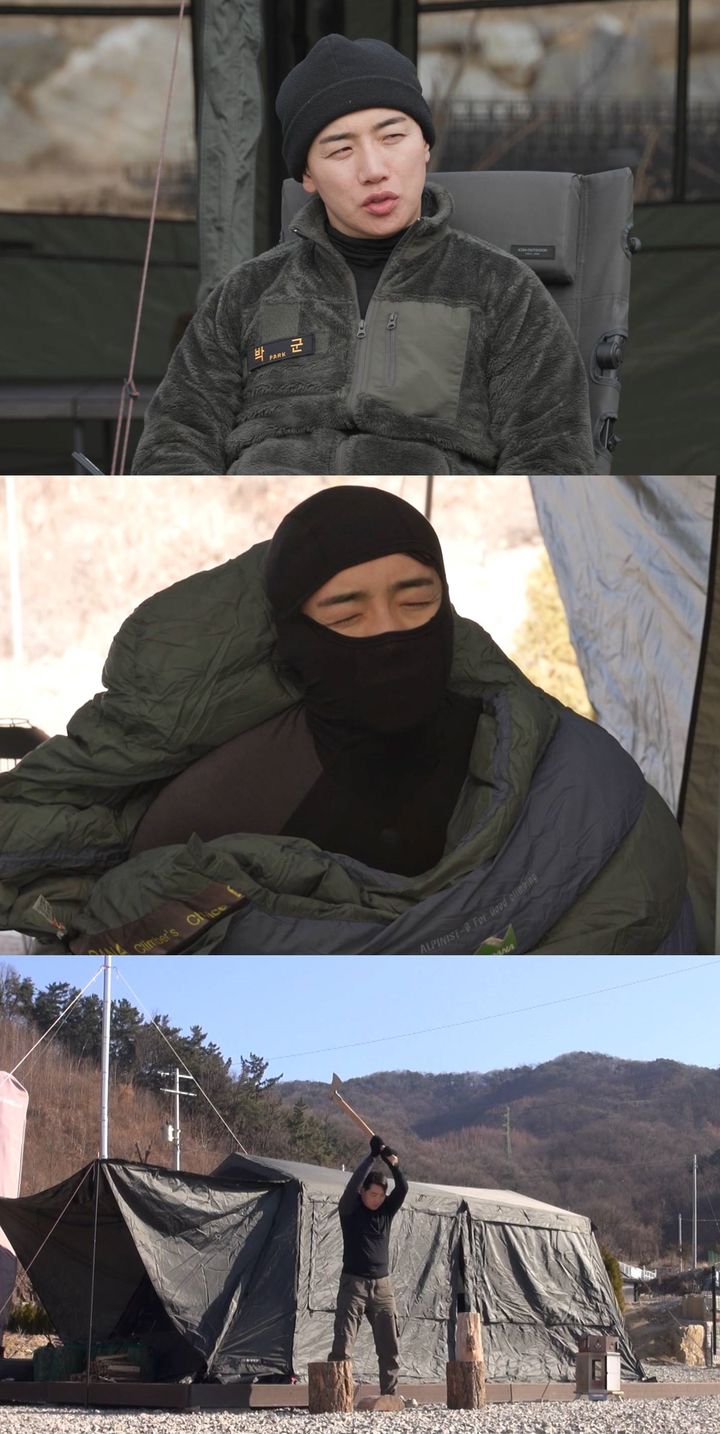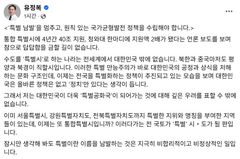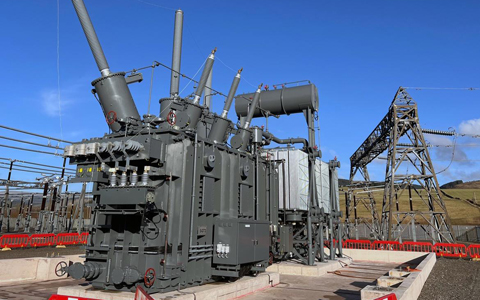댓글 없어진 포털…"왜곡·혐오 차단" vs "타인 의견 몰라 답답"
다음뉴스 '댓글→채팅' 개편 놓고 누리꾼 의견 분분
"편향되고 부정확한 주장이 '베댓'되는 문제 해결해야"
"공감가는 글에 추천 누르는 건 자유로운 의견 교환"

9일 카카오에 따르면 전날 다음뉴스에 채팅형 댓글 서비스 '타임톡' 베타 버전이 개시돼 기존 댓글창은 모두 사라졌다. 기사 댓글을 추천순이나 찬반순으로 정렬하지 않고 이용자들끼리 실시간 소통하는 채팅형 댓글만 쓸 수 있다.
또 24시간이 지나면 각 기사에 달린 대화 내용을 지우고, 실시간 채팅창도 닫는다. 하루가 지나면 모든 기사가 댓글이 없는 형태로만 제공된다는 뜻이다.
카카오와 국내 양대 포털 구도를 이루고 있는 네이버도 ▲클린봇 도입 ▲댓글 수 제한 ▲댓글 공감·비공감 수 제한 등으로 댓글 기능을 제한해 왔다.
그간 한 쪽으로 편향된 댓글이 마치 다수 여론인 것처럼 과대 대표되거나, 기사 주제와 무관한 부적절한 댓글 또는 혐오 표현 등이 사라지지 않는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국민 10명 중 8명이 포털에서 뉴스를 접하는 만큼 포털에 달리는 댓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돼 왔다.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기존 댓글창 시스템의 부작용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당시 드루킹은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대선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댓글을 조작했다.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쓴 뒤 프로그램을 이용해 추천수를 높여 베스트 댓글로 상위에 노출되도록 한 방식이다.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 때는 적나라한 혐오 표현이 댓글창을 점령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 결과 이태원 참사 댓글을 본 이용자 71.4%가 '혐오적이거나 인신공격성 댓글'이 있었다고 답했다. 익명의 가면을 쓴 도 넘은 댓글을 참다 못한 유족들이 각 언론사에 이태원 참사 추모제 관련 보도의 댓글창을 닫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기존 댓글 시스템에 피로감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라는 반응이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의 추천이 몰리며 댓글창 상단을 점령하거나, 소수자·약자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성 댓글에도 다수 공감이 달리는 황당한 광경에 시달려 왔다는 것이다.
직장인 강모(34)씨는 "출퇴근 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댓글을 읽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내뱉기도 어려운 비속어로 가득한 댓글을 보면 괜히 읽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김모(26)씨도 "포털 뉴스 댓글을 보다 보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주제를 다룬 기사에는 매번 특정 주장을 가진 이들이 몰려와 댓글을 점령하더라"며 눈쌀을 찌푸렸다.
하지만 큰 폭의 변화에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실시간 채팅을 도입한 이날도 비속어를 사용한 댓글을 어느 기사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일례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결혼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기사에 맥락과 무관하게 전현직 대통령을 비난하는 댓글이 무수히 달리기도 했다.
무엇보다 하루만 지나도 기존 댓글을 폐쇄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30대 직장인 A씨는 "공감가는 댓글에 추천을 누르거나 반대로 비추천을 누르는 것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의 방식으로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며 "정도가 심한 부적절한 댓글은 걸러내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면 될 일이지, '여론 왜곡' 우려가 있다며 아예 닫아버리는 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