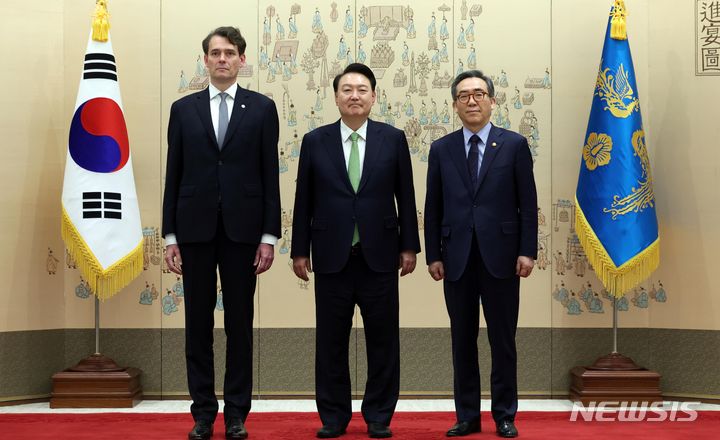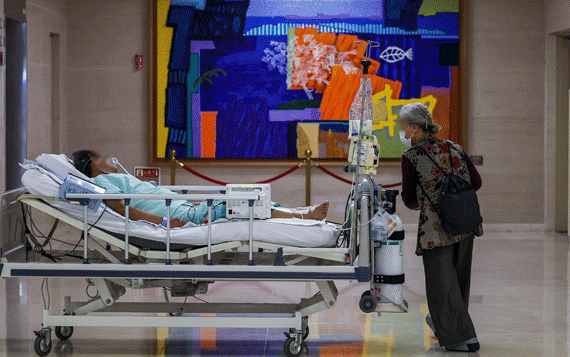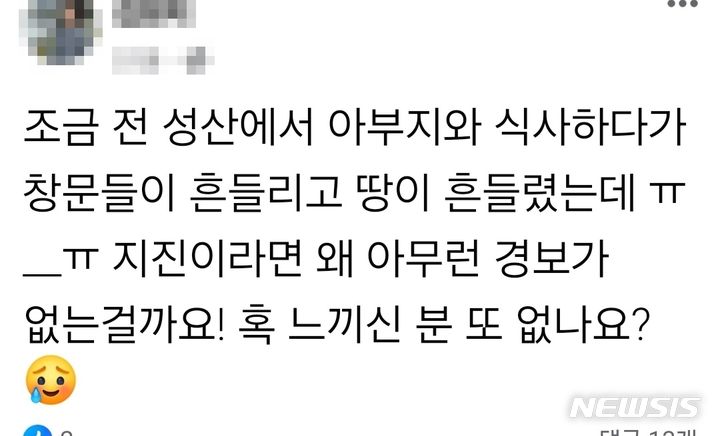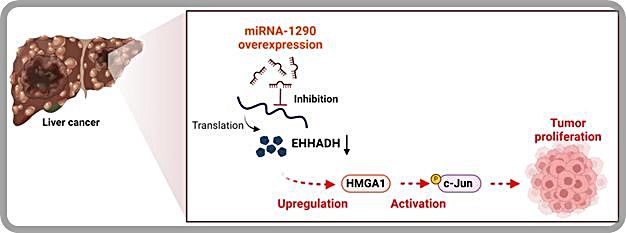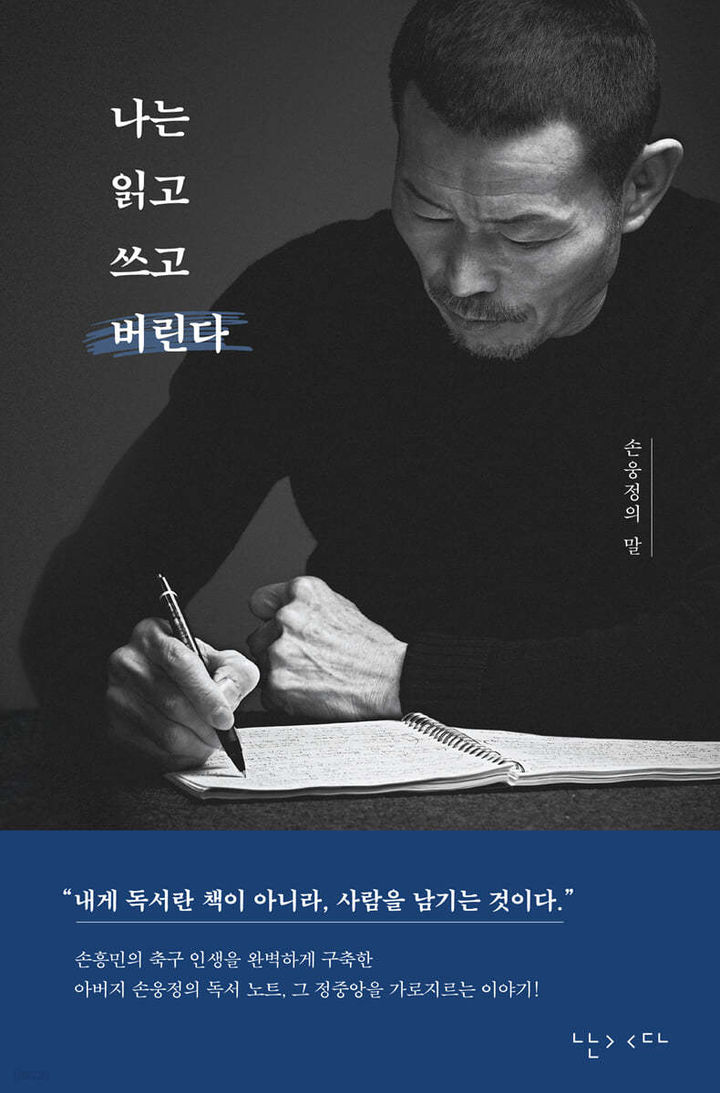[기자수첩]전기요금 개편, 합리적 결정 '전환점' 돼야
![[기자수첩]전기요금 개편, 합리적 결정 '전환점' 돼야](http://image.newsis.com/2020/12/18/NISI20201218_0000658741_web.jpg?rnd=20201218121903)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말 많고 탈 많던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일단락됐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콩(연료비)보다 두부(전기)가 더 싸다"는 작심 발언을 내뱉은 지 2년 만이다. 김 사장의 말은 석유 등 연료를 사서 발전기를 돌리는 데 쓴 돈이 버는 돈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과소비를 방지하겠다는 공적인 의미를 떠나 전기를 파는 회사의 수장으로서 충분히 해볼 만한 지적이었다.
아마 정부와 여당은 이 발언이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올해는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더 민감한 주제였다. 세금은 아니지만 공공재 사용료인 전기요금을 올리는 정권을 국민이 반길 리 없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의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 이번 정권만 그랬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2013년 11월 이후 7년 동안 전기요금을 묶어 놨다. 표면적인 이유는 물가 안정이었다.
이 기간 한전 실적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기름값이 비쌌던 지난해의 경우 한전은 1조30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다. 좋았던 시기도 있었다. 저유가가 지속되던 지난 2015~2016년 당시 한전은 10조가 넘는 대규모 흑자를 냈다. 유가에 따라 조 단위로 실적이 바뀐 것이다. 한 나라의 에너지를 책임지는 공기업의 재무구조치고는 너무 취약하다. 정부가 이런저런 부담에도 전기요금 체계를 원가연계형으로 바꾼 이유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남모를 속앓이를 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의 입김이 그만큼 세다. 세종 관가에서는 에너지 전환에 속도가 붙은 이후로는 공무원들이 관련 부서 발령을 기피하는 추세라는 말도 돈다. 최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더 냉랭해졌다. 일도 많은데 책임질 것도 늘었다.
문제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전력 시장 구조다. 시장이 아닌 정부가 전력 도·소매가격을 결정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이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조정하려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심의는 전기위원회에서 진행하지만 산업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따로 떨어진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심지어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이 부분을 지적했다. IEA는 지난달 발표한 '한국 에너지 정책 국가보고서'에서 "전기위원회의 역할은 대체로 자문 제공에 그치고 중요한 의사 결정은 모두 정부가 한다"며 "전력 부문을 개방해 전체 가치사슬에서 진정한 경쟁과 독립적 규제기관을 도입하지 못한 점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력업계에서는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 비용 구조 검증과 요금 수준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실제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에너지규제위원회(PUC)에서 해당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가스·전력시장위원회(GEMA)가 가스·전력산업과 관련된 규제 권한을 쥐고 있다.
새 요금 체계를 살펴보면 연료비 조정요금에는 상·하한선이 씌워져 있고 정부가 요금 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 여전히 시장 논리가 아닌 누군가의 입맛에 따라 전기요금이 조정되고 해당 기업들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가정 경제와 산업구조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의 특성상 시장 논리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맘대로 주무르는 구조는 이제 탈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끝이 아닌 이런 구조를 갈아엎을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