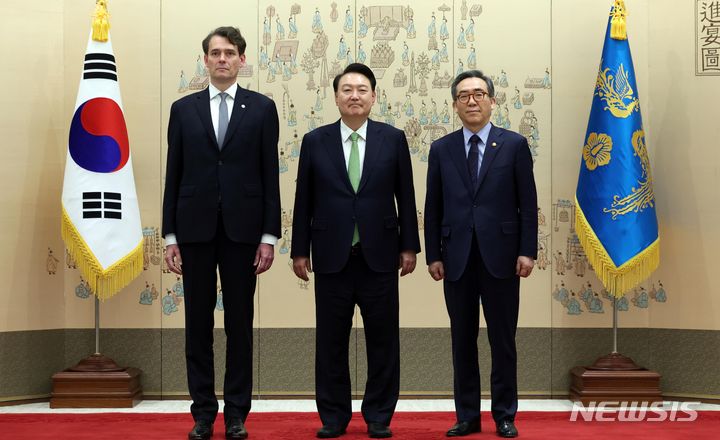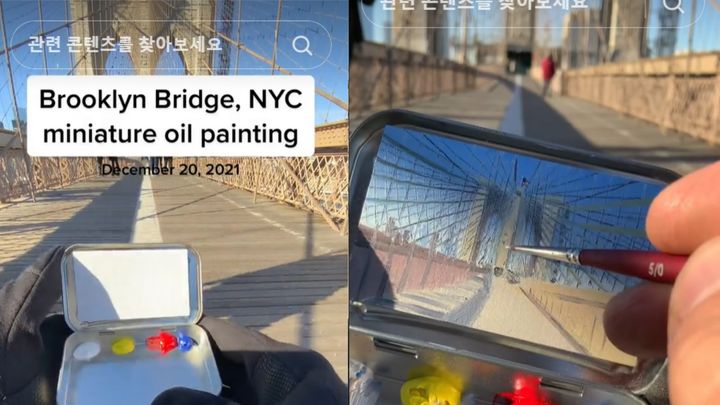[기자수첩]조력존엄사법 발의 이유 '돌봄 공백'에 답 있다
![[기자수첩]조력존엄사법 발의 이유 '돌봄 공백'에 답 있다](http://image.newsis.com/2013/02/04/NISI20130204_0007683297_web.jpg?rnd=20130204161836)
우리의 막연한 인식과 달리 죽음은 곁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이보다 세상을 떠나는 이가 이미 더 많다. 이는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500명, 사망자 수는 31만7800명으로 출생아 수는 역대 최소,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였다. 2025년 880만 명 가량의 가족들이 구성원을 잃는 아픔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민 5명 중 1명 꼴이다.
기대수명이 길어졌지만, 사망자 10명 중 7명 이상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죽는다고 한다. 삶의 마지막에 고통이나 불안을 줄여주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이 시급한 이유다. 실제 사회복지제도와 사회적 지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와 가족들의 간병살인, 동반자살이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사회는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냉랭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미온적이다. 국가암등록통계,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국민건강보험자료 등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확보하고도 암 이외의 만성질환이나 노화로 인한 임종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뒤로 물러나 있다. 국민이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절실함이 없다.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 전략 부재로 고통을 겪는 것은 결국 환자와 가족이다. 말기 환자들은 임종을 불과 얼마 남기지 않고 가까스로 호스피스 시설에 입소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전국에 호스피스 시설은 100여곳 있는데 시설별 병상 수는 평균 16개 정도(2월 기준)에 불과해서다. 코로나19로 그나마 있던 호스피스 병상 수가 더 줄어 입소 대기시간이 더 길어졌다.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사망이 임박한 환자들과 가족들의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품위있게 죽을 권리에 손을 놓은 사이 안락사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급기야 지난 5월 '조력 존엄사법(의사조력자살)' 발의로 이어졌다. 환자의 통증을 줄이는 의학적 조치와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적 지원 부족이 아쉬운 대목이다.
'잘 죽는 법'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 종교계는 조력존엄사법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작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는 소극적이다. 안락사 찬반 논쟁이 불거질 때마다 줄곧 호스피스 확대를 촉구하지만, 말 뿐이다. 사회복지망 확대를 현실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과 예산 편성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동하는 신앙'을 보여줘야 할 때다.
의료 현장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료 서비스 지침을 마련하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겪는 통증 조절과 삶의 마무리 등을 포함하는 지침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언젠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삶에서 큰 결정을 할 때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2005년 스탠퍼드대 졸업식에 참석해 한 연설 중 일부다. 아이폰 대중화로 세상을 바꾼 IT 혁명가는 이렇듯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을 삶의 원동력으로 바꿨다. 우리도 죽음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삶의 가치를 찾고, 의미있는 삶을 완성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정부의 정책과 사회적 지지가 충분히 뒷받침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