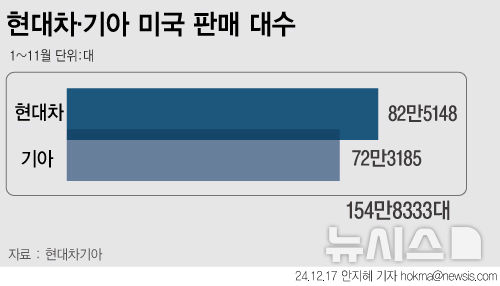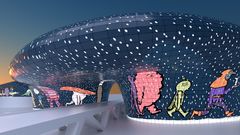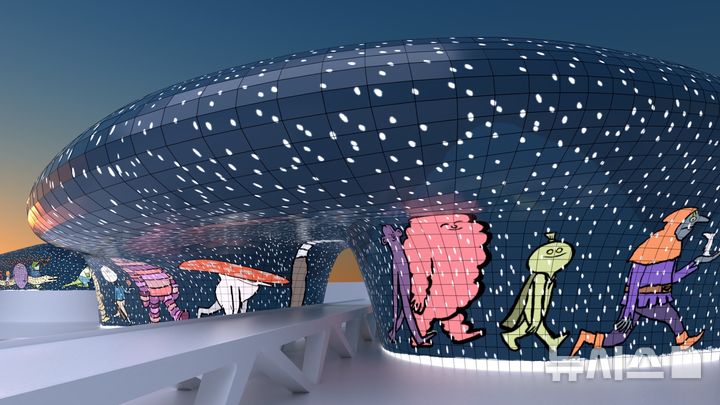'비명' 김종민 "이재명이 공천 전권…그런 정당 공산당밖에 없어"
"개딸이 편파적인 경선 기획…침묵하는 지도부가 문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3.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0/13/NISI20231013_0020089223_web.jpg?rnd=20231013152505)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천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비명계인 김종민 의원은 당대표가 공천 전권을 가진 정당은 전 세계에 없다며 이재명 사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전날(8일) 저녁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무총장을 뽑아 공천해서 원하는 색깔로 선거를 치르려고 당대표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전 세계 민주 정당 중에 그렇게 하는 정당은 조선노동당하고 공산당밖에 없다"며 "당대표가 이런 식의 독임적 권한을 갖는 당대표는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친명계인 조정식 사무총장이 총선기획단장을 맡고, 이 대표가 인재위원장으로 임명된 일련의 과정을 언급하는 와중에 나왔다.
김 의원은 "정당은 검찰 같은 행정조직이 아닌 토론조직이다. 어떻게 한 사람이 독임적으로 집행권한을 독점하느냐"며 "주식회사도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가 결정한 걸 CEO(최고경영자)가 집행을 한다. 혼자서 책임자 몰아주자 그건 군사조직"이라고 보탰다.
이어 "이 문제에 관해서 유일하게 이 문제를 문제 제기했던 정치인은 노무현"이라며 "대통령이나 정치 실권자가 당을 장악하지 않는다는 걸 몸소 실천한 사람이다"고 평했다.
패널로 나온 진중권 작가는 '시스템 공천'의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과정은 강성에 휩쓸린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비명계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거나 조직적으로 낙선 운동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자 김 의원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편파적인 경선 기획을 하는 것이라도 폭력과 불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며 문제는 침묵하는 지도부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지도부가 여기에 민주당의 경선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어줘야 한다"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유 있으니까 뭘 하든 지도부가 이걸 정리해 주고 선을 그어줘야 하는데 지도부가 이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도부는 경고했다고 한다'고 하자 "근절되거나 바뀌거나 해야 뭘 한 것이다. 말 몇 마디 한 게 뭘 한 것이냐"며 "비겁한 얘기다. 당대표하고 지도부가 마음먹으면 일주일 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오전에도 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당 총선기획단 첫 회의에서 제기된 '공천룰(규정)' 변경 가능성 등을 겨냥하며 "이번 민주당 공천은 역대 당 공천 중에 가장 불공정한 공천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총선기획단 첫 회의를 열고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현역 의원의 평가 하위 감산 확대' 등을 포함한 내년 총선 공천룰을 검토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권 20%에 경선 득표의 20%를 감산하는 현행 당헌당규를 현역 의원 30%를 대상으로 최대 40% 감산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는데 비명계는 공천룰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한다. 총선 1년 전에 공천 룰을 정하고 그 이후에는 손 안 댄다는 게 민주당의 불문율 아니 명문율이었다"며 "지도부가 총선을 앞두고 자꾸 뭔가를 만지려고 한다. 공정성, 질서가 실종돼 버렸다"고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