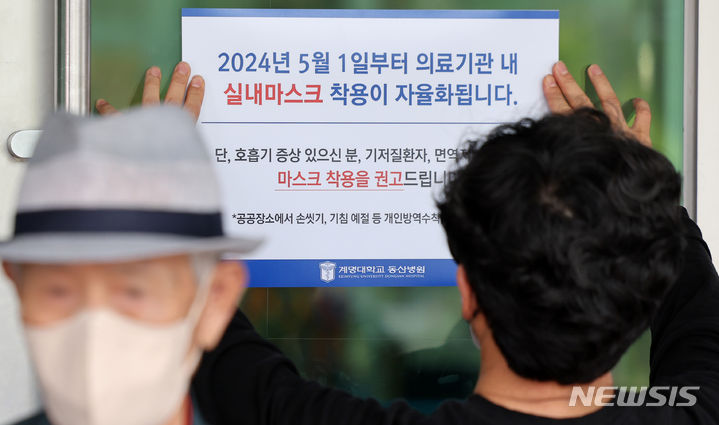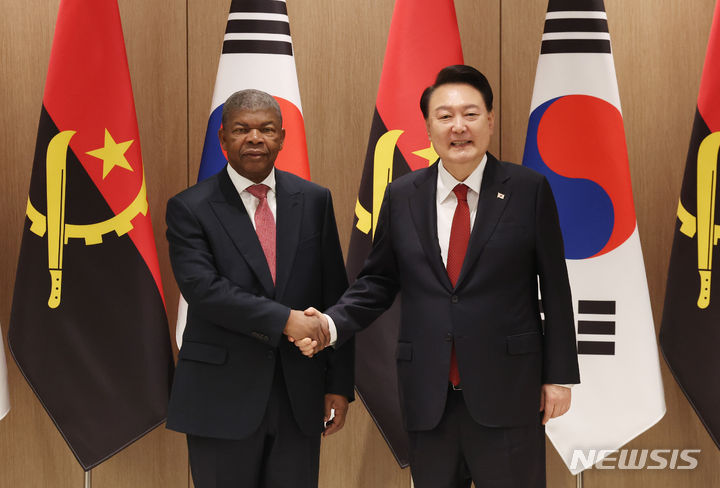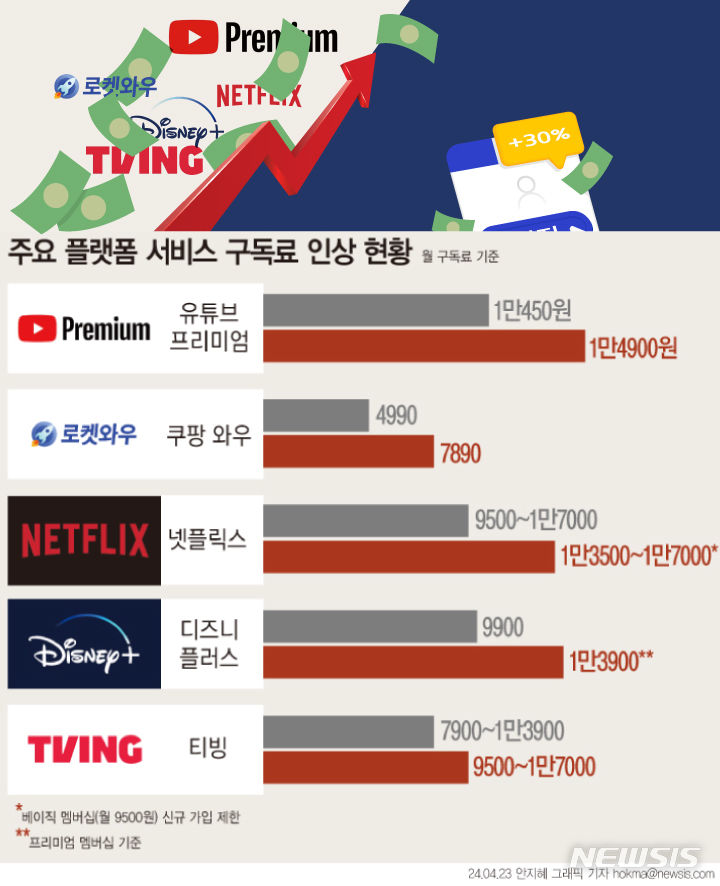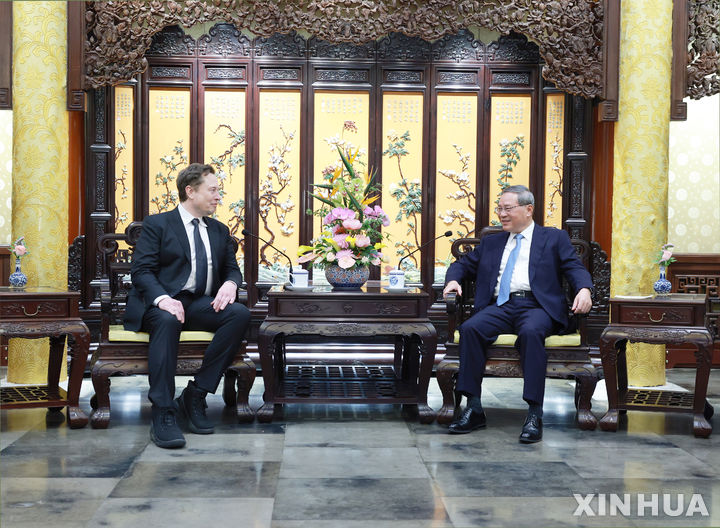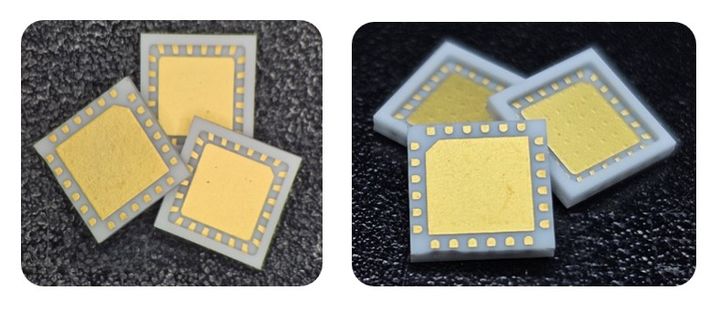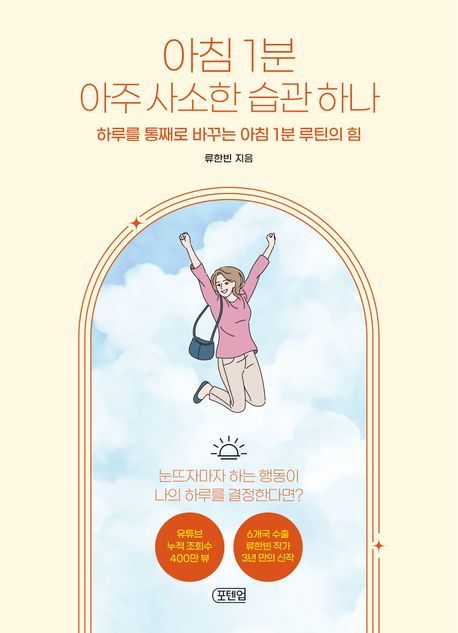[클로즈업 필름]그래도 그럼에도 카메라를…'노 베어스'
![[클로즈업 필름]그래도 그럼에도 카메라를…'노 베어스'](http://image.newsis.com/2024/01/09/NISI20240109_0001455683_web.jpg?rnd=20240109173738)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자파르 파나히(Jafar Panâhi·64) 감독의 '노 베어스'는 솔직하다.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말하자면 파나히 감독은 현실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고, 그의 카메라는 진실을 담을 줄 모른다. 그는 경직된 이란 사회가 만들어내는 각종 문제를 타개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벌어진 일조차 어쩌지 못하는 처지다. 그의 카메라는 마치 사회의 목격자인 것처럼 움직이나 정작 가장 중요한 장면은 찍지 못한다. 그렇다고 '노 베어스'가 무기력하지는 않다. 이 영화엔 뜨거운 생기는 없지만 냉철한 성찰이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며 또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이라는 것. 곰을 어떻게 사냥할지 혹은 어떻게 피해 갈지 궁리하는 게 아니라 일단 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부터 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파나히의 카메라는 종종 잘못 찍고 때론 꺼지기도 하나 결코 사라지는 법은 없다.
![[클로즈업 필름]그래도 그럼에도 카메라를…'노 베어스'](http://image.newsis.com/2024/01/09/NISI20240109_0001455684_web.jpg?rnd=20240109173751)
'노 베어스'엔 세 가지 영화가 있다. ①파나히 감독이 처한 현실을 담은 영화와 ②극 중 파나히 감독이 머무르는 국경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을 담은 영화 그리고 ③극 중 파나히 감독이 촬영 중인 영화. '노 베어스'는 위 세 개 극을 교직하며 파나히 감독 자신과 이란 사회, 영화라는 예술에 관해 얘기한다. 단순화를 무릅쓰고 얘기하자면 ①에서 파나히 감독은 다짐하면서도 무력함을 절감하고 ②에서 이란 사회의 과거·현재·미래의 충돌을 목도하며 ③에선 영화라는 예술의 한계와 윤리에 관해 되짚는다. 파나히 감독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고 층이 겹겹이 쌓인 이 이야기를 107분이라는 짧은 러닝 타임에 꽉 채워 담아내는 솜씨를 보여준다. 파나히 감독을 거장으로 부르는 건 그가 정부의 집요한 탄압을 받으면서도 창작 활동을 이어가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탄압 속에서도 매번 빼어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일 것이다.
![[클로즈업 필름]그래도 그럼에도 카메라를…'노 베어스'](http://image.newsis.com/2024/01/09/NISI20240109_0001455685_web.jpg?rnd=20240109173815)
'노 베어스'를 분명히 이해하려면 파나히 감독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그는 2009년 반정부 시위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6년 형을 받은 것과 함께 20년 간 출국, 영화 제작, 언론 인터뷰 금지를 당했다. 그럼에도 계속 영화를 만들어온 파나히 감독은 '노 베어스' 촬영 직후인 2022년 7월 앞서 선고된 6년 형을 다 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체포, 옥중 단식 투쟁을 하다가 작년 2월 풀려났다. '노 베어스'가 베네치아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다는 소식도 감옥 안에서 들었다. 파나히 감독은 이 작품에서 이런 자신을 연기한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망명할 수도 있으나 이란 사회에 관한 영화를 기어코 이란 사회 안에서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이 국경선 위에 서 있다가 결국 다시 이란으로 되돌아오는 그 뒷모습에 담겨 있다. 그러면서도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로 활동이 크게 제약된 그의 처지는 무력한 방관자의 모습으로 표현돼 있다. 이것이 ①이다.
![[클로즈업 필름]그래도 그럼에도 카메라를…'노 베어스'](http://image.newsis.com/2024/01/09/NISI20240109_0001455686_web.jpg?rnd=20240109173831)
'노 베어스'는 곤경에 처한 예술가의 내면에 머무르지 않는다. 파나히 감독은 그를 옭아맨 이란 체제의 폭력을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수구적 행태를 드러내는 것으로 확장한다. 이란 사회 경직성을 단순히 과거와 현재의 충돌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가고, 과거와 현재의 격돌이 다시 현재와 현재가 맞부딪히는 난장으로 파생돼 가는 모습을 ②에서 지켜본다. 파나히 감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작품을 영화 예술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관해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로 다시 한 번 도약시킨다. 이게 ③이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는 것. 파나히 감독은 영화라는 게 마치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쓰이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진실한 것처럼 보이려는 것에 불과하고 진실은 저 멀리 있는 것 아니냐고 읊조린다. 극 중 파나히 감독과 함께 영화를 찍던 배우는 파나히 감독에게 일갈한다. "모든 게 다 가짜잖아요. 당신은 해피엔딩을 만들려고 이런 거잖아요"
![[클로즈업 필름]그래도 그럼에도 카메라를…'노 베어스'](http://image.newsis.com/2024/01/09/NISI20240109_0001455687_web.jpg?rnd=20240109174010)
이 작품의 탁월함은 마치 따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①②③을 한 편의 이야기로 엮어내는 데 있다. 말하자면 이런 식이다. 파나히 감독의 의지와 무력감은 그가 마주하는 이란 사회와 그가 만드는 영화 모두에 담겨 있다. 이란 사회 환부는 파나히 감독 마음을 헤집어 놓고 그가 만드는 영화를 들춰 놓는다. 영화 예술의 한계는 파나히 감독 머릿속에서 떠나는 법이 없고 동시에 이란 사회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과 공명(共鳴)한다. 그러니까 파나히 감독은 목격자이면서 방관자에 지나지 않고, 쉬지 않고 진실을 보려 하면서도 진실을 보는 데 실패하며, 그의 카메라는 언제나 작동하길 원하나 종종 꺼질 수밖에 없다. 파나히 감독은 어떤 자기연민도 없이, 어떤 희망도 없이, 보고 또 보려 하며 카메라를 들이대려 한다. '노 베어스'는 이런 그의 결단을 떠벌리는 게 아니라 입을 꾹 다문 채 생각에 잠긴 파나히 감독의 얼굴에 담아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