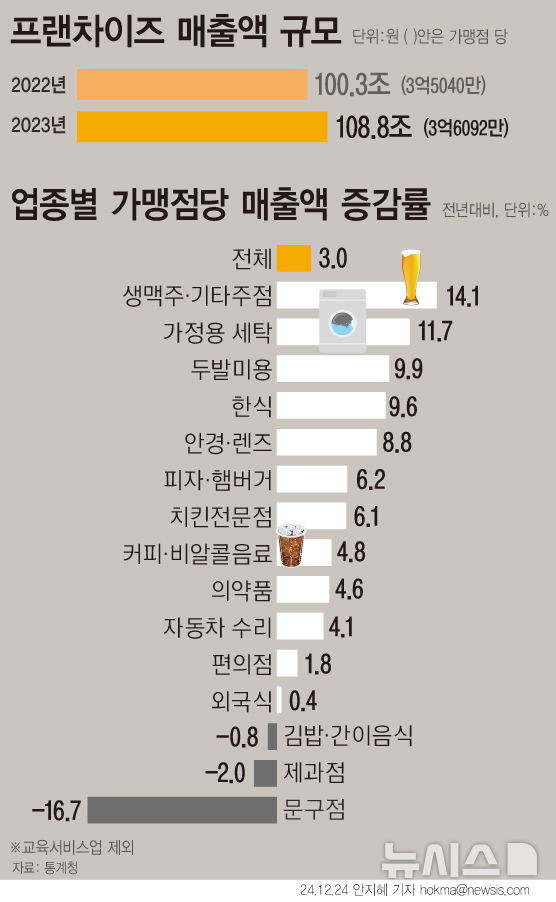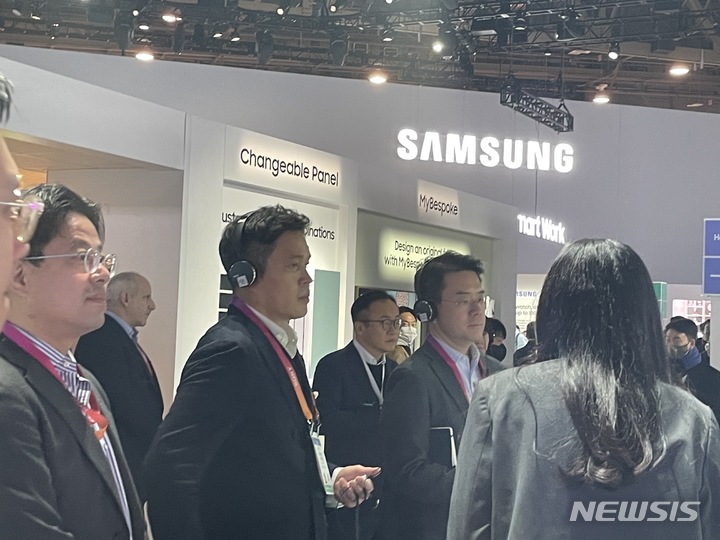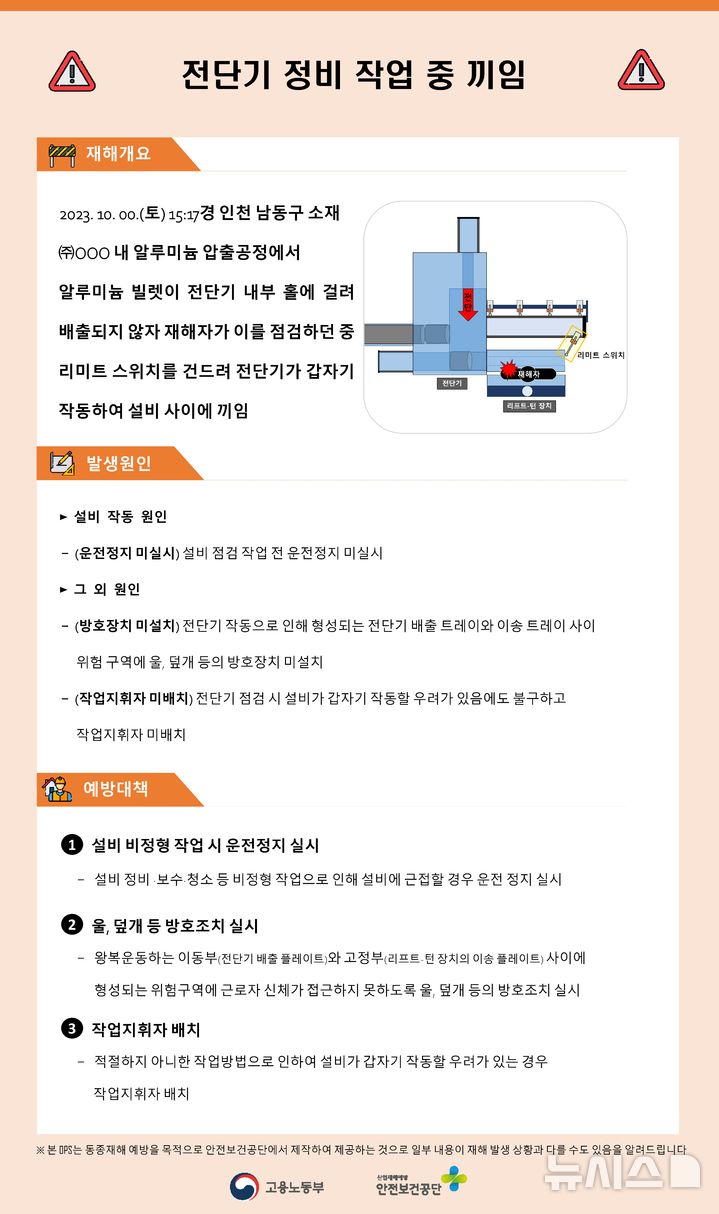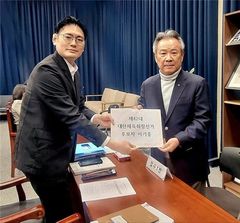'김학의 뇌물' 파기환송…"증인회유 의심" vs "사실 아냐"(종합2보)
수억원 뇌물 수수 및 13차례 성접대 혐의 등
1심 무죄→2심 징역형…대법, 파기환송 반전
"증인, 검사 면담후 진술 번복…신빙성 없어"
김학의 보석 인용…법정 구속 225일만 출소
수사단 "증인 사전면담은 적법한 조치였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0.28.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0/28/NISI20201028_0016830682_web.jpg?rnd=20210610145049)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0.28. [email protected]
검찰 수사단은 적법절차에 따라 증인을 사전에 면담했으며 회유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를 삼았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검찰이 사전에 면담한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검사는 1심과 원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신문 전 증인을 소환해 면담을 했고, 이 과정에서 증인은 자신의 검찰 진술조서 등 내용을 확인했다"며 "증인은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사항을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이후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차명 휴대전화 등에 대한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등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이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압박 등으로 증인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법정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 전 차관 의혹을 다시 수사한 검찰 수사단은 증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 규칙상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하기 전 사실확인 등을 위한 절차를 미리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증인 사전면담은 검찰사건사무규칙 189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라며 "해당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5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05.16. [email protected]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이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저축은행 회장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1심은 무죄로 봤다.
이 밖에 김 전 차관이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4000만원 가량을 제공 받은 것도 모두 무죄 혹은 이유 면소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및 성접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지만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씨로부터 4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