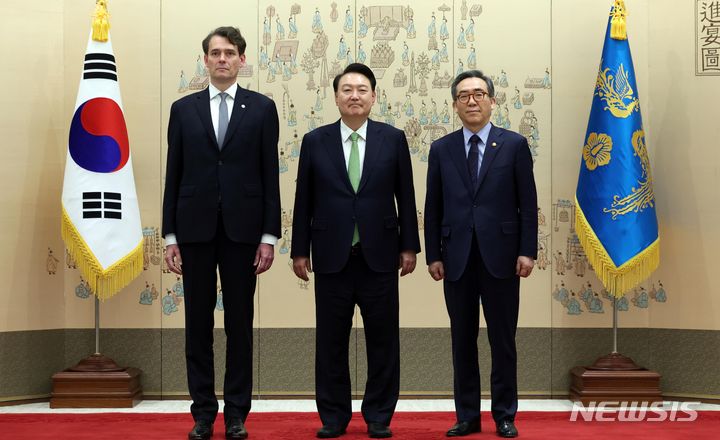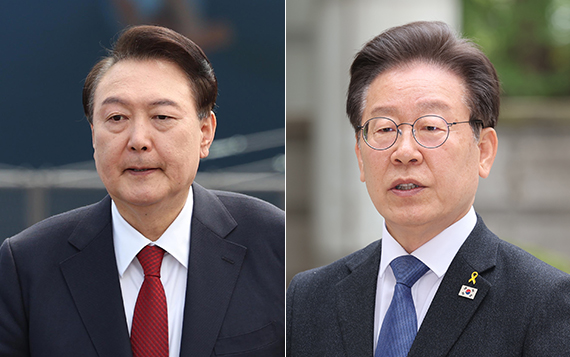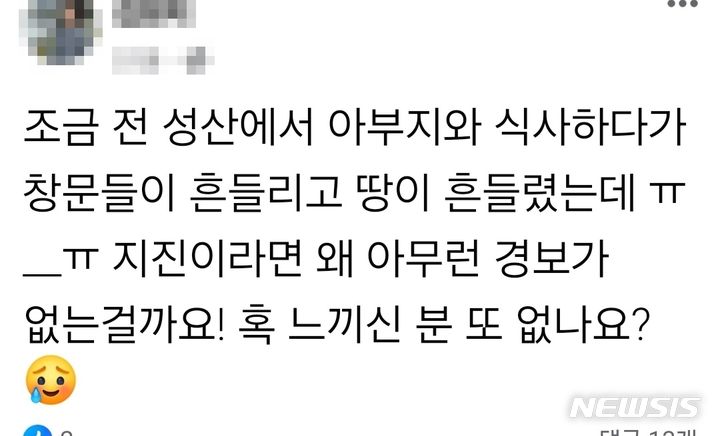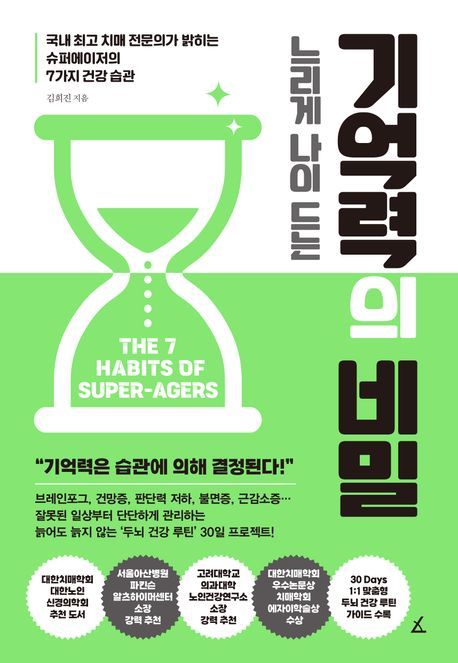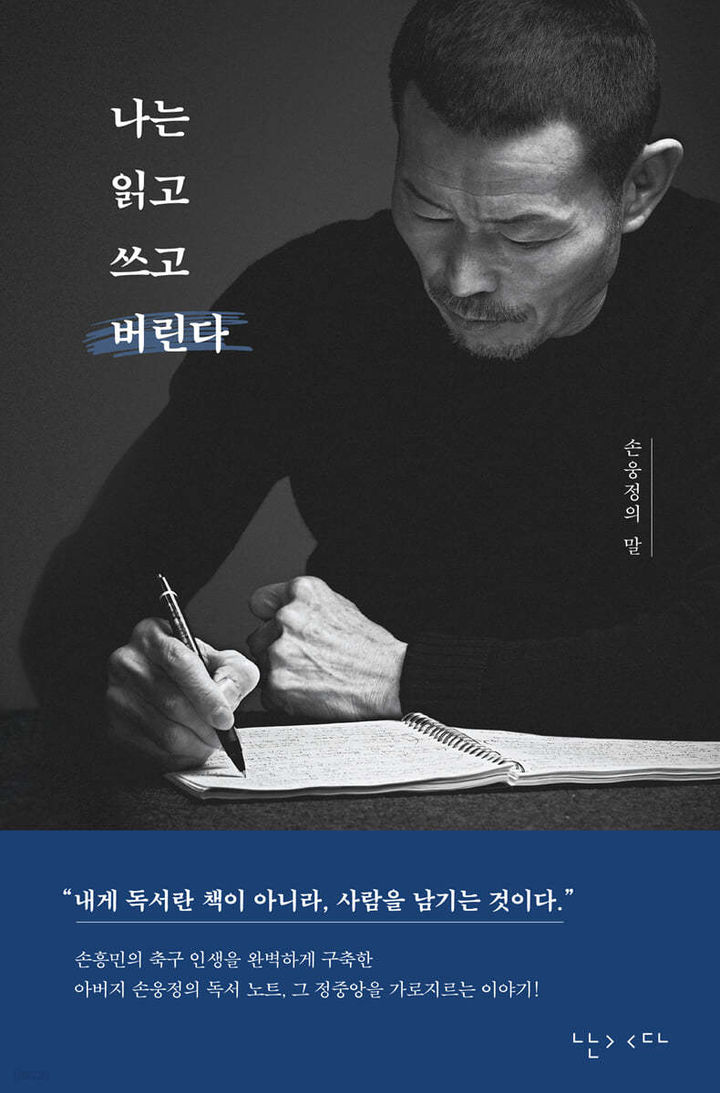패튼 전 홍콩총독 "시진핑, 신뢰 못할 지도자…G7 나서야"
"시진핑 민주주의 가치 파괴"
6월 G7 정상회의서 '홍콩 의제' 포함해야
![[홍콩=AP/뉴시스] 홍콩 시내 중심가에서 24일 시위 참가자 수백명이 "광복 홍콩" "시대혁명"이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05.24](http://image.newsis.com/2020/05/24/NISI20200524_0016346542_web.jpg?rnd=20200524154118)
[홍콩=AP/뉴시스] 홍콩 시내 중심가에서 24일 시위 참가자 수백명이 "광복 홍콩" "시대혁명"이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05.24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크리스 패튼 전 홍콩 총통은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콩의 마지막 총통을 역임한 영국 원로 정치인 패튼은 25일(현지시간)자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G7은 홍콩의 자유를 위해 일어서야 한다(The G7 must stand up for Hong Kong's freedom)'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23개 국가에서 200명이 넘는 정치인들이 노선에 관계 없이 베이징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에 서명했다며 "영국 정부는 다음달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시도를 의제에 넣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3일 패튼 전 영국 홍콩 총독 등 전 세계 23개국 정치 리더 200여명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국가보안법 제정은 홍콩에 대한 포괄적 공격"이라며"일국양제(하나의 국가, 두개의 체제)가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패튼 전 총독은 FT 칼럼에서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일국앙제는 시진핑 주석이 2013년 정권을 잡을 때까지 유지됐다"며 "시 주석은 전임자들이 추구했던 정책들을 뒤집었다. 그는 공산당 통제를 강화했고 시민사회 및 반체제 활동을 단속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신장위구르 주민들을 가뒀고 이제는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패튼 전 총독은 "시 주석은 당과 정부를 동원해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공격하라고 지시했다"며 "그는 국제법과 이전의 합의들을 무시하려는 특징이 있다. 그는 남중국해 군사화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했던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호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중국의 책임을 제기하자 국제 무역규칙이 있음에도 경제적으로 공격했다"고 전했다.
패튼 전 총독은 "중국은 2047년까지 홍콩인들의 삶의 방식을 보장하겠다는 유엔과 했던 공동 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는 오는 9월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 반중 성향의 범민주 진영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홍콩 국가안보법을 직접 제정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그러나 강압과 고문으로는 딤섬(홍콩의 대표 음식)을 팔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튼은 "영국은 자유를 지키려는 홍콩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며 "중국이 홍콩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면 홍콩은 국제 금융허브로서의 명성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홍콩을 지지하고 조약의 의무를 존중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영국은 그렇게 해야 할 정치적,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은 수년간 중국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국과 새로운 관계를 적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팬더믹 초기 내부 고발을 서슴치 않았던 용감한 의사들과 같은 중국인들은 믿을 수 있지만 시진핑 정부는 신뢰하기 어렵다"며 "영국과 G7은 열린 사회의 적을 상대로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튼은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5~10년 뒤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며 "행동에 나서지 못하면 명예 실추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