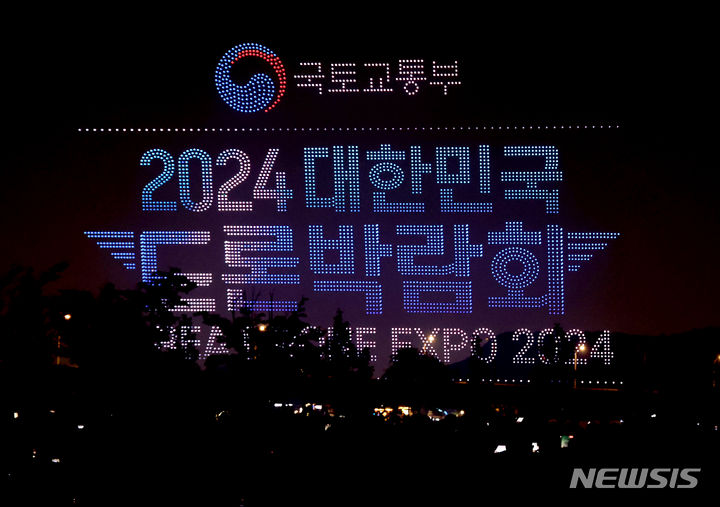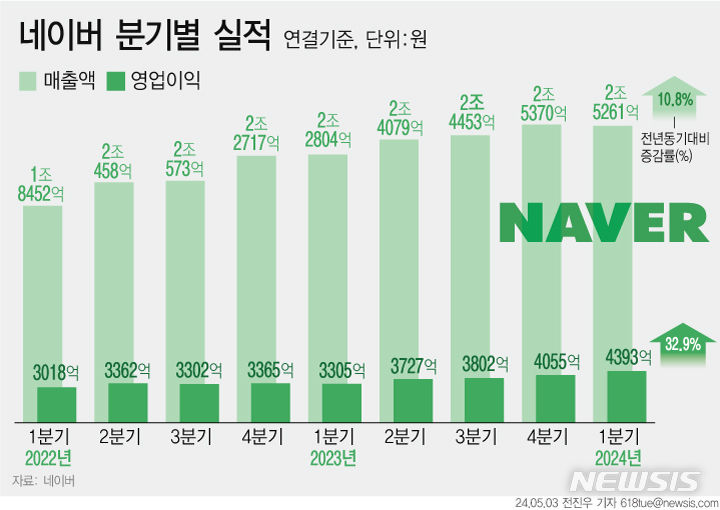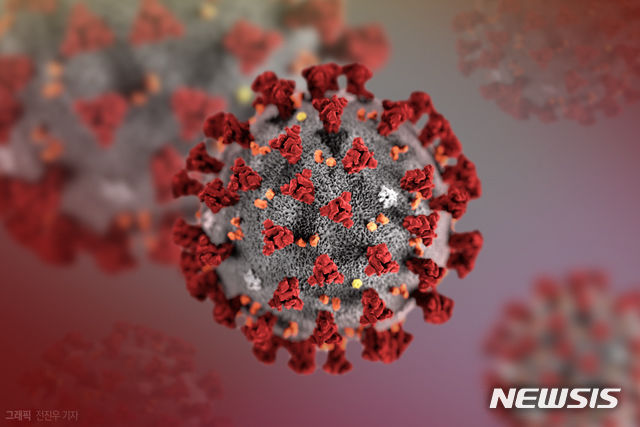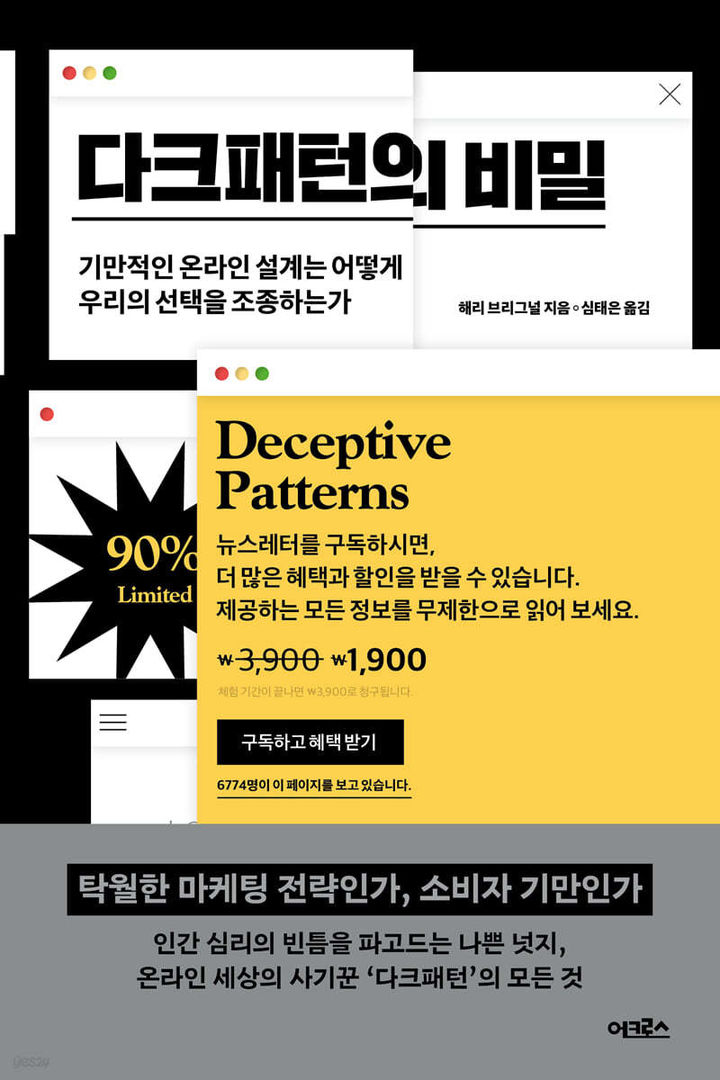[단독]중국산 김치 88% '아스파탐 사용'…국내선 매실액·설탕 등 사용
6월 한 달간 중국산 김치 2만 2632톤 수입
아스파탐, 유통과정서 무르는 성질 지연해
"아스파탐 사라지면 다른 인공감미료 대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1월 25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입액은 전년보다 20.4% 증가한 1억 6940만 달러(약 2092억 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액 증가율은 2010년(53.8%) 이후 12년 만에 최고다. 지난 1월 25일 서울 시내 한 마트에 국산 김치와 수입산 김치가 진열돼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3.01.25. xconfi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image.newsis.com/2023/07/04/NISI20230704_0001306307_web.jpg?rnd=20230704134745)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1월 25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입액은 전년보다 20.4% 증가한 1억 6940만 달러(약 2092억 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액 증가율은 2010년(53.8%) 이후 12년 만에 최고다. 지난 1월 25일 서울 시내 한 마트에 국산 김치와 수입산 김치가 진열돼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3.01.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지난 한 달간 국내로 수입된 중국산 김치 가운데 약 90%가 아스파탐을 원재료 가운데 하나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뉴시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개된 수입 김치 원재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수입된 김치 1737건 가운데 아스파탐이 들어간 김치는 1525건이었다. 이는 전체 수입 김치의 87.79%에 해당하는 규모다.
물량으로 따지면 수입된 중국산 김치는 2만2632톤이며, 가격으로는 1262만8000달러(약 164억 9848만원) 규모다.
중국업체가 김치에 아스파탐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수입 과정에서 김치가 무르거나 너무 빨리 익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 김치를 제조해 한국까지 수출하는데 설탕, 물엿 등으로 양념을 하면 김치가 쉽게 무를 수 있다.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200배더 더 단맛을 내면서도 긴 유통과정에서도 아삭함을 유지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내에서 김치를 제조·판매하는 대상 종가집, CJ제일제당 비비고, 풀무원 등은 인공감미료 대신 매실농축액, 설탕 등을 사용한다.
한편 오는 14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아스파탐을 발암물질로 분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주류, 식품업계가 아스파탐 퇴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막걸리협회 측은 “현재는 회원사들에 식약처의 위해성 기준치를 공지해 놓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음료 업체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롯데칠성음료는 펩시 제로 3종(라임·망고·블랙)에 아스파탐을 소량 사용 중인데, 아스파탐 대체제 사용 여부를 두고 글로벌 본사와 관련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파장은 중국산 김치에도 미칠 전망이다. 주류, 식음료 업계에서 아스파탐이 퇴출당하면 중국산 김치 역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아스파탐 사용 주류, 식음료 리스트가 공유되고 있다.
중국 김치 수입업체들 사이에서는 결국 아스파탐 사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아스파탐이 사라진 자리는 설탕이 아닌 다른 인공감미료가 채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중국산 김치에서는 아스파탐 대신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등을 사용하고 있다. 사카린나트륨, 아에설팜칼륨 모두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다.
한 수입식품 업체 관계자는 "WHO 발표 후 식약처가 명확한 지침을 내린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며 "다만 아스파탐이 퇴출당하더라도 단가, 기존 맛 유지 등 여러 이유로 설탕이 아닌 다른 인공감미료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