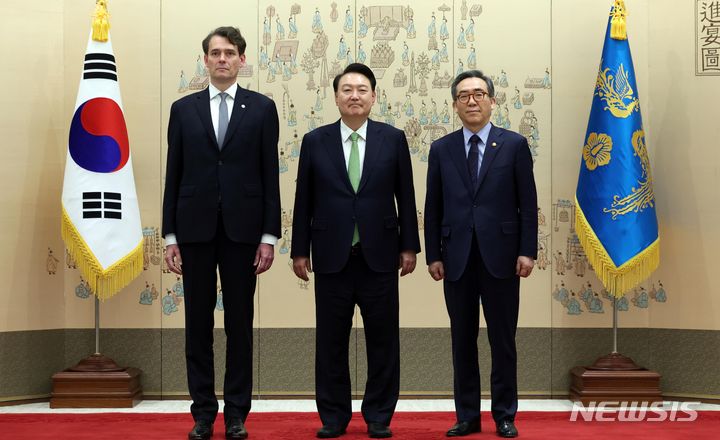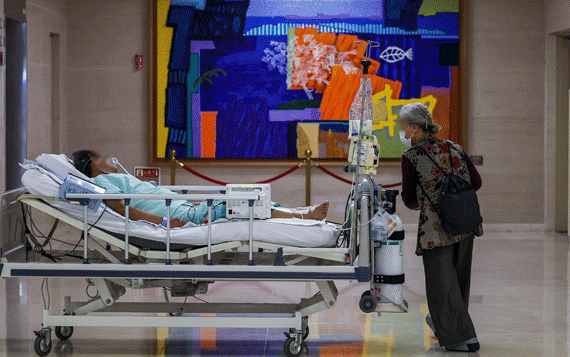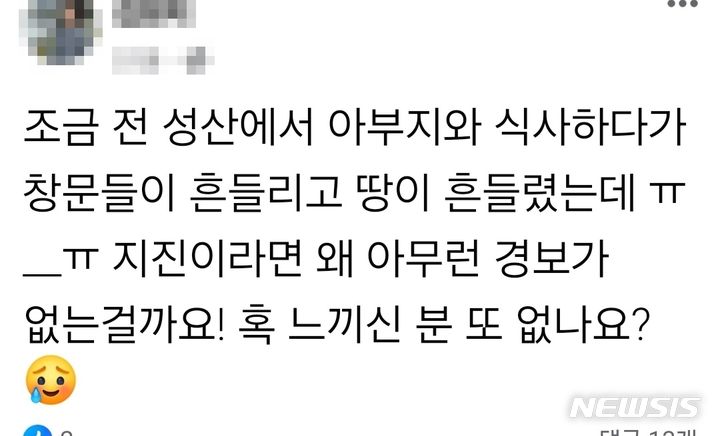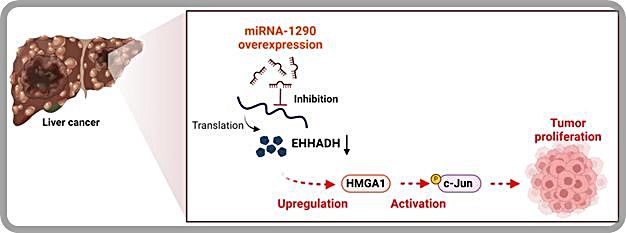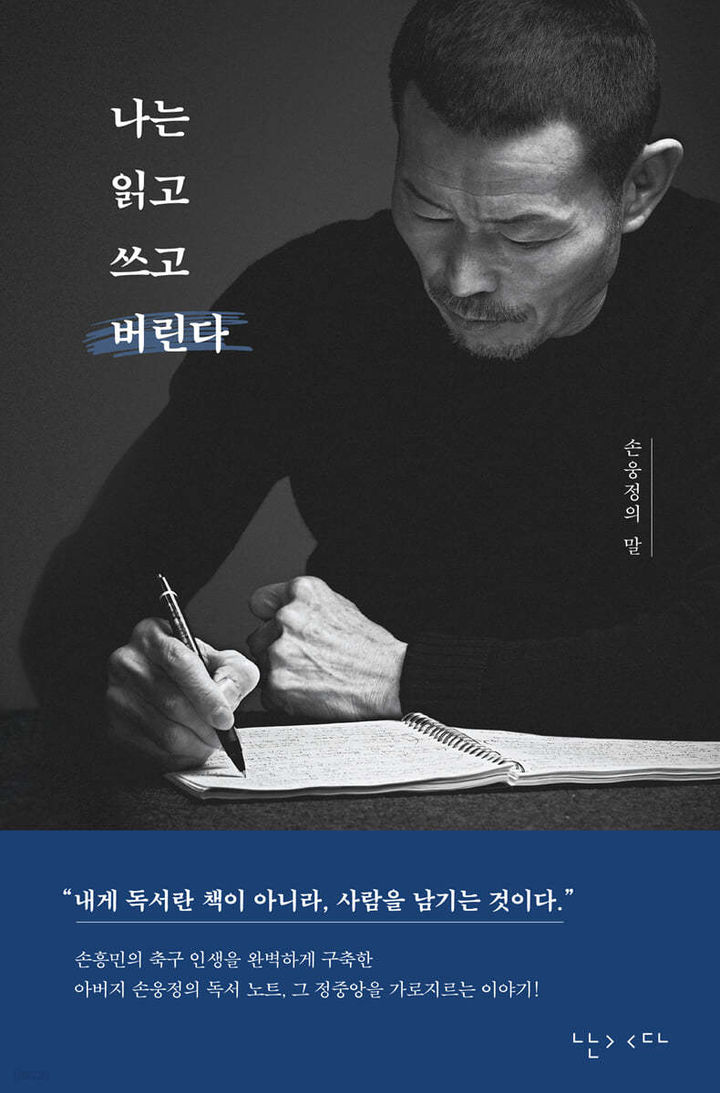발란 등 명품 플랫폼, 잇단 논란에 국감 소환...무슨 일?
국회 정무위, 올해 국감 증인 최형록 발란 대표 및 박경훈 트렌비 대표 채택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올해 각종 논란과 이슈에 휘말렸던 명품 플랫폼 업체가 결국 국정 감사 증인으로 소환된다.
명품 플랫폼 업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격히 덩치를 키웠지만, 외려 소비자들의 권익을 해치는 사례가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다음 달 7일 최형록 발란 대표와 박경훈 트렌비 대표를 소환한다.
머스트잇도 발란·트렌비와 함께 명품 플랫폼 3사로 묶이지만, 질의 시간의 한정 등 여러 여건 상 머스트잇은 애초 증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는 "질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3사를 모두 증인으로 부르기 어려웠다"며 "발란은 최근 개인 정보 유출 논란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트렌비는 허위 과장 광고로 공정위 처분을 받은 만큼 두 업체를 불러 질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명품 플랫폼의 ▲청약 철회 거부 ▲과도한 반품비 ▲사업자 책임 면제 등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불공정 약관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정무위 소속 김성주 의원실에 따르면 주요 명품 플랫폼 3사에 대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5년간 2299건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1241건이 집계돼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정무위가 이번 국감에서 들여다보는 사안 중 청약철회 거부 건(817건)은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신청된 소비자 상담 사유로 꼽혔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환불 등)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발란·트렌비·머스트잇 등 명품 플랫폼 3사는 단순 변심이나 특정 품목(수영복·악세사리 등)에 대해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있었다.
청약 철회 기간 역시 법정 기간(상품 수령 후 7일 이내)보다 짧거나, 특정 단계(주문 접수 또는 배송 준비 중) 이후에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없었다.
또 발란과 트렌비 각각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허위·과장 광고 관련해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관련한 질의도 오갈 예정이다.
발란은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외부 접속자의 해킹으로 발란 이용자 개인정보 약 162만 건을 유출시켜 지난 8월 5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트렌비는 2018년과 2020년 기준 자사 매출액이 명품 플랫폼 중 가장 많다고 광고한 것과 관련해 지난 8월 공정위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쟁 업체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 매출액 1위로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무위 측 관계자는 "코로나19 특수로 급성장한 명품 플랫폼은 올해 상반기에만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신생 플랫폼이 덩치를 더 키우기 전 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불공정 행위를 들여다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명품 플랫폼 3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격히 성장해 지난해 특히 두드러진 성장세를 기록했다.
발란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14.5% 증가한 521억7962만원, 트렌비는 27.2% 성장한 217억6222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머스트잇의 매출은 66% 늘어난 199억4949만원으로 집계됐다.
명품 플랫폼 3사 모두 유명 배우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덩치를 키웠지만, 가품 판매 논란부터 과도한 반품 비용 문제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8월부터 명품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실태 조사에 착수했고 12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명품에 대한 선호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명품 수요는 식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제는 판매 채널 간 싸움이다. 명품 플랫폼 업체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선 온라인에서 명품을 구매할 때의 편의성, 신뢰성 등 부가가치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