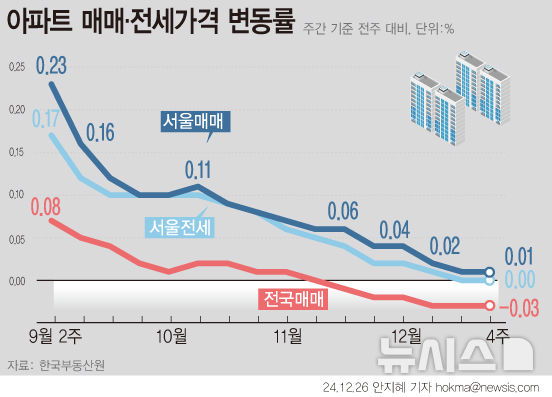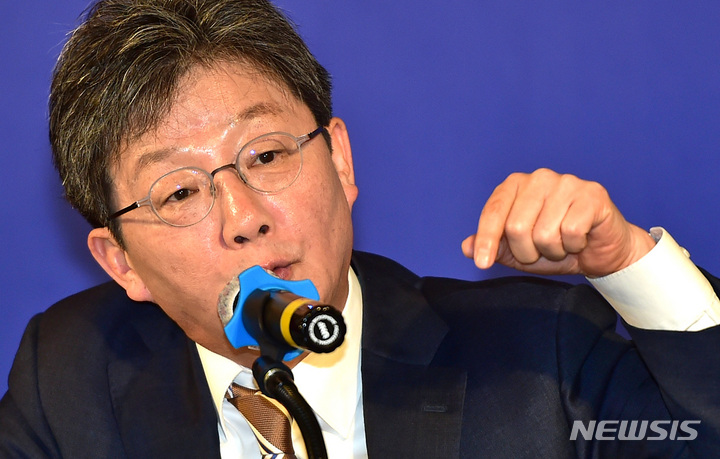[기자수첩] 시장 혼선만 불러온 '제4이통' 정책
![[기자수첩] 시장 혼선만 불러온 '제4이통' 정책](https://img1.newsis.com/2024/06/20/NISI20240620_0001581238_web.jpg?rnd=20240620144459)
제4이통사 출범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8차례 추진됐지만 모두 동일한 이유로 실패했다. 결국 '자금 문제'가 걸림돌이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명목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문제 삼았지만 스테이지엑스의 제대로 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통신 사업은 시설 기반 사업이다. 인프라 구축·관리에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도 지난해에만 약 7조7000억원의 비용을 시설투자에 썼다. 후발 사업자라면 매년 수조원대의 시설 투자비에 초기 수년 간은 적자까지 감내해야 한다.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물주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제4이통 유치 정책이 잇따라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로 대기업·대자본의 외면을 우선적으로 꼽는 시각이 많다. 지난해 정부가 제4이통사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현대자동차, KB국민은행, 쿠팡 등 대기업들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넌지시 기대했던 것도 그래서다. 하지만 이번에도 누가 봐도 확실한 '쩐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시장 상황이 예전과 다르다. '큰손'들 입장에서 이통 산업은 더 이상 '황금알' 시장이 아니다. SK, KT, LG의 견고한 시장 경쟁 구도를 흔들며 먹거리를 창출하기엔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가 너무 적다. 포화상태다. 지난 2021년부터 이통3사 휴대전화 신규 가입자가 꾸준히 줄고 있고 있다. 합산 영업이익도 10여년째 2조원 중후반대를 답보 중이다. 게다가 통신비를 내리라는 압박은 매년 이어진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가 지난해 제4이통사 유치 계획을 발표하며 약 4000억원의 정책금융 지원 등 당근책까지 제시했지만, 플레이어들의 불안감을 떨쳐버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사실 제4이통 정책 취지는 꽤 괜찮다. 통신 시장이 관 주도에서 민간 경쟁 산업으로 전환된 만큼 시장 플레이어간 경쟁을 활성화해 자연스럽게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정책이다. 강제 통신비 정책보다 시장 친화적이다.
문제는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여러 정책들이 일관성 없게 추진되며 시장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제4이통과 알뜰폰 산업 정책과의 충돌이 대표적이다. 알뜰폰은 이통 3사의 망을 도매가로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강력하게 추진했던 제4이통 정책이 실패하면서 그 대안으로 내세워왔던 정책이다. 저렴한 이통 요금을 내세우며 최근 가입자 1000만명 돌파를 목전에 둘 정도로 입지 기반을 넓혀왔다. 최근에는 KB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까지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갖추며 이통사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런 와중에 느닷없는 제4이통사가 출범할 경우 이통 3사 가입자보단 알뜰폰 가입자들만 뺏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그치지 않았다. 여기에 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폐지하겠다며 이통 3사간 번호이동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시행하며 이같은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이래서 알뜰폰 사업에 과감히 투자할 사업자가 있겠나.
제4이통이든 알뜰폰 사업자든 메이저 플레이어들을 통신 시장에 참여시키기 위해선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한다. 그래야 투자·사업 계획을 짤 수 있다. 오락가락한 정부 정책은 통신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투자·성장 의지를 꺾는 악영향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선정 취소 추진을 발표하면서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들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4이통사 유치 실패를 교훈 삼겠다고 공언한 만큼 새로운 정책들은 기존 체계에 과도한 혼란을 주지 않도록,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