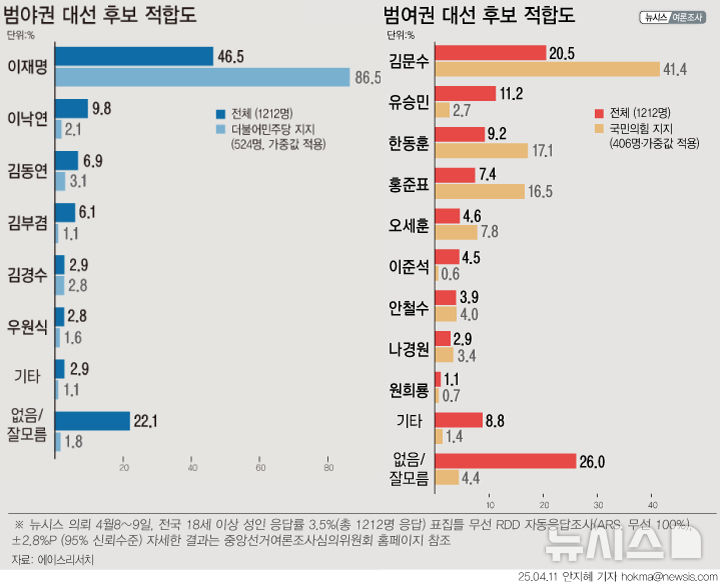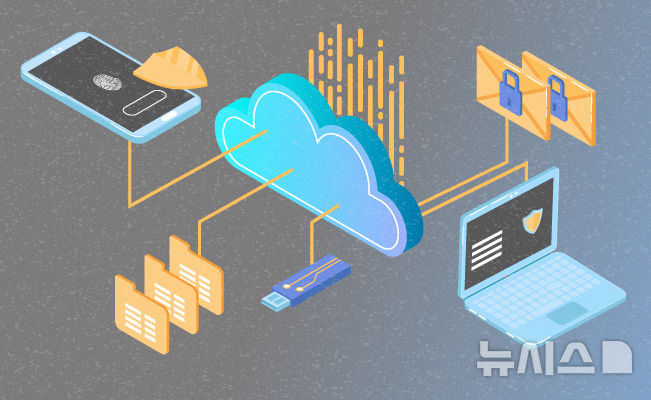뉴질랜드 총리 "10일내 총기규제법안 공개"…난항 전망
2017년 등 3차례 총기규제법 도입 추진됐지만 모두 실패
"정부가 얼마나 합리적인 법안을 내놓을지가 관건"

아던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각료들이 총기규제 법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위와같이 말했다.
아던 총리는 총기규제 법안 발표가 늦어지는 데 대해 "디테일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총기규제법안이 원하는 시점에 나올 만큼 법률 작업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던 총리는 또 "총기규제 법안과 관련해 내각은 단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발생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사원 테러로 현재까지 50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했다. 부상자 중상당수가 중상자로 알려져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의 용의자인 브렌턴 태런트(28)는 16일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기소됐다.
뉴질랜드에서는 지난 2005년, 2012년 그리고 2017년에도 총기규제법 도입이 추진됐지만 입법에 실패했다. 뉴질랜드에서는 비교적 쉽게 총기를 구매할 수 있지만 총격 사건 범죄가 자주 발생하지 않았던 관계로 입법 우선 순위는 아니었다.
시드니 대학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총기 관련 살인사건은 10만명 당 1.24명으로 10만명 당 11명을 기록한 미국보다 훨씬 낮았다.
아던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는 이번 사건 이후 총기규제법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인들은 테러범이 반자동소총과 같은 강력한 무기를 합법적으로 구매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태런트는 범행 당시 반자동소총 2정과 권총 2정, 라이플 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
뉴질랜드에서 총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총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경찰의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뉴질랜드에서 총기 구매 신청이 거부당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지난 2017년 4만3509건의 총기 구매 신청 중 당국으로부터 188건만 거부를 당햇다.
외국인들의 경우 사냥이나 대회 출전이 목적인 경우 최대 1년간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

뉴질랜드 경찰에 따르면 현재 1만5000정의 반자동소총이 뉴질랜드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뉴질랜드 경찰협회는 반자동소총을 쉽게 구매할 수 없도록 총기규제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크리스 케이힐 뉴질랜드 경찰협회 회장은 "총기규제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총기 로비단체가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총기 로비단체가 개입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지는 미국에서 봤다. 뉴질랜드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케이힐 회장은 호주의 경우 총기규제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태런트는 자국인 호주에서 그런 강력한 무기를 얻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호주에서는 1996년 포트아서에서 괴한이 AR-15 소총을 난사해 35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한 이후 일반인의 AR-15 소총 소지를 법적으로 금지했다.
데이비드 스몰 켄터베리대 법학과 교수는 "뉴질랜드에서는 총기는 사냥 뿐만 아니라 자기방어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므로 정부가 얼마나 합리적인 총기규제법을 내놓일지가 관건"이라며 "뉴질랜드에서는 개인의 총기 소지를 헌법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총기규제법을 도입한다고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ksk@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