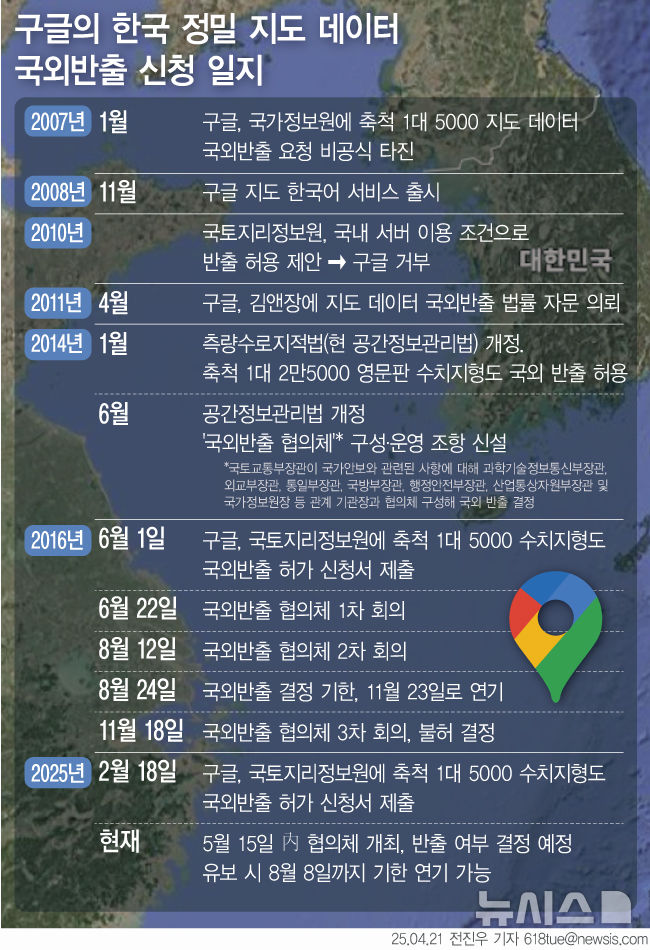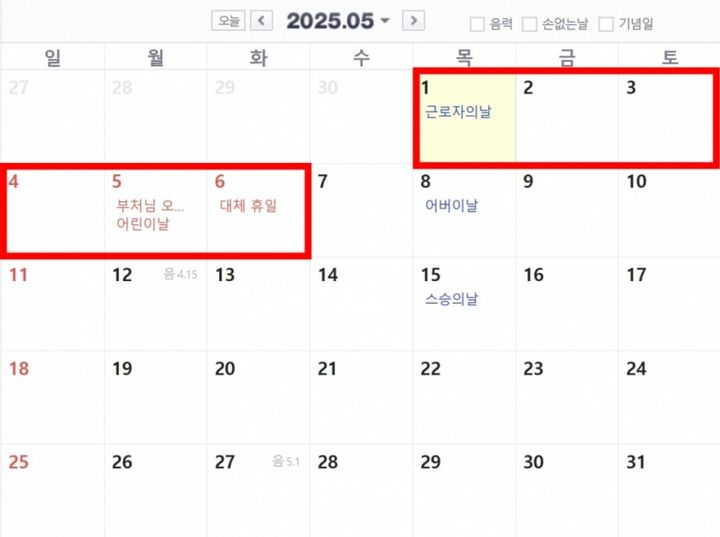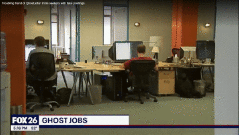[단독]고용부 안전진단에 아리셀 빠졌다…'사고 나야 실시'
고용부, 31명 사상 아리셀 안전진단 '0'회
산재 발생 사업장에 한정 짓는 진단 기준
"예방 사실상 불가능…기준 바로 잡아야"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25/NISI20240625_0020391989_web.jpg?rnd=20240625125457)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25. photo@newsis.com
사고 발생 전 위험 요소를 발견해 재해를 막는다는 안전진단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안전보건진단은 사업장의 잠재적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안전보건진단 기관의 조사·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83년 처음 도입됐다.
사업주가 스스로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신청하는 '자율진단'과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고용부 장관 명령에 따라 이뤄지는 '명령진단'으로 구분된다.
이 중 명령진단을 규정하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락·붕괴·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날 뉴시스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의 안전진단 대상 기준은 '과거 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안전 감독 결과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된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조사 및 감독 등으로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감독 등으로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에 따라 감독 등을 실시하여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다수 확인되고 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등 세 항목이다.
이 선정 기준은 일종의 고용부 내부 기준일 뿐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은 내용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여'라는 문구는 과거 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 명령을 하도록 이 가능하게 해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재발 방지책'이 될 수는 있으나 '재해 예방책'은 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관련 고용부 관계자는 "세 번째 기준에 따라 안전 감독이 이뤄져 안전 조치 위반이 다수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명령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고용부가 아리셀을 점검·감독한 적이 없었기에 아리셀에 대한 명령진단을 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실제 아리셀은 앞선 위험성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 안전 감독이 사실상 사업장 자율에 맡겨져 있었던 셈인데, 이번 참사로 '자율진단'의 실효성에도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이다.
위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 제도가 제 역할을 하려면 사후약방문식 진단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소방 당국과 산재 당국을 연계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위험 징후를 사전에 공유, 선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