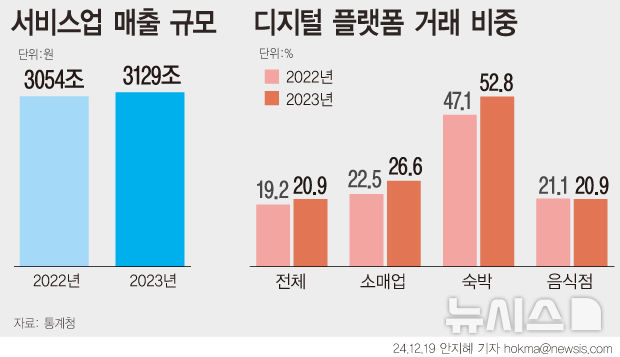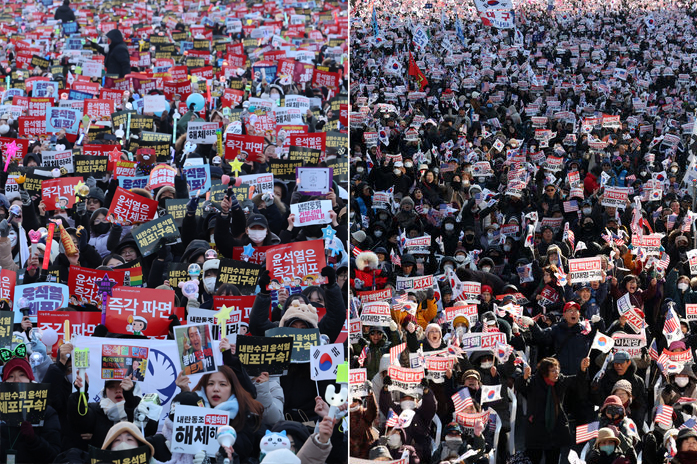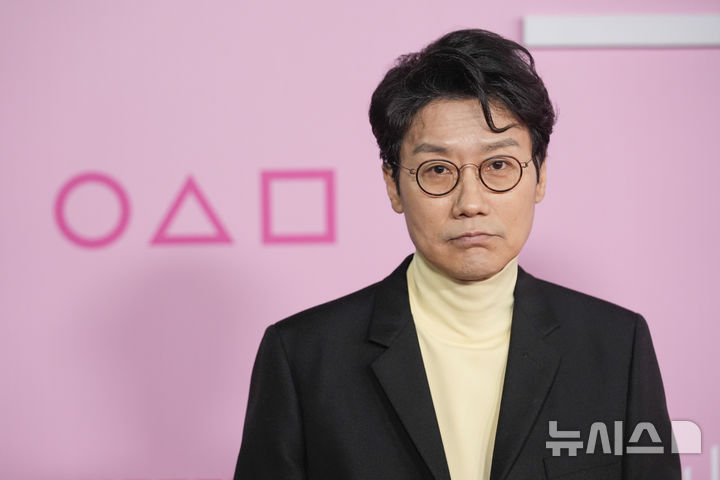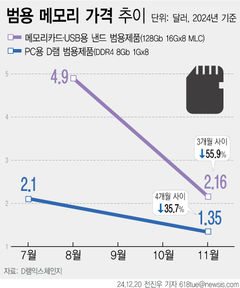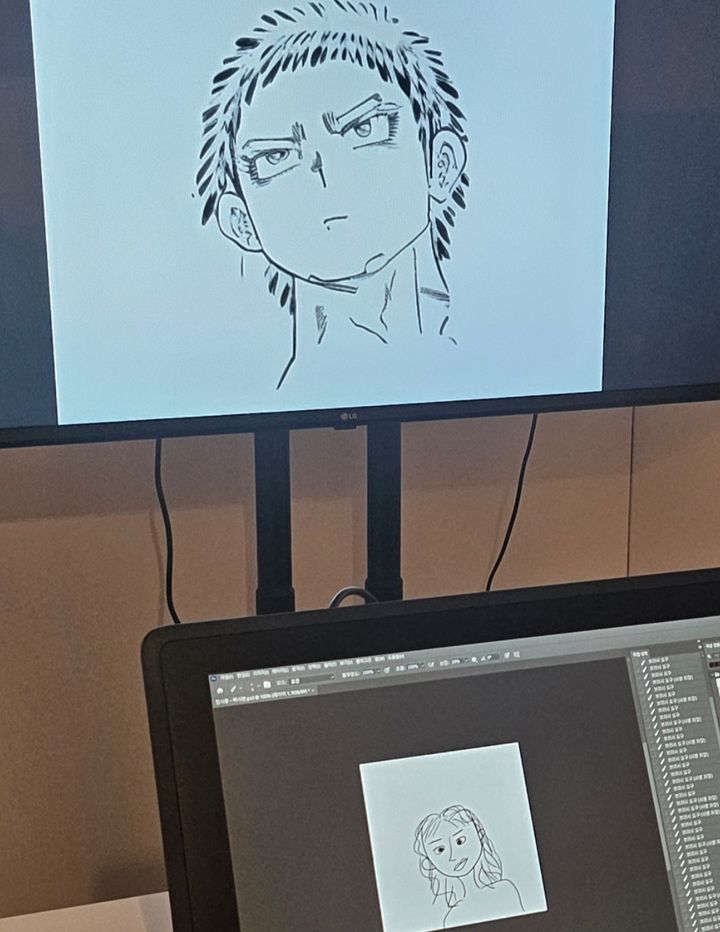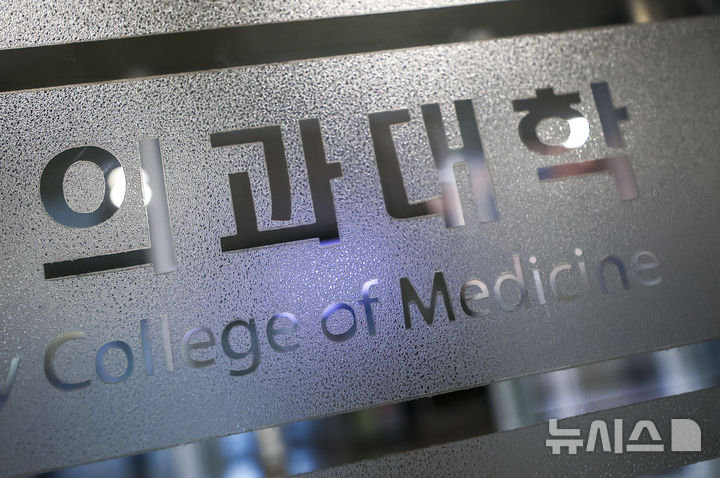"연고 갖다 줘"에 부엌칼로 부친 살해한 30대 아들, 징역 15년 확정
오른손 40㎝·왼손 35㎝ 부엌칼 들고 살해
부친 시체 끌고 가 아파트 집수정에 은닉
1심 "반인륜적·반사회적"…징역 20년 선고
2심·대법, 징역 15년…"심신장애 인정된다"
![[그래픽]](https://img1.newsis.com/2020/08/03/NISI20200803_0000575137_web.jpg?rnd=20200803155025)
[그래픽]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지하철에서 다른 짓 하지 말고 차라리 휴대폰 게임을 하라'는 등 잔소리를 한 60대 부친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한 30대 아들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8월23일 존속살해, 시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A씨는 지난해 5월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부친인 B씨(사망 당시 69세)를 살해한 뒤 시체를 아파트 내 집수정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B씨가 '지하철에서는 다른 짓 하지 말고 휴대전화 게임을 하라' '많이 먹지 마라' '영어 단어를 외워라' 등의 말을 자주해 자신을 괴롭힌다고 여겨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B씨가 '상처에 바를 연고를 가져다달라'고 말하자 격분한 뒤 모친이 친정 식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는 날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두 달 동안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유튜브에서 영화를 시청하며 칼로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시청했으며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연결된 집수정에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범행 약 2주 전에는 시체 은닉을 위해 청테이프 3개와 물티슈를 구입한 뒤 집수정 근처 계단 옆에 숨겨두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오른손에 40㎝ 길이의 부엌칼을, 왼손에 35㎝ 길이의 부엌칼을 들고 주거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B씨의 뒤통수와 목 부위를 3회 가량 내리찍었다.
B씨가 저항하자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어 우측 경동맥 절단 등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아파트 1층 현관 및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화면을 가린 뒤 청테이프로 시체를 여러 번 감은 다음 시체를 끌고 깊이 200㎝ 짜리 집수정에 밀어 넣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A씨가 직장 동료들과도 원만하게 지내는 등 비교적 안정된 사회생활을 해온 점,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심신장애 주장을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존속살해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의 동기와 계획성, 범행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아들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당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정도는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극도의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A씨의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6월 A씨가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조기에 특수교육을 통한 학습과 성인기에 접어들어 자폐증상이 일부 완화되는 특성에 의해 그 증상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만성적이고 그 예후가 낙관적이지 못하다"며 "심신미약의 상태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