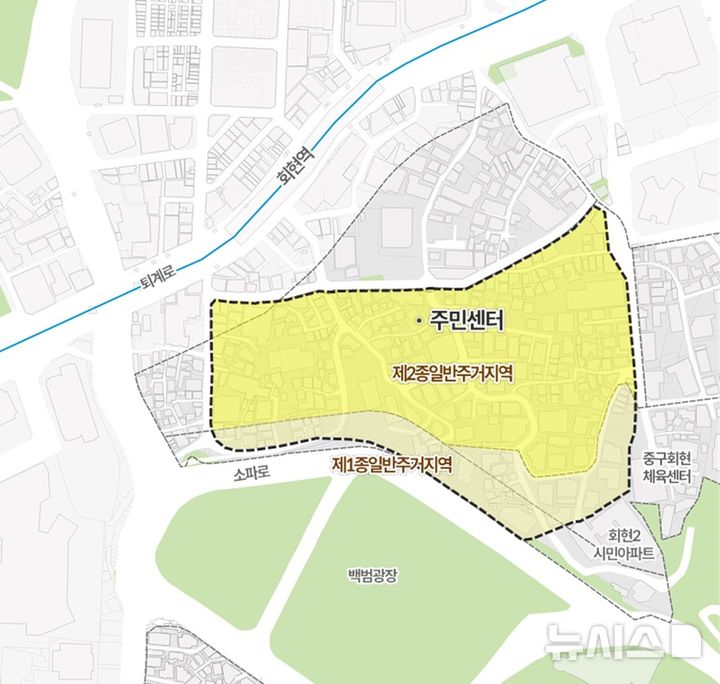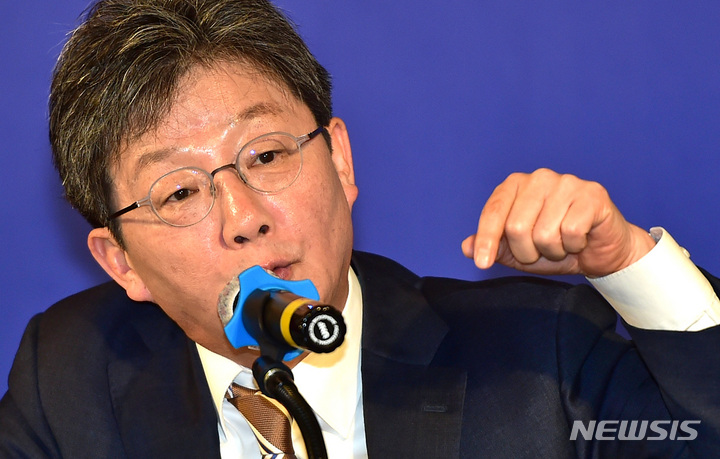美 언론인, 러시아 외무 인터뷰 공개 예고…푸틴 뒤로 10개월만
칼슨 "美, NBC·NYT 관점만 제공받아…러 입장 들어봐야"
"미국인 모르는 사이 러와 열전…직접 충돌 위기 최고조"
"젤렌스키 인터뷰 노력했지만 美 대사관 개입으로 실패"
![[서울=뉴시스]전 폭스뉴스 진행자 터커 칼슨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인터뷰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진은 칼슨이 지난 2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인터뷰 소식을 알리는 모습. (사진=칼슨 SNS 갈무리) 2024.1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07/NISI20240207_0001476926_web.jpg?rnd=20240207165656)
[서울=뉴시스]전 폭스뉴스 진행자 터커 칼슨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인터뷰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진은 칼슨이 지난 2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인터뷰 소식을 알리는 모습. (사진=칼슨 SNS 갈무리) 2024.12.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전 폭스뉴스 진행자 터커 칼슨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인터뷰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칼슨은 4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영상을 통해 인터뷰 공개를 예고하면서 "분쟁의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은 NBC뉴스와 뉴욕타임스(NYT)가 용인하는 관점만 제공받고 있다. 시청자는 러시아의 관점을 들을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인 대부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러시아와 열전(熱戰)을 벌이고 있다. 이는 선포되지 않은 전쟁이자 여러분이 투표하지 않았고 미국인 대부분이 원하지 않는 전쟁"이라며 "미군 병사는 러시아에서 러시아인을 살해하고 있다. 두 강대국은 쿠바 미사일 위기 때보다 훨씬 더 직접 충돌에 가까워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군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에이태큼스(ATACMS·육군전술유도탄체계)와 같은 첨단 미사일 체계를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인터뷰하려고 1년 넘게 노력했다.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했다. 우리 팀은 젤렌스키 대통령 주변의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모스크바=AP/뉴시스]9일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공개한 사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6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폭스뉴스 진행자 터커 칼슨과 인터뷰하고 있다. 그는 미국이 러시아의 이익을 인정하고, 우크라이나가 회담에 응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2.09.](https://img1.newsis.com/2024/02/09/NISI20240209_0000848898_web.jpg?rnd=20240209141844)
[모스크바=AP/뉴시스]9일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공개한 사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6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폭스뉴스 진행자 터커 칼슨과 인터뷰하고 있다. 그는 미국이 러시아의 이익을 인정하고, 우크라이나가 회담에 응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2.09.
이어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은 미국 정부에 의해 좌절됐다.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주우크라이나 미국대사관은 젤렌스키 행정부에 CNN과는 대화할 수 있다면서 나와는 대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7월 칼슨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인터뷰가 성사됐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인터뷰하지는 못했다.
지난 2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한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뒤로 서방 언론과 첫 인터뷰에 나선 것이었다.
당시 칼슨은 푸틴 대통령 인터뷰를 위한 러시아 방문이 미국 번영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칼슨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친(親)러시아 성향을 보여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책임을 서방에 돌리기도 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와 '땀에 젖은 비열한 놈'으로 지칭하면서 헐뜯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