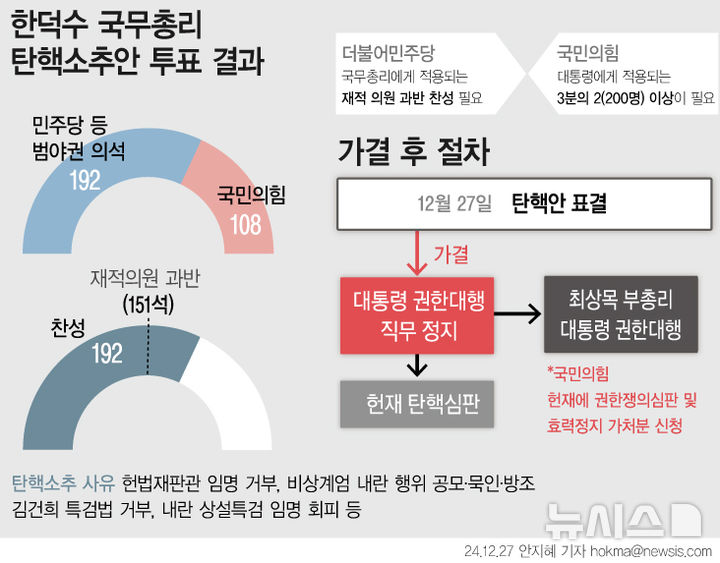[박원순 유족의 반격③]유족 측 "증거없이 진술에 근거했다"…진실공방 비화 의도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 인권위에 행정소송
피해자 진술 입증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 쟁점
진중권 전 교수에는 사자(死者) 명예훼손으로 고소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고인의 영정이 마련돼 있다. 2020.07.12. mspar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7/12/NISI20200712_0016470537_web.jpg?rnd=20200712172903)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고인의 영정이 마련돼 있다. 2020.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며 각종 소송전을 이어가면서 진실공방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박 전 시장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박 전 시장의 부인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정 변호사는 "인권위는 지난 1월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 일부 받아들여 박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결정해 유가족을 비롯해 많은 이들을 경악시켰다"며 "행정소송 과정에서 인권위가 왜 그렇게 황당한 일을 무리하게 강행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당시 결정문에서 "박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 같은 박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시청 시장실·비서실 현장조사를 비롯해 피해자에 대한 면담 조사, 서울시 전·현직 직원, 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 서울시·경찰·검찰·청와대·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 피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감정 등을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밝히고자 했다고 명시했다.
서울시도 피해자 보호 방안과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수용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인권위의 결정을 부인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관련 사실관계 1'이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가 2015년 7월 비서 근무 시부터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했고, 2019년 7월 다른 기관으로 전직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음란문자를 보내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대한 물증은 없다, 그동안 성고충 호소를 들었던 시장실 직원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 2'라는 글에서 "인권위가 객관적 증거없이 피해자와 참고인의 불확실한 진술에 근거해 성희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의 첫 재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인권위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입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SNS를 통해 "피해의 정도가 인권위 발표 내용보다 더 심각하고 중한 것이었음이 판결문 한 단락을 통해서라도 인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다고 언급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언론사 기자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를 당한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좀 닥치세요, 하거나 말거나…관심 없어요"라는 메시지를 날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자 명예훼손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돈필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이 자살한 경위에 비춰 소송 제기로 실추된 박 전 시장의 명예가 회복될지 의문이고, 관련 언론보도는 공인에 대한 공익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로 면책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