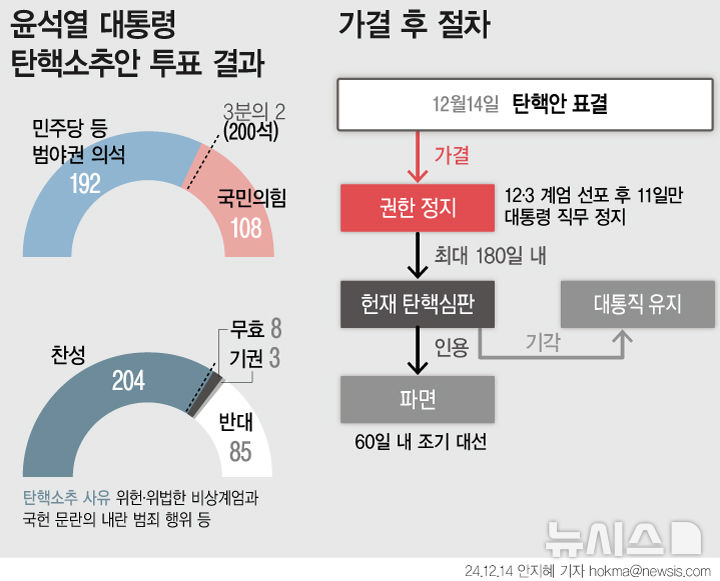도도맘 "강용석이 제안"…'성범죄 무고 교사' 혐의 증인 출석
강제추행 혐의 허위 고소 교사 혐의
도도맘 김미나, 증인으로 법정 출석
고소 당시 상황 상세하게 설명하기도
"더 이상 강용석과 엮이고 싶지 않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도도맘' 김미나 씨가 강용석 변호사의 무고 교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06.14.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6/14/NISI20230614_0019922265_web.jpg?rnd=20230614163807)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도도맘' 김미나 씨가 강용석 변호사의 무고 교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06.14. [email protected]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4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사건의 핵심 관계인 중 한 명인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맥주병으로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저는 처음부터 고소할 생각이 없었다"며 "강 변호사가 제 머리를 손으로 만지다가 상처 부위를 보고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언급한 것인지 묻는 검찰 질문에 "갑자기 강 변호사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자고 했다"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그거 하면 쓸 게 많을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다"고 했다.
폭행 가해자의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었던 내용을 넣어서 고소한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다. 또 강 변호사에 대해선 "더 이상 저 분(강 변호사)과 엮이고 싶지 않고 법원에 출입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김씨가 강 변호사에게 폭행 당한 과정을 잘못 전달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씨가 성범죄를 당하던 과정에서 맥주병으로 폭행을 당했고 이 때문에 강 변호사가 사실을 오인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또 김씨와 강 변호사가 주고받은 메시지가 유출됐고 이에 따라 사건 발생 4~5년 뒤 무고 교사 혐의로 강 변호사가 피고발된 경위를 언급하며 사건의 제보자가 아닌지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제가 언론에 제보한 건 전혀 아니다. 어떻게 메시지가 유출됐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이 판사는 오는 7월17일 오후 이 사건 고발인을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강 변호사는 과거 김씨가 증권사 임원 A씨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허위 고소하도록 부추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2015년 3월6일 김씨가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해 11월께 법률적 조치로 압박해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김씨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단순 폭행으론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에게 '김씨를 성폭행한 후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합의를 거부하자 강 변호사는 김씨를 다시 설득, 사무실 소속 변호사를 통해 'A씨가 김씨 몸에 손을 대는 등 성폭행하던 중 거부하자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후 A씨의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반면 강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편 무고 혐의로 별건 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항소하지 않아 지난 2월 이 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