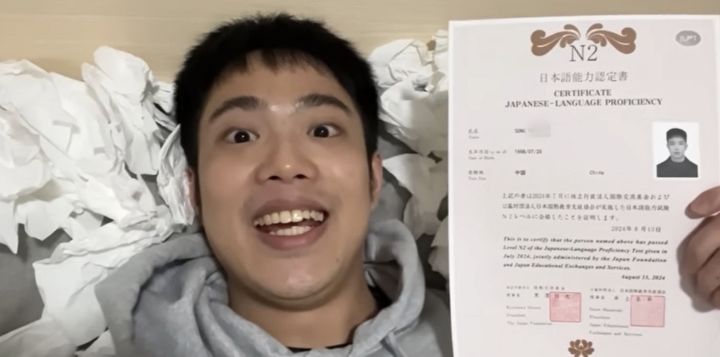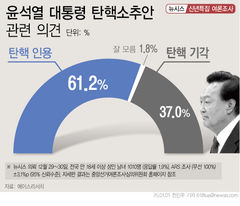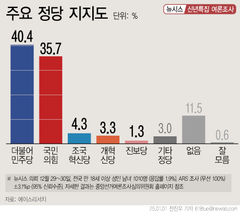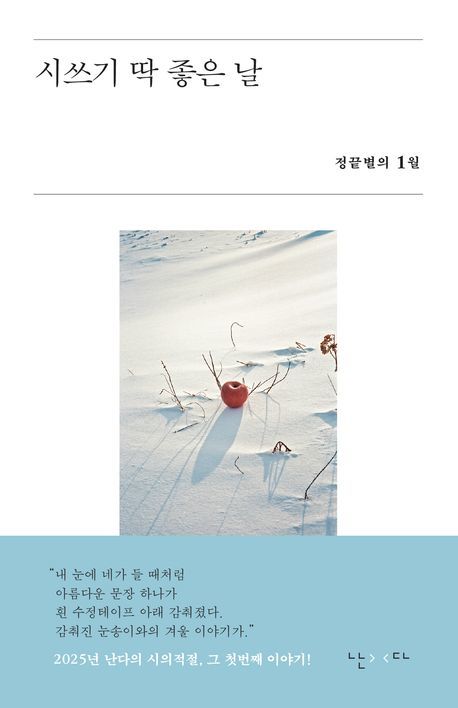與 청년최고위원 출마 김영호 "할말 하는 정치할 것"
"청년, 기성정치 2중대로 전락해서는 안 돼"
전대 '윤심' 작용에 "대통령에 큰 부담 위험"
의원 체포 동의안 기명투표 등 3가지 공약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직에 출마한 김영호 전 보좌관. (사진=본인 제공). 2023.0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1/18/NISI20230118_0001178524_web.jpg?rnd=20230118113618)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직에 출마한 김영호 전 보좌관. (사진=본인 제공). 2023.01.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전 보좌관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우리 당이 외면했던 가치에 미래가 있다. 외면했던 가치를 품고 세대를 포용하는 개방적이고 확장성 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보좌관은 앞서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마 의지를 밝히며 "멀쩡한 후보가 없어서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일 '당 내부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매듭을 짓겠다'며 청년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전 보좌관은 "청년최고위원은 이름 그대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청년들이 처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어나가는 자리"라며 "지금 후보들은 이런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내가 누구랑 친하다, 내가 누구랑 밥 먹었다'라며 표 구걸만 하고 형식적인 소통창구 하나 만들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듯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작용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데 자신이 신용을 얻고 있고 적자인 듯 얘기하는 건 대통령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아 위험하다"며 "자신이 누군지, 공약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먼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태 정치는 언제까지나 청년은 약자고 지원 대상이지 정치 참여자가 아니라는, 청년 스스로 청년정치 가치를 폄훼하는 모습일 뿐"이라며 "더 이상 청년정치가 선거철 들러리, 기성정치 2중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정책 결정권자로, 정책 결정 캐스팅 보터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강력하게 당정 일체를 지향하더라도 청년최고위원 한자리 만큼은 다양한 가치를 품을 수 있는, 미래를 위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자리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보좌관은 공약으로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기명투표 ▲국정감사 대기업 줄 세우기 근절 ▲청년 국민의힘 재정적 독립 등을 내세웠다.
그는 불체포특권 기명투표에 대해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 때 모든 세대가 불공정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우리 세대가 말하지 않으면 기득권이 절대 해결할 수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투표할 때 반드시 기명투표해 부동의한 의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그들이 요구하는 문제점을 듣고 당이 책임감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보좌관은 "진영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낡은 시선으로 우리 세대를 바라본다면 결코 청년의 표를 얻을 수 없다"며 "적어도 청년정치만큼은 권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대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 출생인 김 보좌관은 2014년 제5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46기)을 수료했다. 이어 서울대 법학대학원에서 경제법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법무부에서 근무한 뒤 제21대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출마 직전에는 장제원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